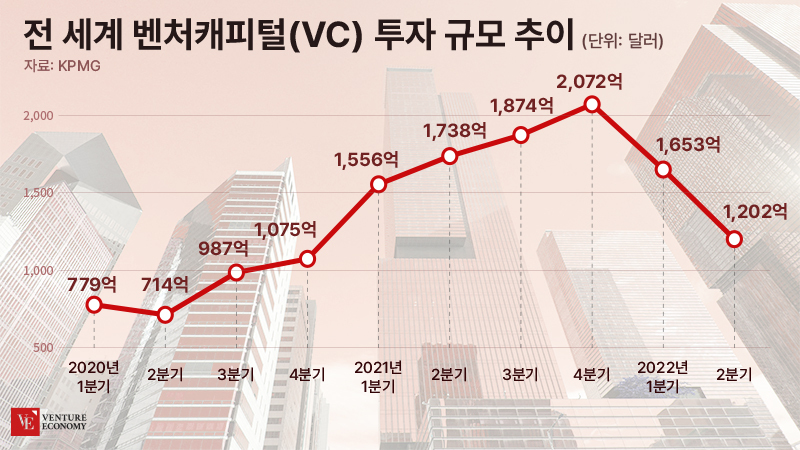[기고] 같은 눈높이를 갖춘 인력들로 구성된 학회의 장점
학회에 간다는 것이 매우 재밌는 일이라는 걸 깨달은 것은 박사 학위 과정 2년차에 ‘미국 산업응용수학회(Society for Industrial and Applied Mathematics, SIAM)’에 초청 받았던 즈음으로 기억한다. 막 대학원에 들어갔던 시절에는 당장 수업을 따라가기도 버거웠고, 교수님들 논문 발표를 따라가는 것은 커녕, 가깝게 지내는 박사생들이 무슨 연구를 하는지도 제대로 이해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그들이 마냥 대단해보이기만 했었다.
박사 1학년 시절 듣던 수업에서 교수님들이 쓰고 있는 중이라는 논문으로 수업을 하시는데, 기본 가정을 너무 부실하게 잡아서 연구 목적이 달성될 것 같지 않아보이는 논문의 가정을 별 생각없이 지적했더니, 교수님이 ‘너무 논문 평가자처럼 볼 필요는 없다.(You act too much like a critic. You don’t have to.)’라며 받아주셨던 기억이 있다. 그 이후부터는 논문들의 수준을 좀 더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게 됐고, 누군가의 논문을 지적할 수 있는 만큼, 내 논문의 조잡함도 함께 이해하게 됐던 것 같다.

‘수학=언어’라는 훈련이 되어야 연구를 연구로 이해할 수 있다
대학원에서 가르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매년 논문 심사를 거쳐 외부 학회에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방식으로 졸업 논문을 승인하는 구조를 갖춘지 2년째다. 한국을 비롯한 동양 문화권 출신 학생들 대부분이 연구를 하고 싶어서 대학원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학위를 따고 싶어서 대학원을 가기 때문에 논문 주제부터 잘못 잡는 경우가 많아 결국 졸업을 못하는데, 반면 논문 심사를 무사히 통과하는 수준까지 성장하는 학생들의 논문을 보면 속칭 ‘탈한국’을 하는데 성공했구나는 생각이 들어 교육자 입장에서 뿌듯한 마음이 든다.
그 학생들과 평소에 대화를 나눠보면 딱 박사 1학년 때 눈이 열려서 내 논문이 매우 부끄러웠던 시절 같은 느낌이 든다. 자기 논문의 어떤 부분이 부족하고, 어떻게 고쳐야 할지 막연하게나마 이해가 됐는데, 아직 배운 내용이 부족하고, 고민해야 할 주제가 넘쳐난다는 것을 감은 잡은 눈치가 보이기 때문이다.
수학적으로 기초 공사가 제대로 되지 않은채 단순히 데이터만 구해와서 인공지능이라고 불리는 계산 방법론 몇 개만 적용해본 것으로 조잡한 논문만 발표하는 국내 명문대 교수들의 학회들에 불편한 감정이 많았는데, 수학적인 훈련이 어느 정도 됐다보니 본인의 무지를 깨닫는 대학원생들을 보면서는 오히려 반가운 감정과 응원하는 감정이 생기는 것은 무슨 이유일까?
첫 해에는 논문 발표 중에 계속 쏟아져 나오는 연구자들의 질문에 학생들이 대답을 못할까봐 두려운 감정이 컸다. 논문 지도 수업 내내 여러차례 지적했던 내용들인데도 대답을 못하는 것을 보면서 아쉬운 감정도 있었고,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일부러 질문하는 것처럼 답변을 해준 적도 있었다.
올해는 마음의 여유가 생겼는지 연구자들이 논문 지도 수업 중에 내가 했던 질문과 똑같은 질문을 하면 우습기도 하고, 대답을 못하는 학생들을 보면서 ‘몇 달이나 시간을 줬는데 왜 못 고쳤나’는 꾸중을 하고 싶은 감정도 솟구쳤다.
비슷한 질문들이 많이 나오는 것을 보면서, 역시 훈련을 받은 연구자들의 시선은 크게 다르지 않구나는 것도 이해하게 됐고, 반대로 저 학생들이 같은 시선을 갖추게 되면 더 이상 가르칠 필요없이 스스로 노력해서 성장하는 길만 남았다고 생각하니 박사 논문 지도를 그렇게 깐깐하게 하는구나는 이해도 새삼 얻게 됐다.
같은 눈높이를 갖춘 인력들로 구성된 학회의 장점
처음 SIAM 학회에 발표자로 뽑혔다는 이메일 답장을 받았던 무렵, 고작 박사 2학년에 갓 올라간 주제에 그런 유명한 학회에서 발표를 해도 될까는 두려움이 컸었다. 아예 모르는 내용을 질문 받고는 얼어버리는 것은 아닐까는 걱정도 있었고, 과연 내 연구에 다른 연구자들이 관심이나 있을까는 불안감도 있었다. 가장 결정적으로는 수학적으로 훈련도가 높지 않은데 미국 최대 수학 학회에 참가하는 실력자들에게 민폐를 끼치게 되지 않을까는 자기 불신이 밑바닥에 깔려 있었다.
다행히 둘째 날 오후 발표 순서를 배정 받았고, 첫째 날에 다른 발표들을 매우 열심히 들으면서 그 학회에는 수학 이외에 매우 다양한 전공의 사람들이 초청을 받았고, 자기들 세부 전공에서 하는 연구 방식은 다르지만, 쓰는 언어가 ‘수학’인 덕분에 서로 의사소통이 된다는 것을 깨달았었다. 거기다 내가 쓰고 있는 언어가 그들과 같은 언어고, 내 연구가 그들의 연구보다 그렇게 수학적으로 모자라지 않다는 것을 알게되니 안도감이 생기더라.
둘째 날 오후에 연구실 동료와 발표를 나눠 맡으며 질문에 답변을 다 하고, 쉬는 시간에 전 세계 다양한 국가, 다양한 전공 출신의 연구자들에게 평소에 보지 않았던 관점에서 색다른 질문을 받으면서, 이런 것이 연구고, 이런 것이 학회 행사라는 것을 어렴풋하게나마 이해하게 됐던 것 같다. 특히, 그들과 같은 언어를 쓰고, 같은 눈높이를 갖추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나니 더 편하게 진행하던 다른 연구들을 공유할 수 있었고, 그들의 경험담 하나하나가 내 연구의 방향을 미세조정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던 기억이 난다.
그 때부터 10년 남짓이 지났는데, 여전히 학회에 가면 초급 연구자에 불과하지만 그래도 그들이 쓰는 언어를 이해하고, 어떤 부분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내는 것이 고급 연구로 받아들여지는지를 이해할 수 있는 덕분에 불편함 없이 대화할 수 있는 수준으로 올라선 것에 만족감을 얻는다. 전공이 같지 않더라도 수학적 도구를 쓰는 눈높이가 비슷한 인력들이 모인 학회라면 얼마든지 다른 연구를 이해하고, 나 스스로를 한 단계 더 도약시키는 배움을 얻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됐기 때문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학회 논문 발표를 들으면, 새로운 것을 배우면서 느끼는 쾌감 덕분에 더 많은 학회를 찾아가고 싶어진다.
반대로 같은 눈높이를 갖추지 못한 분들, 같은 언어를 쓸 수 없는 분들의 이름 뿐인 학회에는 초청을 받아도 참석하기가 싫어진다.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 잘못된 내용, 틀린 내용을 발표하거나, 고급 연구가 아니라 단순한 기업 설명회 수준의 발표에 지나지 않는 자리를 ‘학회’라고 이름을 붙여놨기 때문이다. 그 분들께 미안하지만, 그런 학회를 피할 수 있는 눈을 갖추게 된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한다.
가르친 학생들이 뼈아픈 질문을 받고 자기 논문의 부족함에 자책하는 것을 보면서, 저렇게 시련을 이겨내면서 탄탄한 역량을 갖추고 나면 언젠가 나처럼, 혹은 나보다 더 뛰어난 연구자 분들처럼, 불안한 마음으로 학회를 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배움에 대한 기대감으로 학회를 찾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반대로, 내실이 없는 학회를 피할 수 있는 시야를 갖추고 좀 더 생산적인 일에 노력과 열정을 쏟게되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