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제2의 이수빈’이 있어야 삼성이 되살아 난다
상명하복 위주의 인력들만 남고 도전형 인재는 퇴사하는 분위기 오랫동안 이어져
2000년대 후반부터 인재 관리 시스템 조금씩 망가졌던 것이 가시화되는 상황이라는 지적도
기술 개발 이전에 무능한 인력들을 대규모로 정리해야 회사 사정이 나아질 것
증권가에는 ‘주가는 실적의 그림자’라는 격언이 있다. 각종 홍보보다 실적이라는 내실이 핵심이라는 뜻이다. 삼성전자가 최근 ‘7만전자’도 아니고 ‘5만전자’까지 추락한 것도 영업이익이 기대를 밑돌고, 향후 전망도 비관적이기 때문이다.
관계자들은 고대역폭메모리(HBM)을 비롯한 주요 AI관련 제품 개발에 더딘 것과 D램 가격 하락세가 주 원인이라고 지적하지만, 주요 삼성 관계자들은 조직 문화를 먼저 지적한다. 이건희 회장 퇴임과 전후로 삼성그룹 전체가 역동적인 도전 의식보다 현실 안주형 인재들 위주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위기 극복을 위해 과감하게 나서는 리더십이 뚜렷하지 않은 상황이 지속되는 동안, 도전 의식을 갖춘 소수의 인재들을 삼성을 떠나고, 현실 안주형 인재들만 적채되고 있는 상황을 타개하지 못하는 점을 꼽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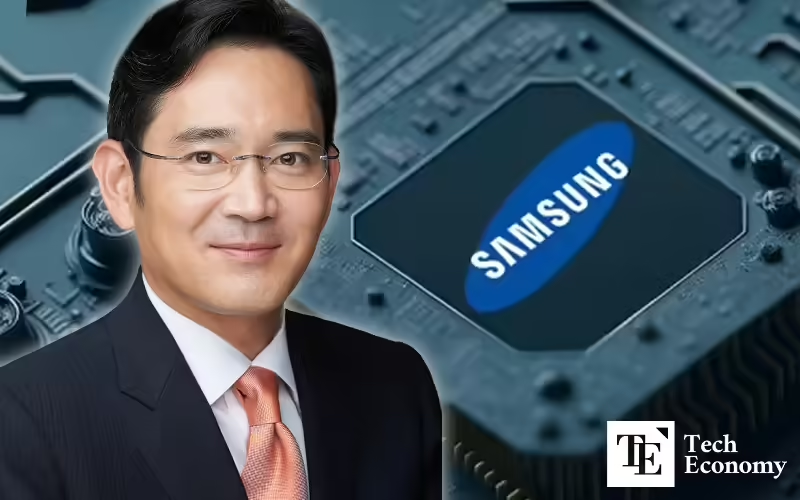
한국 사회에 만연한 ‘~만 하면 된다’는 사고를 갖춘 인재 위주의 구성
과거 이병철 회장, 이건희 회장 시절에 삼성 그룹 내에서 고위직으로 승진하는 인력들은 단순히 학벌, 역량 등에서 뛰어난 장점을 갖췄을 뿐만 아니라, 특정 프로젝트마다 리더십을 갖추고 어려움을 저돌적으로 돌파해 실적을 쌓아올린 경우가 많았다는 것이 2000년대 후반에 삼성 그룹 인사팀에서 임원으로 퇴직한 한 관계자 A씨의 지적이다.
공학도들이 기술적으로 새로운 도전을 해서 결과물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회사 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이 있었고, 성과를 낼 때마다 고액의 상여금이 지급되는 구조가 정착된 것을 보고 퇴임했던 해당 임원은 자녀 B씨의 공학 석·박사 유학을 지원하는데 자금을 아끼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자녀들이 한국에 귀국해 삼성 그룹에 취직하면서 겪은 삼성 그룹의 사정은 사못 달라졌다는 것이 해당 임원과 자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기술적인 도전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면 ‘가성비’가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각되는 일이 많고, 기술보다 눈 앞의 수익성, 윗 선에 보고할 수 있는 내용인지 여부가 더 중요한 상황이 됐다고 지적한다. 자녀 세대가 겪은 가장 불만 사항은 보고 라인에서 기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더 윗선으로 설명이 어려울 경우 해당 프로젝트 자체가 좌초된 경험이다. 공부를 하지 않는 인력이 임원이 되었다는 사실에 A씨가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자녀 세대가 겪은 삼성 그룹 인력들의 대다수는 한국 사회에 지난 2000년대부터 빠르게 확산된 ‘~만 하면 된다’는 안이한 사고 방식이 체화된 상태다. ‘보고서만 잘 올리면 된다’, ‘보고서만 예쁘게 만들면 된다’는 편의주의적 사고방식을 잘 갖춘 인력들이 고속 승진을 하는 반면, 실력을 갖추고 회사 역량을 끌어올리려는 인재들은 한계를 느끼고 퇴사를 결심하거나 분위기에 휩쓸려 조용히 지내는 상황이 이어진다. 삼성 그룹만은 예외였다고 주장하던 인사팀 출신 퇴임 임원은 현장 사례들을 듣고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공무원 유형 인재 위주로 돌아가는 기업이 된 삼성
지난 2022년 초, 국내 모 스타트업으로 이직한 전 삼성 그룹 데이터 과학 분야 인력 C씨는 “5년 동안 ‘뽑새’만 해서 진절머리가 났다”고 업무를 회상했다. 데이터베이스에서 자료를 찾아서 전달해주는 인력들을 사내에서는 ‘뽑새’라고 부르고, 일반적으로 수학, 통계학 등의 학부 전공을 한 인력들 중 해외 대학 출신들이 주로 배정됐다고 했다. 그러나 업무 자체가 매우 단순하기 때문에 늦어도 1년 내에 모든 업무를 이해하게 되는데, 더 고급 업무를 하고 싶어 의견을 내거나, 시스템 자동화를 위해 타블로(Tableau) 등의 해외 프로그램을 쓰는 제안을 내도 윗선에서 긍정적인 답변을 받기 어렵다고 답했다. 팀장 급 인력의 지원이 있어 프로젝트가 진행되더라도 더 윗선에서는 관심이 없고, 기껏해야 보고서에 예쁜 그래프가 들어가서 좋아했다는 반응이 전부였다는 답변만 내놨다.
카카오 그룹이 보험 사업 진출을 위해 인력을 대규모로 채용하자 삼성생명 및 삼성화재 인력들이 연봉을 낮춰서라도 대규모로 지원을 한 사례도 있다. 카카오 그룹 내에서는 삼성 금융계열사 내에 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을 기자들에게 묻기도 했다. C씨는 연봉만이 전부가 아니라 인력의 발전 가능성이 꽁꽁 막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났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C씨와 유사한 학벌 출신이지만 삼성그룹 금융계열사 내에서 업무가 좀 더 개발자와 접점이 많았던 D씨는 개발 인력의 수준도 글로벌 기업에 있는 학부시절 동료들에 비해 눈에 띄게 낮다는 점을 지적했다. 프로그램 설계 및 구조에 대한 이해가 이미 학부시절부터 탄탄하게 갖춰져 있는 동기들이 미국의 속칭 빅테크 기업들에 취직해서도 1~2년 간 퇴근을 잊고 열심히 공부해서 살아남기 위해 바쁜 반면, 삼성 그룹 내에서 만나본 개발자들은 영어로 된 개발 문서를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해 자신이 설명해줘야 하는 일이 잦았다는 것이다. 그런 인력들이 단순히 ‘코딩 테스트’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는 이유로 ‘S급’으로 평가 받는 상황이 반복되는 한, 삼성에서 내놓는 IT제품의 프로그래밍 수준에 대한 신뢰를 높게 가져 갈 수가 없다고 답변했다.
책임 있는 인력 관리, 역량 있는 리더가 필요한 시점
C, D씨를 비롯한 2030세대 인력들은 공통적으로 삼성 그룹의 가장 큰 문제로 이재용 회장을 꼽는다. 지난 정권 중 두 차례나 구속 수감되는 사건을 겪은 탓에 현장 직원들이 직접 대면하는 일이 드물었기는 하지만, 현장에서 무능하다고 판단되는 인력들이 고속 승진을 하는 동안 유능한 인력들이 회사를 등지는 사건을 막지 못한 것은 결국 오너의 책임이라는 것이다. 2030세대의 불만에 대해 A씨도 이건희 전 회장의 생전에는 없었던 일이라며 보고서 위주의 문화가 자리 잡혔다는 사실에 착잡한 반응을 나타냈다.
앞서 A씨는 B씨가 이직하려는 것을 두 차례나 막았으나, C씨와 D씨의 설명을 들으면서 삼성 그룹이 전반적으로 인력 관리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사실에 공감을 표현하기도 했다. 일반적으로 삼성그룹에서 5년 재직 후에 대리 직급을 달아주던 2000년대 초반에 3년 재직 후 대리 승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모 국책은행으로 이직했던 한 S대 상경계열 출신 인력은 “외국계 증권사, 컨설팅 수준의 고강도 업무는 아니었지만, 야근을 일상적으로 해야 살아남는 문화가 2000년대 초반까지는 남아있었다”고 밝히며, 다만 “최근들어 삼성그룹 출신으로 국책은행에 입사하는 사례들을 보면 업무 강도에 대한 인식이 많이 다른 것을 짐작할 수 있다”고 답하기도 했다.
최근 인력 관리 문제에 대한 지적이 나오자 삼성 그룹 차원에서 근무 시간을 늘린다거나, 비상 경영을 선포한다는 이야기가 나오자, C, D씨는 “과거 LG 스마트폰 사업부가 삼성산에서 사과를 깨물어 먹던 퍼포먼스를 보는 느낌”이라며, 현실적인 문제 극복 없이, 보여주기 위주로 돌아가는 조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사례라며 비웃음 섞인 반응을 보였다. 끝으로, C, D씨는 “(현재 이직한) 스타트업에서는 대표가 자리를 비워도 노는 사람이 없다”며 “이재용 회장이 자리를 비워도 눈치를 봐야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 분들이 뛰어난 능력자여서 직원들의 존중을 받을 수 있어야 삼성의 위기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는 평가로 인터뷰를 끝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