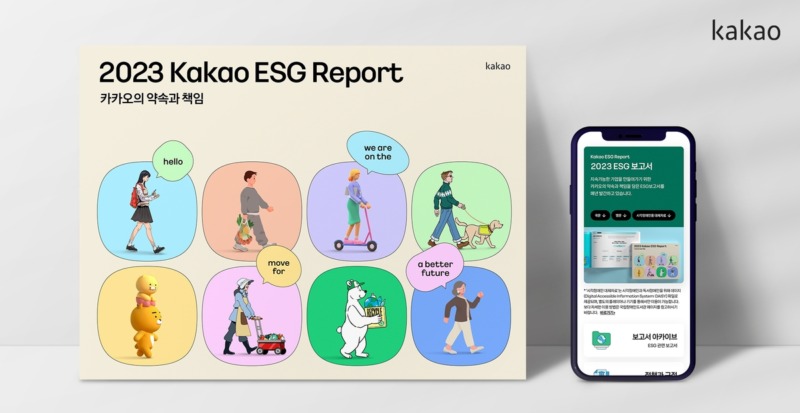‘70억원 상환 요구’ 쏘카에 발목 잡힌 더스윙, 고려할 수 있는 대안은?
더스윙 “자사 지분 달라는 쏘카 요구 과도해” 업계 관계자들 “인수전 참여 전에 확인했어야” 영업권 분리 인수 및 인수 무산 가능성 제기되기도

VCNC의 모빌리티 브랜드 타다(TADA) 인수에 나선 더스윙이 난관에 봉착했다. 240억원을 통 크게 베팅할 정도로 적극적인 더스윙이었지만, 쏘카에 대한 타다의 채무 70억원의 상환계획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며 인수 여부마저 불확실해지고 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공유 모빌리티 플랫폼 더스윙은 기존 토스 보유분인 타다 지분의 60%를 240원에 인수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현재 타다의 지분은 토스와 쏘카가 각각 60%, 40%를 보유하고 있다. 당초 최대 800억원까지 거론됐던 타다의 기업가치는 이로써 400억원으로 책정됐다.
“빌려준 70억원과 이자, 더스윙 지분으로 달라”
과반의 지분을 확보해 타다의 새 주인이 되려 했던 더스윙은 구체적인 협상 과정에서 쏘카와의 갈등을 맞게 됐다. 양사의 갈등은 쏘카가 타다 운영사인 VCNC에 빌려준 70억원의 단기차입금을 상환하라고 요구하며 시작됐다. 쏘카는 차입금과 이자에 해당하는 만큼의 더스윙 지분을 지급하고 더스윙 이사회에 진입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스윙은 쏘카 측의 요구가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쏘카에 대한 타다의 70억원 단기차입금 중 50억원은 이미 2월 만기를 넘겼는데, 5개월 동안 문제 삼지 않다가 본격적인 인수가 시작되자 이를 회수하려 한다는 이유에서다. 더스윙은 “과반의 지분을 인수하면 타다의 1대 주주가 되는 것은 맞지만, 그게 부채를 모두 떠안아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며 “나머지 20억원 역시 아직 9월 만기까지 여유가 있다”고 역설했다.
업계에서는 더스윙이 인수에 앞서 채무 등을 철저히 확인했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한 투자업계 관계자는 “타다가 인수합병(M&A) 시장에 매물로 나왔을 때부터 쏘카에 대한 채무는 따라다녔던 이야기”라며 더스윙의 부주의를 지적했고, 또 다른 관계자 역시 “더스윙이 자사의 지분으로 상환하지 않더라도 타다의 부채가 없어지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단기차입금 70억원은 더스윙의 타다 인수금 240억원의 29.1%에 해당하는 규모로, 쏘카가 이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지 않으면 향후 타다에서 발생하는 매출과 이익으로 이를 상환해야 한다. 단기차입금 의존도가 높을수록 회사의 재무 건정성이 불안해지는 만큼 사업 확장을 위해 타다를 인수하는 더스윙은 이 문제를 분명히 해결하고 넘어가야 한다.

M&A ‘걸림돌’ 거대 부채, 영업권 분리 인수로 벗어나기도
M&A 시장에서는 이런 경우 영업권만 인수하는 방식의 거래가 종종 포착된다. 예를 들어 기업 A의 가치가 100억원이고 부채는 그보다 큰 150억원이라고 가정할 때, 기업의 가치보다 더 큰 빚을 떠안아야 하는 A기업의 인수에 나설 투자자는 아무도 없다. 하지만 영업권만 살 때는 100억원 또는 그 이하의 금액으로도 거래가 이뤄진다. 영업권 인수는 기업의 포괄 양수와는 구분되는 개념으로, 기존 자산의 처분권이나 이용권 없이 A라는 이름으로 사업을 영위하며 얻어지는 초과 이익에 대한 권리만을 가진다. 동시에 부채 상환 의무에서도 자유롭다. 기존 A기업의 소유주는 150억원을 상환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100억원 또는 그 이하의 금액으로 영업권을 양도한 후 파산을 선언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채권자는 50억원 이상의 손해를 입게 되지만, 향후 150억원의 대여금을 모두 회수할 가능성이 불투명하므로 일부 회수에 만족하는 경우가 대다수다.
타다의 경우 채권자가 2대 주주라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원칙대로라면 단기차입금을 상환하지 못한 사업체는 파산하고 해당 사업체의 자산을 처분해 부채를 상계하게 된다. 하지만 쏘카는 지분 40%를 보유한 만큼 타다의 가치가 최대한 보전되기를 바랄 수밖에 없다. 다만 타다의 사업이 개선될 가능성에는 확신이 부족한 만큼 타다보다 안정적인 더스윙의 지분을 확보하는 식으로 자금을 회수하려는 것이다. 물론 이는 양사의 협의에 따라 결정될 사안이며, 더스윙이 거부할 경우 강제할 수 없다. 쏘카는 협상 진행 상황과 관련해 “지금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말을 아꼈다.
예상외로 빈번한 ‘인수 의사 철회’
중소기업은 상대적으로 자금력이 빈약한 만큼 M&A에서 ‘숨은 부채 찾기’는 필히 거쳐야 할 단계다. 피인수기업이 제시한 재무제표에 분식이 이뤄져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데다 실사 과정에서 부실자산, 부외부채 등이 드러나는 일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이다. 심지어 본격 사업 이전 단계에 특수관계자의 채권·채무가 발견되거나 기존 채무자의 대출 연장 거부 및 상환 요구가 들어오기도 한다.
실제로 지난해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왓챠는 LG유플러스(LGU+)의 적극적인 움직임으로 M&A가 급물살을 탔지만, 기존 투자자들의 반대 및 채권자의 전환사채(Convertible Bond, CB) 상환 요구로 인수가 무산된 바 있다. 왓챠는 2021년 CB를 발행해 490억원의 자금을 조달했는데, 대기업인 LGU+가 왓챠의 새 주인으로 나서자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의 운영사 두나무와 벤처케피탈(VC) 인라이트벤처스 등 채권자들이 자금 회수를 서두른 것이다. 재무적 투자자(FI)들 역시 LGU+가 신주를 발행해 왓챠의 경영권을 확보할 경우 투자금을 회수할 수 없을 것이라는 판단에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다. 결국 LGU+는 손을 뗐고 왓챠는 현재까지 새 주인을 찾지 못하고 있다.
더스윙은 적극적인 인수 의사를 밝히긴 했지만, 선택지가 많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포괄 인수 대신 타다의 영업권만을 인수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도 있으며, 인수를 강행한 후 유상증자 등을 통해 차입금을 해결하는 방법도 있다. 만일 모든 방안을 검토한 후에도 적절한 해답이 나오지 않으면 인수 의사를 철회할 수도 있다. 창업 6년 차의 젊은 기업 더스윙이 어떻게 이번 난관을 극복하고 성장할 수 있을지 시장의 이목이 집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