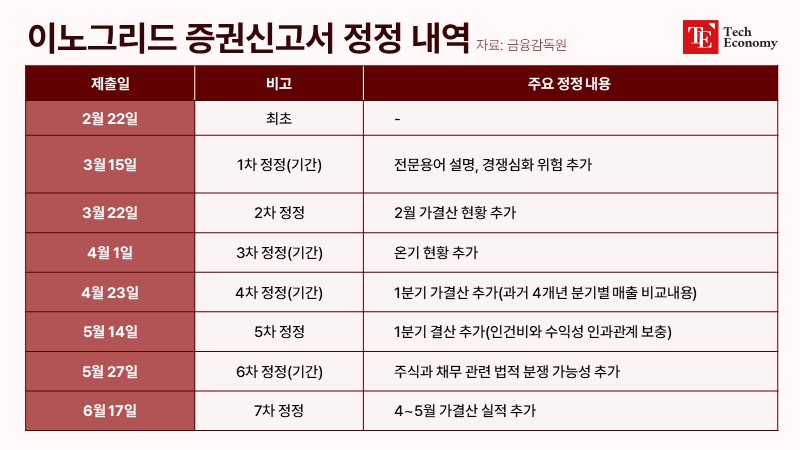IT 제조업 강화 나선 인도, 中 압박책 본격 수면 위로
인도, 태블릿·노트북 등 수입 제한 조치 인도, 샤오미·비보 등 통해 中 거듭 압박 인도 “中, 관계 개선 위해선 국경 내 군대 철수하라”

인도 정부가 노트북과 태블릿 및 개인용 컴퓨터 수입에 라이선스 요건을 즉각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애플, 델, 삼성전자 등에 큰 타격을 줘 인도 현지 제조를 높이고 자국 내 중국 기업의 영향력을 약화하겠단 취지다. 중국-인도 국경 대립 이후 물밑에서 진행되던 인도의 ‘중국 죽이기’가 본격화된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인도, 라이선스 제도로 수입 의존도 낮춘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인도는 지금까지 이들 품목에 대한 특별 제한을 두지 않았으나 이번 조치 이후 2020년 TV 선적에 부과됐던 것과 유사한 라이선스를 의무화했다. 이번 라이선스 제도가 도입될 경우 새 모델을 출시할 때마다 대기 시간이 길어질 수 있다. 기업들은 이번 조치가 인도의 쇼핑 시즌인 디왈리 축제 기간(10~11월) 직전에 발표된 데 우려를 표했다. 대규모 마케팅 사업에 큰 차질이 빚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애플, 삼성, HP는 수입을 즉각 중단하고 라이선스 취득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인도 정부와 협상을 벌이고 있다.
그간 인도의 나렌드라 모디 총리 정부는 현지 제조업을 독려하면서 수입은 억제해 왔다. 이런 가운데 인도의 전자제품 수입 규모는 지난 4~6월까지 지난해 대비 6.25% 늘어 197억 달러(약 25조6,986억원)를 기록했는데, 이 중 노트북 및 개인용 컴퓨터 시장만 연간 80억 달러(약 10조4,360억원) 규모에 달했다. 노트북 및 개인용 컴퓨터 시장의 약 3분의 2가 수입품인 셈이다. 이번 라이선스 제도가 자국 생산과 투자 유치를 위해 적극적인 장려책의 일환이라는 의견이 나오는 이유다.
라이선스 제도, 인도 생산기지 증가 불러올 듯
최근 인도는 자국의 생산력 제고에 정책의 방점을 두고 있다. 실제 지난 5월엔 IT 제조사들이 인도에 노트북, 태블릿 등 하드웨어 공장을 설립하도록 1,700억 루피(약 2조6,809억원) 상당의 인센티브 제도를 시행함으로써 현지 제조업을 활성화하기도 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일부 기업들은 인도에서 노트북을 제조하지만 삼성을 포함한 여러 업체들은 여전히 중국에서 제품을 생산한다”고 말한다. 현재 일부 다국적 컴퓨터 회사는 인도에서 노트북을 만들고 있으며, 인도 노트북 시장의 23%를 차지하고 있는 HP 또한 지난 2021년 인도 남부 타밀나두주에서 노트북을 제조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델과 레노보도 인도에서 노트북을 제조 중이다. 그러나 이외 아수스, 삼성 등은 인도가 아닌 중국, 베트남 등지에서 노트북을 생산한다.
이번 조치로 인해 인도로 생산기지를 옮기는 기업은 더욱 많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겉으로 미국-유럽의 중국 시장 규제 움직임에 동참하면서도 자국의 이익을 끌어내기 위해 라이선스 제도를 도입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추측하고 있다. 다만 일각에선 인도 정부의 수입 제한 조치가 향후 몇 개월 동안 인도 컴퓨터 시장을 혼란에 빠뜨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한다. 시장조사기관인 카날리스는 “노트북 가격이 제품 부족으로 인해 인상될 가능성이 높다”며 “애플과 아수스 등 인도 현지에서 노트북을 제조하지 않는 기업은 노트북 수입 허가를 받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전했다.

국경 분쟁 상처, 중국-인도 갈라놨다
한편 중국과 인도 사이의 제조업 공방은 이전부터 이어져 왔다. 지난해 1월 5일 인도 정부는 중국의 스마트폰 제조 기업인 샤오미(Xiaomi)가 일부 관세를 회피했다며 8,800만 달러(약 1,148억원)를 납부해야 한다고 통보한 바 있다. 샤오미가 로열티와 라이선스 수수료를 거래가격에 포함시키지 않고 수입 부품의 가격을 낮추는 등 꼼수를 부렸다는 건데, 전문가들 사이에선 사실상 인도의 중국 기업에 대한 ‘압박’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왔다. 중국의 전자 통신 기기 제조업체인 ZTE와 비보(Vivo)가 인도 정부의 수사 선상에 오른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지난해 7월 7일엔 인도 금융범죄 기관인 집행국(ED)이 자금 세탁 혐의로 비보의 계좌 119개에 대한 거래를 차단하기도 했다. 이후 13일에는 인도 국세정보국(DRI)이 중국 스마트폰 제조사인 오포(Oppo)가 수입세를 납부하지 않으려 했다며 대중 압박을 강화했다.
일련의 과정 속에 중국 정부는 “인도 내 영업 중인 중국 기업을 공정하게 대우해야 한다”며 인도 정부를 직격했으나 인도 정부는 흔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인도-중국 국경에서 중국이 군대를 철수해야만 인도-중국 간 관계가 정상화될 수 있을 것”이라며 압박을 강화하는 모양새를 보였다. 인도와 중국 사이의 관계 악화는 국경 분쟁에 그 기원이 있다. 실제 지난 2020년 인도와 중국이 국경에서 충돌한 이후 정치적 긴장이 강화되며 인도 내 중국 기업들의 경영은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어려워졌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국경 충돌 사건 이후 인도 내에서 300개 이상의 중국 앱이 차단됐으며, 중국 기업의 인도 투자 규제도 더욱 엄격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