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도 ‘자국 중심주의’, 현대차 보조금 30% 삭감에 업계 “출구전략 재정립 필요해”
자국산 전기차 경쟁력 높이는 일본, 현대차·BYD 등 보조금 '삭감' 친환경차로 '빈틈' 노리던 현대차, 일본 정부 개입에 경쟁력 '뚝' '인베스트 아메리카' 강조하던 미국, IRA로부터 시작된 '자국 중심주의'

일본 정부가 현대자동차의 전기차에 지급하는 보조금을 30%가량 대폭 삭감했다. 전기차 전환에 한발 늦은 토요타 등 자국산 전기차의 가격 경쟁력을 더 높이기 위함이다. 결국 일본도 미국을 이어 자국 중심주의 정책을 펼쳐나가는 모양새인데, 이에 업계에선 “자국 중심주의 경향성이 앞으로 더욱 확산된다면 현대차 등 국내 완성차 업체의 파이는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불안의 목소리가 나온다.
일본, 자국산 외 전기차 보조금 대폭 삭감
26일 업계와 외신 등에 따르면 일본 경제산업성은 올해 전기차(EV) 차종별 보조금을 최근 공표했다. 가솔린차보다 가격이 비싼 전기차의 구입 금액을 일부 보조해 소비를 촉진하겠다는 게 정책의 골자로, 전체 예산은 1,291억 엔(약 1조1,500억원)에 달한다. 이에 따르면 올해 일본의 전기차 한 대당 보조금 상한액은 최대 85만 엔(약 750만원)이다. 최저액은 12만 엔으로, 최대액과 73만 엔이나 차이가 난다. 일본 정부는 올해 보조금 책정 때 충전 거점의 정비 상황 등을 새로운 평가 항목으로 넣었다. 지난해까지는 한 번 충전했을 때 최대한 달릴 수 있는 거리 등 차량 성능이 핵심이었으나, 정책적 시선을 옮김으로써 제조사가 충전기 설치를 늘리도록 유도했다는 게 일본 정부의 설명이다.
차종별로는 닛산 리프와 도요타 렉서스, 테슬라 모델 3가 최고액인 85만 엔을 받게 됐다. 마쓰다 MX-30과 메르세데스벤츠 EQA는 보조금이 65만 엔으로 책정됐으며, 현대차 코나는 45만 엔, BYD 돌핀은 35만 엔으로 각각 결정됐다. 결국 닛산 도요타 등이 지난해와 같은 수준의 보조금을 받는 것과 달리 현대차는 지난해 대비 20만 엔 깎인 셈이다. BYD는 30만 엔 덜 받게 됐다. 이에 업계에선 “일본 정부가 현지에 충전 정비 거점을 설치하기 어려운 한국, 중국 등 해외 메이커에 불리하도록 제도를 설계했다”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일본 정부가 “자사 정비망이 없어도 다른 회사와 제휴하면 평가에 반영하겠다”고 밝히긴 했으나, 일본 완성차 업체가 경쟁 관계인 현대차에 손을 내밀 가능성은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일본 진출 난항, 보조금 이슈에 ‘틈새시장’도 사라지나
이를 두고 업계 일각에선 “12년 만에 일본에 재진출한 현대차가 뒤통수를 맞았다”는 힐난의 목소리가 쏟아지지만, 주류 의견은 역시 “어쩔 수 없다”에 가깝다. 애초 일본 시장에 진출하기 어렵다는 건 초창기부터 인지하고 있던 일이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 2022년 현대차가 일본 승용차 시장에 다시 뛰어들겠다고 밝힐 당시 언론에선 “쉽지 않을 것”이란 이야기가 거듭 이어졌다. 통상 일본 차 시장은 세계 자동차 업계에서도 난공불락으로 꼽힌다. 워낙 자체 브랜드 파워가 강한 탓도 있지만, 자국산을 선호하는 소비자들의 성향이 강하다 보니 해외 차종은 일본 내에서 제힘을 쓰지 못한단 것이다.
회의적 반응이 이어지는 와중 현대차가 내건 출구전략은 ‘틈새시장’이었다. 기존의 내연기관 차 대신 넥소(수소차), 아이오닉5(전기차) 같은 친환경차를 주력 차종으로 선보임으로써 빈틈을 노리겠단 전략이었다. 실제 일본 완성차 시장은 주력이 하이브리드이다 보니 전기차 부문은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평가가 주류다. 오늘날에 봐도 일본의 전기차 점유율은 2023년 기준 2.2%로 세계 주요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현대차의 전략이 어느 정도 맞아떨어진 셈이지만, 사실상 세계적 흐름으로 자리 잡은 자국 중심주의 정책의 영향은 현대차도 채 피해 가지 못한 모습이다. 토요타와 닛산 등 일본 기업들이 전기차 생산에 거듭 관심을 갖고 있는 데다 일본 정부의 자국 중심 정책까지 겹치면서 앞으로는 현대차가 휘어잡을 틈새시장도 남아나지 않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적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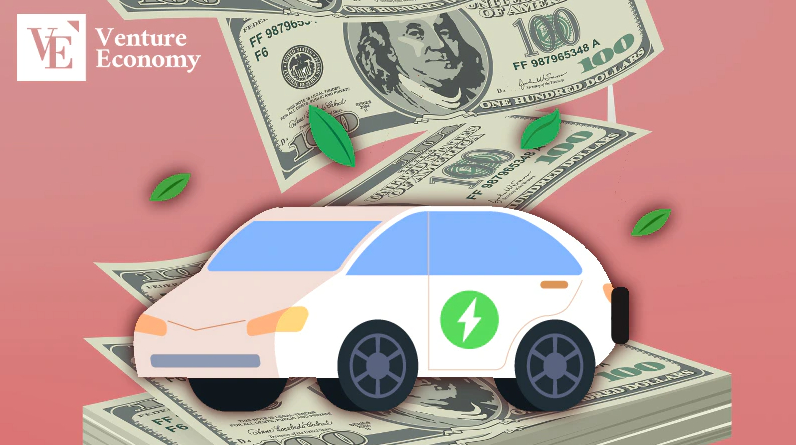
자국 중심에 신호탄 당긴 미국 IRA, 업계 불안↑
문제는 일본뿐 아니라 향후 다른 국가에서도 이 같은 상황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현대차는 이미 일본에 앞서 미국에서도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고초를 겪은 바 있다. 미 재무부는 지난해 4월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세부 지침에 따라 최대 7,500달러(약 975만원)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22개 친환경차량을 발표했는데, 이 중 현대차와 기아는 물론 닛산, 폭스바겐 등 전기차도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됐다. 당시 백악관은 전기차 보급 추가 대책을 발표하며 “제조업 부흥을 통해 미국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인베스트 아메리카’(미국 투자) 대책의 일환”이라며 “IRA 전기차 보조금 조항으로 전기차 및 배터리 산업이 활성화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 차원에서 직접 자국 중심주의 정책 기조를 밝히고 나선 셈이다.
실제로 IRA 보조금 지급 대상에 포함된 브랜드는 제네럴모터스(쉐보레·캐딜락) 6종, 포드와 테슬라 5종, 스텔란티스(크라이슬러·지프) 3종, 포드(포드·링컨) 3종 등 미국 기업들이었다. 특히 현대차 제네시스 ‘GV70 전기차’의 경우 미국 앨라배마 공장에서 조립되는 덕에 2022년 보조금 지급 대상에 포함될 수 있었지만, 지난해엔 배터리 조립 및 광물 규정을 맞추지 못하면서 보조금 대상에서 빠졌다. 그나마 리스 등 상업용 차량에 대해선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지만 이것만으로 부족한 점유율을 채우기엔 역부족이었다. 국가 입장에서 자국 중심으로 정책을 구성하는 데 비난을 쏟을 수는 없겠지만, 결국 출구전략 재정립을 이뤄내지 못하는 한 현대차는 부진을 피해 가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