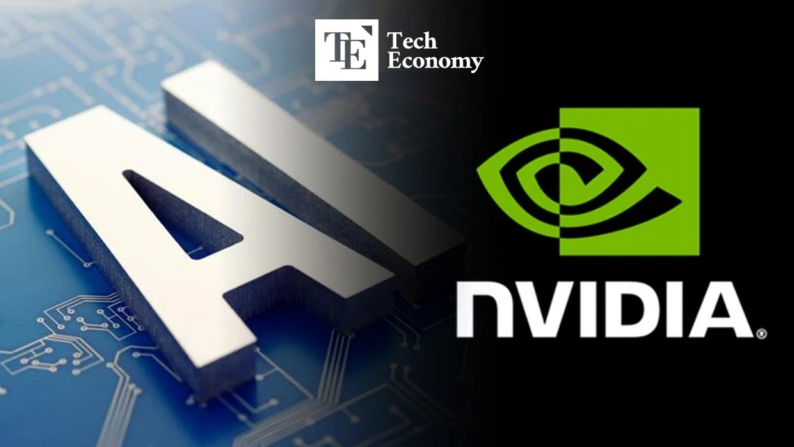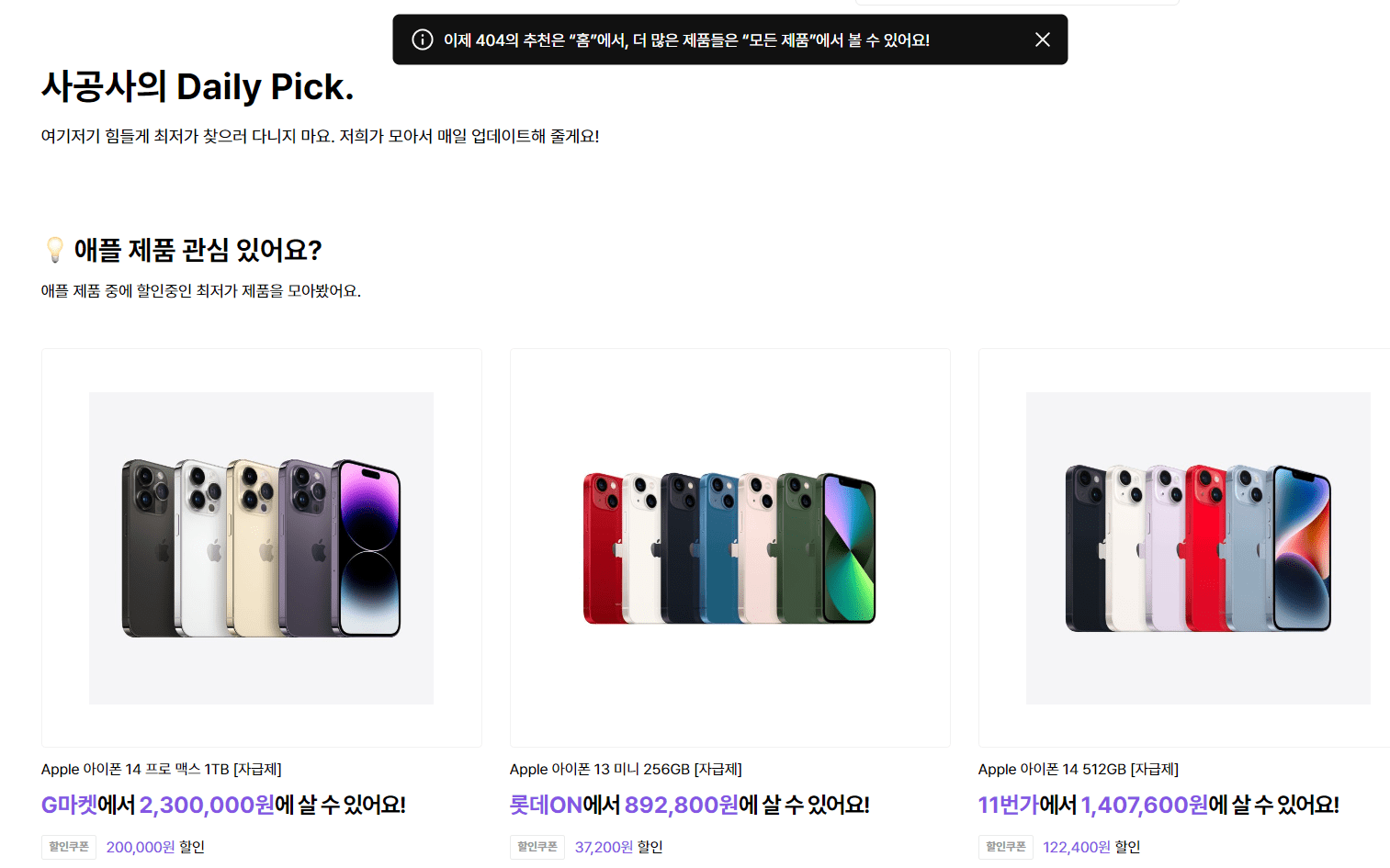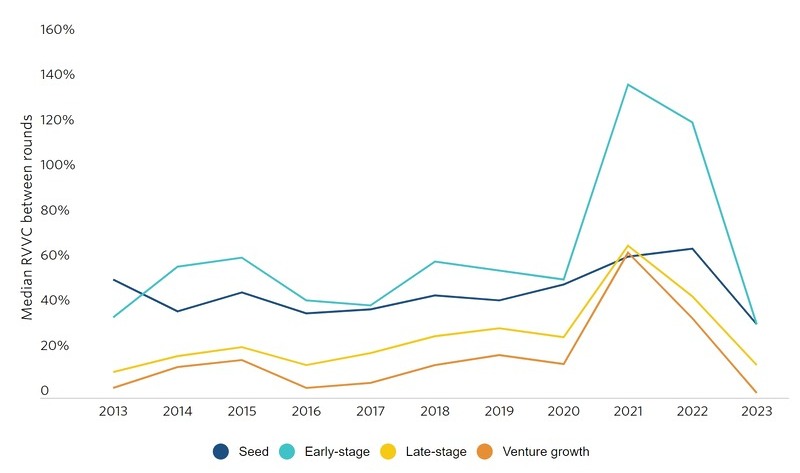연이은 전기차 화재에도 지지부진한 관리 체계 확립, 배터리 검증 ‘프리패스’ 논란도
잇단 전기차 화재에 '포비아'까지 확산했는데, 정작 배터리 안정성 평가는 미흡
여전히 대책 마련에 소극적인 정부, 배터리 정보 공개 의무화도 지지부진하기만
적절한 대응으로 노트7 폭발 사태 견딘 삼성, 전기차 업계도 사후 처리 집중해야

전기차 화재로 인한 불안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국내 출시된 순수 전기차 중 상당수가 배터리 안정성 평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수입 전기차는 대부분이 검증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나타났다. 안정성 평가의 실효성이 전무한 상태였단 의미다. 정부는 내년 2월부터 전기차 배터리 인증제를 시행해 검증 과정을 강화하겠단 입장이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선 여전히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정부의 배터리 인증 과정이 ‘배터리 팩’에만 집중된 탓에 제대로 된 검증이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단 이유에서다.
전기차 자기인증적합조사 미비, 수입차는 사실상 ‘사각지대’
23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한국교통안전공단 산하 자동차안전연구원이 2019년부터 작년까지 최근 5년간 진행한 자기인증적합조사를 한 차종은 8종(승용 순수 전기차 기준)에 불과했다. 현재 국내에 배터리 정보가 공개된 전기차가 108종인 점을 감안하면 93%(100종)의 차량이 검증 대상에서 제외된 셈이다. 조사가 이뤄진 차량도 ▲아이오닉일렉트릭 ▲쉐보레 볼트EV ▲코나EV ▲니로 EV, 2022년 ▲아이오닉5 ▲EV6 ▲아우디 e-tron55, 2023년 ▲제네시스 GV60 등으로 아우디를 제외하면 모두가 국내 생산 차량이다. 수입 전기차는 사실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얘기다.
실제 지난해 국내 수입차 시장에서 가장 많이 판매된 전기차인 테슬라 모델Y는 1만3,885대가 판매될 때까지 자기인증적합조사를 받지 않았다. 모델3, 폴스타2, 벤츠 EQE·EQB, BMW iX3·i4 등 베스트셀링 전기차 모델들도 마찬가지며, 최근 대형 화재 사건으로 물의를 빚은 벤츠 EQE350+ 역시 검사를 받지 않았다.
문제는 전기차 배터리 인증 시스템에 대한 정부의 태도가 여전히 소극적이란 점이다. 정부는 전기차 화재 사고가 잇달아 발생하자 전기차 제조 업체에 자발적인 배터리 정보 공개를 ‘권고’하기만 했다. 해외에서 배터리 제조사 정보 공개 의무화를 시행하고 있는 것과 괴리가 큰 지점이다. 유럽은 오는 2026년부터 배터리 정보 공개를 의무화할 예정이며, 미국은 캘리포니아를 중심으로 정보 공개 의무화를 추진 중이다. 중국의 경우 지난 2018년부터 ‘배터리 이력 추적 플랫폼’을 구축해 배터리 셀과 팩 제조사, 구성 성분 등 정보를 이미 공개하고 있다.
배터리 인증제 시행한다지만, 전문가들 “반쪽짜리 인증제”
정부는 우선 내년 2월부터 전기차 배터리 인증제를 시행해 안전성을 높여 보겠단 입장이다. 통상 전기차에는 개별 배터리 셀을 묶은 모듈을 패키징한 배터리 팩이 장착된다. 이 배터리 팩에 충격을 가하거나 물과 불을 집어넣는 등 다양한 시험을 거쳐 안전성을 점검하겠단 게 정부가 밝힌 배터리 인증제 계획의 골자다.
다만 이를 두고 전문가들 사이에선 ‘반쪽짜리 인증제’라는 비판이 나온다. 배터리 팩에만 한정해 기준을 마련하고 안전 시험을 거치는 건 수박 겉핥기에 지나지 않는단 지적이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전기차 화재의 대부분은 배터리 셀 불량이나 충격에 의한 셀 단락으로 발생한다. 전기차 화재 예방을 위해선 배터리 팩이 아니라 배터리 셀 단위, 모듈 단위에서의 정밀검사가 필요하단 것이다.
전기차 화재 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배터리관리시스템(BMS)’ 미흡이 거론되고 있는 만큼 BMS 체계를 고도화하기 위한 방책이 수반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크다. 22일 ‘전기차 화재 대응을 위한 안전관리 방안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송준호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수석연구원은 “전지를 아무리 잘 만들어도 수십억 개 중 1개는 결함이 있을 수 있다”며 “이를 잘 걸러내고 실시간으로 감지하는 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게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BMS는 전기차의 핵심인 배터리의 전압, 온도 등 상태를 점검하고 이를 제어하는 소프트웨어다.

전기차 화재, ‘갤럭시 노트7 사태’와 닮은꼴
이런 가운데 최근 시장 일각에선 이번 전기차 화재 사고를 과거 갤럭시 노트7 연쇄 발화 사건과 연결 짓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다. 당시 사태와 유사한 점이 많다는 이유에서다. 지난 2016년 삼성전자의 갤럭시 노트7은 연쇄적인 발화 및 폭발 문제로 큰 물의를 빚은 바 있다. 당시 문제의 원인으로 지목된 건 다름 아닌 배터리였다. 배터리 셀 제조 공정상 오차가 생긴 탓에 셀 극간의 눌림 현상 등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화재가 나타난 것이다.
연쇄 발화 사건이 이슈화하면서 언론을 중심으로 삼성전자 위기론이 쏟아졌다.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까지 발화 문제가 확산하며 삼성전자의 브랜드 이미지가 큰 타격을 받았기 때문이다. 실제 이 시기 인터넷 커뮤니티나 SNS를 중심으론 “이제 무서워서 삼성전자 제품 못 사겠다”는 성토가 적지 않았다. 잇단 화재 사건으로 ‘전기차 포비아(공포증)’라는 신조어까지 생길 정도로 위기에 몰린 전기차 업계와 상황이 비슷했다.
다만 오늘날 삼성전자는 여전히 막강한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하고 있다. 사고가 발생하자 제품 출시 10여 일 만에 갤럭시 노트7를 전량(250만 대) 회수하는 등 발 빠른 대처를 이룬 영향이 컸다. 이후 배터리 관리 체계를 강화해 폭발 사고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았단 점 역시 이미지 회복의 요인이 됐다. 결국 현시점의 전기차 업계에 가장 중요한 과제는 ‘적절한 사후 처리’라는 의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