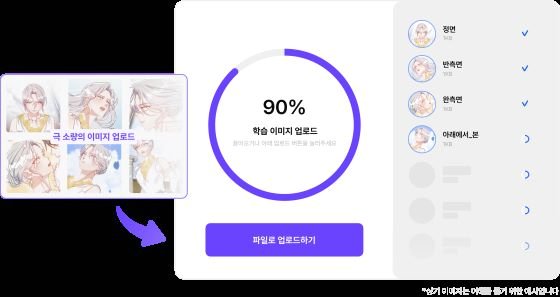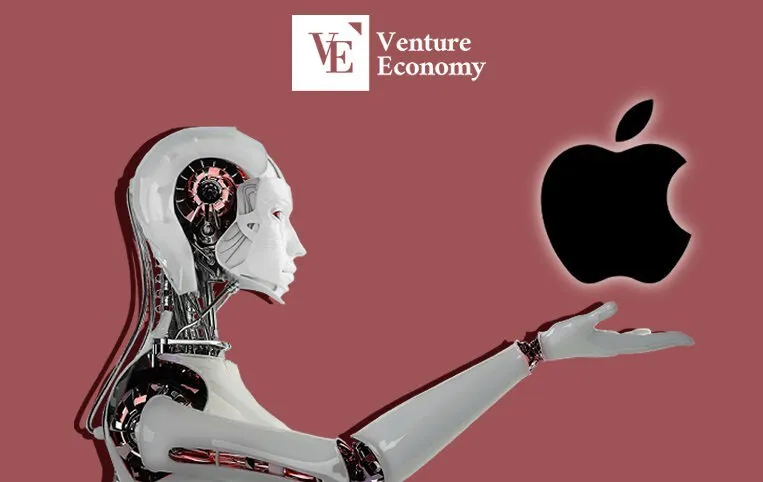사업화 없이 손실만 커진 AI 상장사들, 실적 개선 노력에도 ‘인력 부족’이 발목 잡아
수익 못 내는 코스닥 AI 기업들, "거액 투자 등 어려운 영향"
기술 특례 제도로 상장은 했지만, "기술 고도화도 사업화도 못 이뤄"
기업 발목 잡는 '전문 인력 부족' 문제, 과학기술 대내외 협력도 세계 최하위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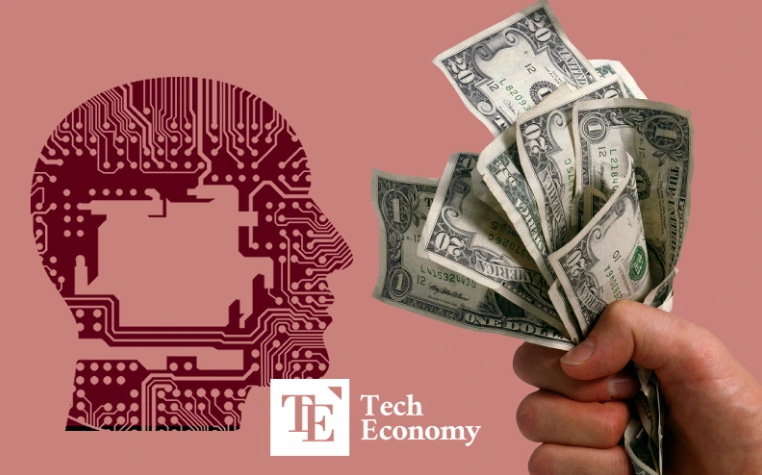
AI 기술을 앞세운 코스닥 AI 기업들의 수익이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거듭 적자만 이어가면서 성장 동력을 잃은 건 덤이다. 이에 따라 AI 기업들은 올해 실적 개선과 스케일업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할 숙제를 떠안게 됐지만, 인력도 기술도 부족한 국내 AI 기업들이 이를 제대로 해낼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평가가 시장을 중심으로 쏟아진다.
적자만 쌓이는 AI 기업들, “수익 창출 쉽지 않아”
14일 증시에 따르면 솔트룩스, 코난테크놀로지, 알체라 등 코스닥 상장 AI 솔루션 기업들의 지난해 적자 규모가 전년 대비 늘어났다. 솔트룩스는 AI·빅데이터 플랫폼 기업으로, 지난해 연결 기준 308억원의 매출을 올렸으나 93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2022년 매출 303억원 영업손실 20억원과 비교하면 매출이 소폭 상승한 가운데 손실 규모만 크게 늘어난 셈이다.
코난테크놀로지는 2022년 154억원에서 지난해 244억원으로 매출이 큰 폭으로 상승했지만, 영업손실 규모도 덩달아 40억원에서 110억원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 영상인식 AI 솔루션 기업 알체라도 지난해 매출 116억원에 영업손실 185억원을 기록했다. 솔트룩스와 알체라는 벌써 3년 연속 영업 적자를 누적했고, 코난테크놀로지는 상장 이후 2년 연속 적자를 기록 중에 있다.
이들 AI 기업의 공통점은 거대언어모델(LLM) 등을 자체 개발하면서 AI 기술 내재화에 수년간 투자해 왔다는 점이다. LLM 기반 생성형 AI 분야는 양질의 데이터와 대규모 컴퓨팅 파워, 우수 인재 보유 여부가 경쟁력을 좌우한다. AI 학습에 필요한 고성능 그래픽처리장치(GPU) 구매 등 인프라 부문에 대한 거액의 투자도 필수다. 대기업도 아닌 국내 일반 기업 입장에서 쉽지 않은 숙제들이다.
이에 대해 한 업계 관계자는 “생성형 AI 분야는 네이버와 같은 빅테크 기업도 수년간 수천억원을 들여 LLM 등을 개발할 만큼 막대한 투자가 필요한 분야지만, 당장 수익을 내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 때문에 국내 기업 중에는 자체 LLM 개발 대신 오픈소스나 경량화모델(sLLM) 등으로 실리적 선택을 하는 기업들도 있다”고 설명했다.
사업화 못 하는 기업들에, 기술 특례 제도에도 ‘물음표’
AI 기업의 부진이 이어지면서 기술 특례 제도 효용성에 의문을 갖는 이들도 늘었다. 기술 특례 제도란 기술력이 뛰어난 회사가 상장할 수 있도록 상장 기준을 낮춰 주는 제도로, 2005년 처음 도입됐다. 기술 특례에 신청하기 위해선 기술보증기금, 나이스평가정보, 한국기업데이터 등 한국거래소가 지정한 기술평가기관 3곳 중 2곳에서 신용등급 ‘BBB’ 이상을 받아야 하고 이중 적어도 한 곳에서는 ‘A’등급 이상을 받아야 한다.
특히 당장 재무상 적자가 있더라도 회사가 보유한 기술의 우수성이 인정되는 경우 상장의 기회를 주는데, 지난 2015년 스타트업 활성화 목적으로 기술 특례 상장의 문턱이 낮아지면서 이를 기회 삼아 상장한 AI 관련 기업들이 부쩍 많아졌다. 기술 특례 상장 기업은 상장 후 5년까지 매출이 없더라도 상장을 유지할 수 있어 진입에 더욱 용이하기도 했다.
다만 문제는 기술 특례로 코스닥에 진입한 AI 기업들이 사업화 및 고도화 없이 적자만 누적하고 있다는 점이다. 기본적인 기술적 역량이 부족해 기술 고도화가 어려워 사업화를 이루지 못하고, 또 사업화를 이루지 못하니 R&D 자금이 바닥나기 시작하면서 역량 강화가 어려워지는 등 악의 순환이 반복되고 있단 것이다.
이와 관련해 한 AI 업계 관계자는 “결국 기업이 살아 남기 위해선 기획과 개발 단계를 거쳐 사업화·고도화를 통해 상품을 제공해야 하는데, 다수 AI 업체들이 기획, 개발 단계에서 기술 특례 상장을 통과해 사업화·고도화가 결여됐다”며 “소비자의 정확한 니즈를 충족하지 못한 업체들의 문제점이 실적 악화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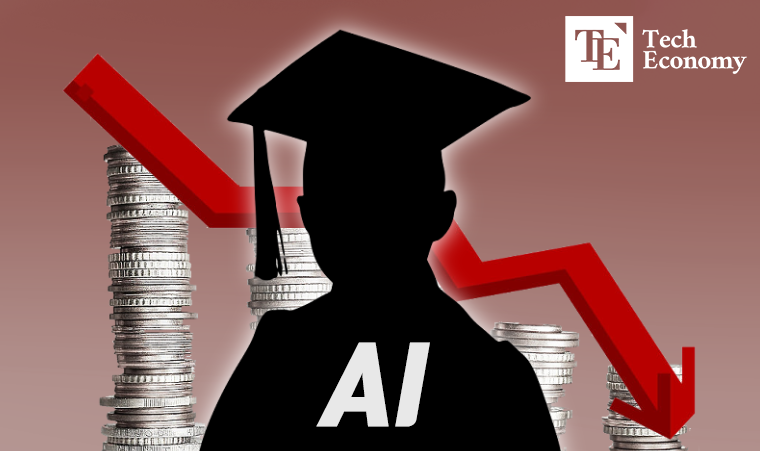
움직이기 시작한 시장, 당면 문제는 ‘인력 부족’
물론 시장에 변화가 없는 건 아니다. 올해부터 기업이나 공공기관 등 수요처 중심으로 실질적 AI 활용에 시장의 관심이 쏠리면서 AI 기업들도 덩달아 각성해 지난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수요 찾기에 나섰다. 대표적으로 알체라는 자사가 보유한 얼굴 본인인증, 신분증 본인인증, 출입관리, 산불 조기감지 등 솔루션을 금융, 환경, 정부와 공공기관, 공항 등에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대부분 안면인식 AI 솔루션 사업 매출로 올해는 금융권 사업 확대에 집중하겠단 게 알체라의 계획이다. 사업 방향성을 확고히 잡으면서 성장 가능성도 높아졌다. 알체라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수주잔고는 103억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별도 기준 연 매출 104억원에 육박하는 규모다.
다만 국내 시장 특유의 인력 부족 문제는 여전히 중소 AI 기업의 발목을 잡을 전망이다. 인력이 없으면 본격적인 기술력 향상을 이뤄낼 수 없기 때문이다.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지난 3월 발표한 ‘초격차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한 글로벌 기술협력 촉진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과학기술 관련 연구 인력 부족 규모는 2019년~2023년 800명에서 2024~2028년 4만7,000여 명으로 60배가량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다.
국내외 기술 협력 속도도 더딘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기준 한국의 과학기술 분야 국외 협력 논문 수는 2만7,281건이었는데, 이는 미국의 8분의 1, 중국의 6분의 1 수준이다. 특히 비중(31.2%)으로는 46개국 중 40위의 최하위권을 차지했다. AI를 포함한 국내 과학기술 생태계의 현주소가 이렇다 보니, 국내 AI 업체의 발전도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렵다는 시장의 평가가 심심찮게 나오는 추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