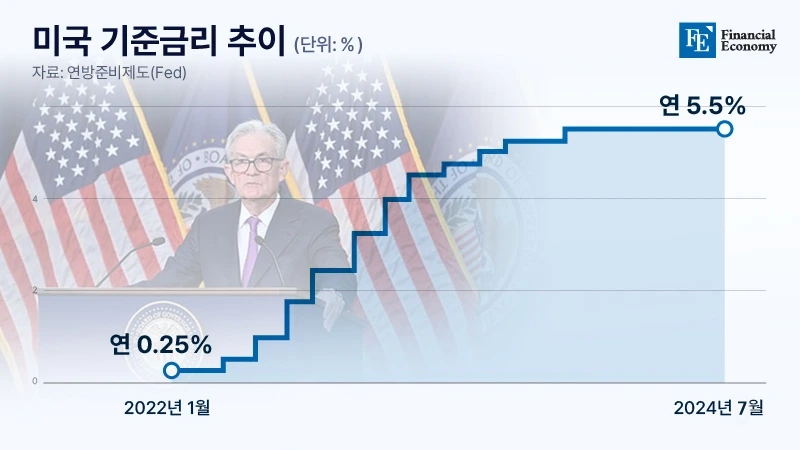‘탄소중립사회’ 이행 위해 경기 침체 고통 억누르고 있는 독일, 우리나라 탈원전 정책의 방향성은?
獨 경기 침체의 원인은 ‘고집스런 에너지 정책’ 주변국 에너지 인프라 및 대국민 지지 힘입어 현재 고통 감수할 듯 일각에선 우리나라가 獨 양상 뒤따르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모두가 부러워했던 ‘제조업 강국’ 독일이 역성장 위기에 처했다. 위기감을 느낀 독일 정부 당국은 최근 법인세 감면 등 대규모 공적 자금을 풀며 경기 부양에 나서고 있다. 전문가들은 독일의 경기 침체가 고집스러운 ‘신에너지 정책’에서 비롯됐다고 분석한다.
한편 한국전력도 탈원전 정책의 움직임으로 인해 대규모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 이에 일각에선 우리나라가 독일의 경기 침체 전철을 그대로 밟는 양상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제조업 강국’ 독일이 휘청거리는 이유
지난달 29일(현지 시간) 독일 연립정부가 46조원 규모의 법인세 감면을 골자로 한 감세안에 합의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 보도들은 이번 파격적인 독일 당국의 감산으로 자국 연방정부와 주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26억 유로(약 37억5,324억원), 25억 유로(약 36억827억원), 19억 유로(약 27억4,227억원)의 세수 부족이 가시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이들은 G7 중 유일하게 ‘역성장’을 할 것이란 위기감에 독일 정부가 이같은 대규모 재정적자를 감수한 것으로 분석했다.
모두가 부러워했던 독일이 이처럼 휘청거리게 된 이유를 전문가들은 독일 당국의 고집스러운 ‘에너지 정책’에서 찾는다. 독일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발생 후 탈원전 정책을 펼친 대표적인 국가인데, 특히 올 4월 마지막 원전 3기 가동을 중단하면서 사실상 탈원전을 완료했다. 또한 2021년 녹색당과의 연정 합의안에서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80%까지 늘리는 데 동의했다. 지난해 이 비중은 46%에 육박한다. 이에 당시 일각에선 GDP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20%에 달하는 독일이 전력 다소비 산업구조를 외면한 채 신재생에너지 사회로 무리하게 이행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숱하게 나오기도 했다.
실제 제조업 강국인 독일의 전기 수요를 재생에너지로만 감당하기는 어려웠다는 게 주지의 사실이다. 태양광·풍력으로 전기 수요를 온전히 감당하지 못했던 독일은 대체 자원인 천연가스에 의존하는 비중이 높아졌고, 러-우 전쟁 이전에는 러시아에서 싼 천연가스를 수입해 에너지 수요를 충당하고자 했다. 그래서 추진한 게 노드스트림 가스관이다. 이는 과거 16년간 총리직을 맡았던 앙겔라 메르켈이 주도했는데, 이로 인해 당시 러시아 천연가스 의존도는 55%, 석유 의존도는 35%까지 올랐다.
그러다 러-우 전쟁 이후 미국을 비롯한 서방이 원자재 수입에 루블화 대금 지불을 거부하는 등 러시아를 압박하면서, 러시아 또한 유럽을 대상으로 가스관을 잠그는 등 천연가스 공급을 현저히 줄이게 됐고, 이에 따라 가스값이 급등하면서 독일 산업 경쟁력도 급격히 떨어져 오늘날 독일의 역성장 위기까지 이르게 됐다는 설명이다.
‘신재생에너지’ 고집부리는 독일?
이같은 러시아의 에너지 무기화가 촉발한 ‘에너지 가격 대란’으로 인해, 이미 작년부터는 독일 경제에 인플레이션 조짐이 스멀스멀 올라오기 시작했다. 지난해 7월부터 러시아는 독일을 통해 유럽에 천연가스를 공급하는 노드스트림을 봉쇄했는데, 이에 독일 내 전력·천연가스 가격은 불과 두 달 사이에 2배 이상 치솟았다. 실제 당시 유럽 천연가스 가격은 메가와트시(MWh)당 241유로(약 34만원)로 급등하기도 했는데, 이는 역대 최고가로 예년 이맘때보다 11배나 높은 수준에 해당한다.
이에 독일 제조 기업들은 늘어난 에너지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하거나, 이마저도 어려워져 아예 문을 닫는 상황에 몰리기도 했다. 일례로 세계 2위 화학업체이자 글로벌 27개국에 공장을 둔 에보닉 인더스트리는 노드스트림관 봉쇄 당시 독일 내 공장에서 사용하던 천연가스의 약 40%를 액화석유가스(LPG)와 석탄으로 대체하고, 그마저로도 해결하지 못한 비용은 일부 고객에게 전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높은 에너지 요금 추세는 현재까지 이어져 독일의 인플레이션을 촉발했고, 기업 수주와 가계 지출을 크게 감소시키고 있다. 실제 3월 독일의 가정용 전기요금은 1kWh당 40센트(약 578.18원)로, 이는 우리나라의 주택용 저압 기준 1kWh당 120원보다 4.818배 높은 수준이다. 독일 정부가 요금 상한제를 실시하면서 공적 자금을 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를 비롯한 글로벌 국가보다 전기 요금이 높은 모양새다. 그간 러시아산 천연가스에 과도하게 의존해 왔던 탓이다.
그런데도 현재 독일 당국은 탄소중립사회를 위한 노력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 이에 전문가들 사이에선 독일이 화석연료로 후퇴하지 않고 현재의 고통을 감수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독일은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2030년까지 탈석탄 조기 완료, 2035년까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100%로 하는 세부 목표로 삼고 있다. 이와 관련 김진수 한양대 자원공학과 교수는 “현재 독일은 과도기며,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더 높아지면 외부 영향이 덜해지기 때문에 종국적으로는 요금 안정화가 되고 경제도 연착륙하게 될 것”이라며 “또한 독일 국민들도 높은 에너지 요금에도 현 에너지 전환 정책을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우리나라 탈원전 정책도 독일과 비슷한 사례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또한 독일과 상황이 별반 다르지 않다는 분석을 내놓는다. 심지어 우리나라의 경우 독일보다 향후 에너지 전환으로 인한 잠재적 고통은 더 클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독일은 주변국의 전력망과 가까이 위치해 있는 등 에너지 인프라가 상호 연결돼 있고 탈원전에 대한 국민 지지도 높아 정부와 국민의 고통 분담이 가능한 반면, 우리나라는 고립돼 있는 데다 탈원전을 가속화하면 독일보다 에너지 요금 인상 폭이 훨씬 더 큰 만큼, 국민들도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란 설명이다.
러-우 전쟁의 여파로 유가, LNG, 유연탄 등 발전 연료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가운데, 현재 우리 정부는 공공 차원에서 에너지 요금을 억누르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급등한 발전연료비를 전기요금에 반영하지 못한 한전의 재무적 손실은 천문학적으로 누적되고 있다. 또한 문재인 정부까지 이어진 탈원전 정책 움직임은 원전 안전 규제로 이어졌고, 이로 인해 원전 가동률이 낮아져 기존보다 전기 발전량이 하향 곡선을 그리면서 한전의 대규모 적자를 더욱 키웠다.
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5년간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비용이 2017~2030년 동안 총 47조4,000억원이 발생한 것으로 추산된다. 이어 연결 기준 한전의 올 2분기 영업손실은 2조2,724억원으로 2021년 2분기 이후 9개월 분기 연속 적자가 이어지고 있다. 이 기간 누적 적자는 약 47조5,000억원으로 늘어났다.
이는 독일의 천연가스 공급망 확보 차질, 탈원전화 흐름과 비슷한 양상을 띤다. 우리나라가 독일처럼 탈원전 정책을 고수할 경우 높은 에너지 요금 인상으로 이어져 경기 침체에 닥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다. 한전의 적자 해소를 위해 추가적인 에너지 요금 조정이 높게 점쳐지는 가운데, 이런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정부 당국이 급격한 에너지 전환을 추진한다면 기업 생산량 위축과 가계 소비 부진을 겪는 현재 독일의 수순을 그대로 밟게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