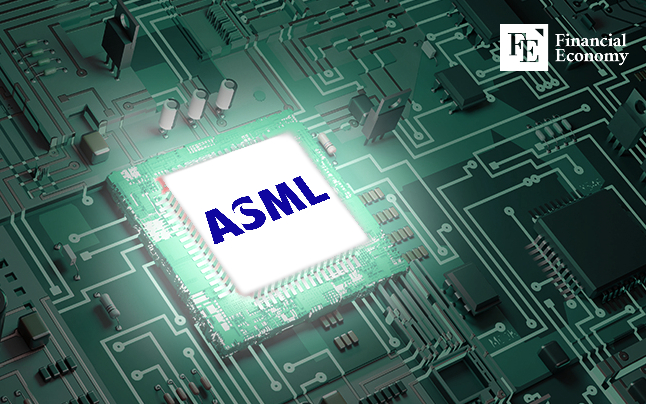GDP 뛰어넘은 가계부채·기업부채, ‘빚’에 깔린 대한민국 경제
불어나는 국내 기업부채, GDP 훌쩍 넘어서며 경제 위기감 고조 주담대 위주로 가계부채 누적, ‘경제 성장 걸림돌 될라’ 우려 제기돼 국가·기업·국민 나란히 빚더미에, 여타 주요국 대비 사태 심각하다?

우리나라 기업부채가 올 6월 말 기준 2,705조8,000억원으로 사상 최대치까지 불어났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로 계산하면 124.1%에 달한다. 부동산 대란이 부른 가계부채 폭증이 국내 경제 ‘뇌관’으로 떠오르는 상황에서 기업부채가 위기감을 더하는 양상이다.
전 세계적 경기 침체 기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우리나라 외 주요국들 역시 부채 및 고금리 부담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가계·기업 부채가 나란히 누적되고 있다는 점이다. 일각에서는 각 분야에서 쌓여가는 부채가 차후 우리나라 경제 성장에 ‘나비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쌓이는 기업부채, IMF마저 “한국 기업 취약하다”
한국은행과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한국의 GDP 대비 기업신용은 124.1%, 가계신용은 101.7%에 달했다. 두 수치를 합한 지표인 민간신용은 역대 최대인 GDP 대비 225.7%까지 뛰었다. 특히 GDP 대비 기업부채 비율은 1998년 외환 위기 당시 최고치(108.6%)를 훌쩍 뛰어넘으며 역시 사상 최대치까지 상승했다.
여타 주요국은 대부분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며 GDP 대비 기업부채가 감소세에 접어들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이와 상반되는 흐름을 보였다. 팬데믹 직전 GDP와 비슷한 규모(101.3%)를 유지하던 기업부채가 팬데믹을 거치며 757조원 폭증한 것이다. 원자재 가격이 폭등하며 위기에 봉착한 국내 기업들이 속속 대출에 의지하면서다.
이어지는 고금리 상황은 빚을 짊어진 기업들의 부담을 가중하고 있다. 금리가 뛰며 회사채의 발행수익률이 급격히 상승하자, 상장 기업들은 회사채 조달을 줄이는 대신 대체 자금 조달 수단을 찾아 나섰다. 하지만 조달 구조 변화와 금리 상승세는 기업의 조달 비용을 끌어올렸고, 부채가 쌓인 기업들은 줄줄이 낭떠러지에 몰렸다. 올 1~8월 기업 파산은 지난해 동기 대비 58.6% 급증했으며, 원금은커녕 이자조차 상환할 수 없는 ‘악성 좀비’ 상태에서 7년 이상 벗어나지 못한 기업은 전체의 3.6%에 육박했다.
지난 5월 국제통화기금(IMF)은 차입 비용 상승에 취약한 국가 중 하나로 우리나라를 지목하기도 했다. IMF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전체 기업부채 중 이자보상배율(ICR)이 1보다 적은 기업의 부채가 차지하는 비중은 자그마치 22.1%에 달했다(지난해 2분기까지 4개 분기 평균). 이자보상배율은 기업이 부채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을 판단하는 지표로, 1보다 작을 경우 기업의 디폴트(채무불이행) 위험이 크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가계부채 ‘시한폭탄’ 타들어 간다
가계부채 역시 여전히 우리나라 ‘경제 뇌관’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2021년 8월부터 약 1년 6개월간 기준금리를 연 0.5%에서 3.5%로 3%P 인상했지만, 팬데믹 기간 벌어진 자영업 대출 폭증과 ‘빚투(빚내서 투자)’ 열풍의 그림자에서 벗어나기에는 역부족이었다는 평이 나온다.
국제금융협회(IIF)의 ‘세계 부채(Global Debt)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02.2%로 조사 대상 34개국(유로 지역은 단일 통계) 중 1위였다. 조사 대상 국가 중 가계부채 규모가 GDP를 넘어선 국가는 한국뿐이다.
설상가상으로 최근 들어서는 가계부채 증가세가 한층 가팔라지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2분기 가계대출을 포함한 우리나라 가계신용은 전 분기 대비 9조5,000억원 증가한 1,862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주담대가 14조1,000억원 급증하며 가계대출 증가세를 견인했다. 디레버리징(부채 축소) 및 가계부채 연착륙을 목표로 단행한 기준금리 인상이 사실상 수포로 돌아간 것이다.
한은은 가계부채 증가의 원인으로 부동산 시장을 지목하고 나섰다. 최근 들어 정부는 특례보금자리론을 출시하고, 주택담보대출인정비율(LTV) 상한 규제를 완화하는 등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촉진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여기에 집값이 ‘내릴 만큼 내렸다’는 실수요자 사이 여론, 피벗(통화정책 방향 전환) 기대감 등이 겹치며 주담대를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급증했다는 분석이다.
일각에서는 급증한 가계부채가 차후 우리나라 경제 성장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은이 1960∼2020년 39개 국가 패널 자료를 바탕으로 가계부채 증가가 GDP 성장률과 경기 침체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 결과, GDP 대비 가계신용(가계부채+카드 대금 등 판매신용) 비율이 3년 누적치를 기준으로 1%포인트 상승할 경우 GDP 성장률은 0.25∼0.28%포인트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시차 4~5년).

‘빚’에 시달리는 세계 경제
미국에서도 기업부채 ‘시한폭탄’으로 인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오는 2024년 만기가 도래하는 미국 기업 부채(금융회사 제외)는 자그마치 9,030억 달러(약 1,228조원)로, 이는 올해 2,040억 달러(약 277조4,400억원)보다 343% 폭증한 수치다. 월가의 투자 분석 회사 울프 리서치의 최고 투자 전략가 크리스 세넥은 “재융자(리파이낸싱)은 내년부터 이자 비용 증가로 인해 S&P500 기업들의 주당 운영자금에 5~7달러의 손실을 안길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미국 경제의 ‘고금리 폭탄’이 내년부터 본격화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일본의 경우 정부부채가 경제 뇌관으로 지목된다. 일본의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버블 붕괴 직전인 1989년 14.4%에서 2021년 263%까지 불어났다. 현재 일본 정부가 발행한 국채의 50% 이상은 일본 중앙은행이 보유 중이다. 물가 상승 압박을 덜기 위해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대신, 국채 매입으로 장기금리를 0% 수준으로 억누르는 금융 완화 정책을 펼쳤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들 국가의 부채 부담이 ‘특정 주체’에 한정돼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경제 주체 전반이 빚의 무게에 짓눌리고 있다는 점이다. 나라부터 국민까지 모두가 빚을 안고 살아가는 가운데, 고금리 상황이 지속되면 경제 자체가 한계에 내몰릴 수 있다는 의미다. 오늘도 우리나라는 빚더미 위에서 아슬아슬한 ‘외줄타기’를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