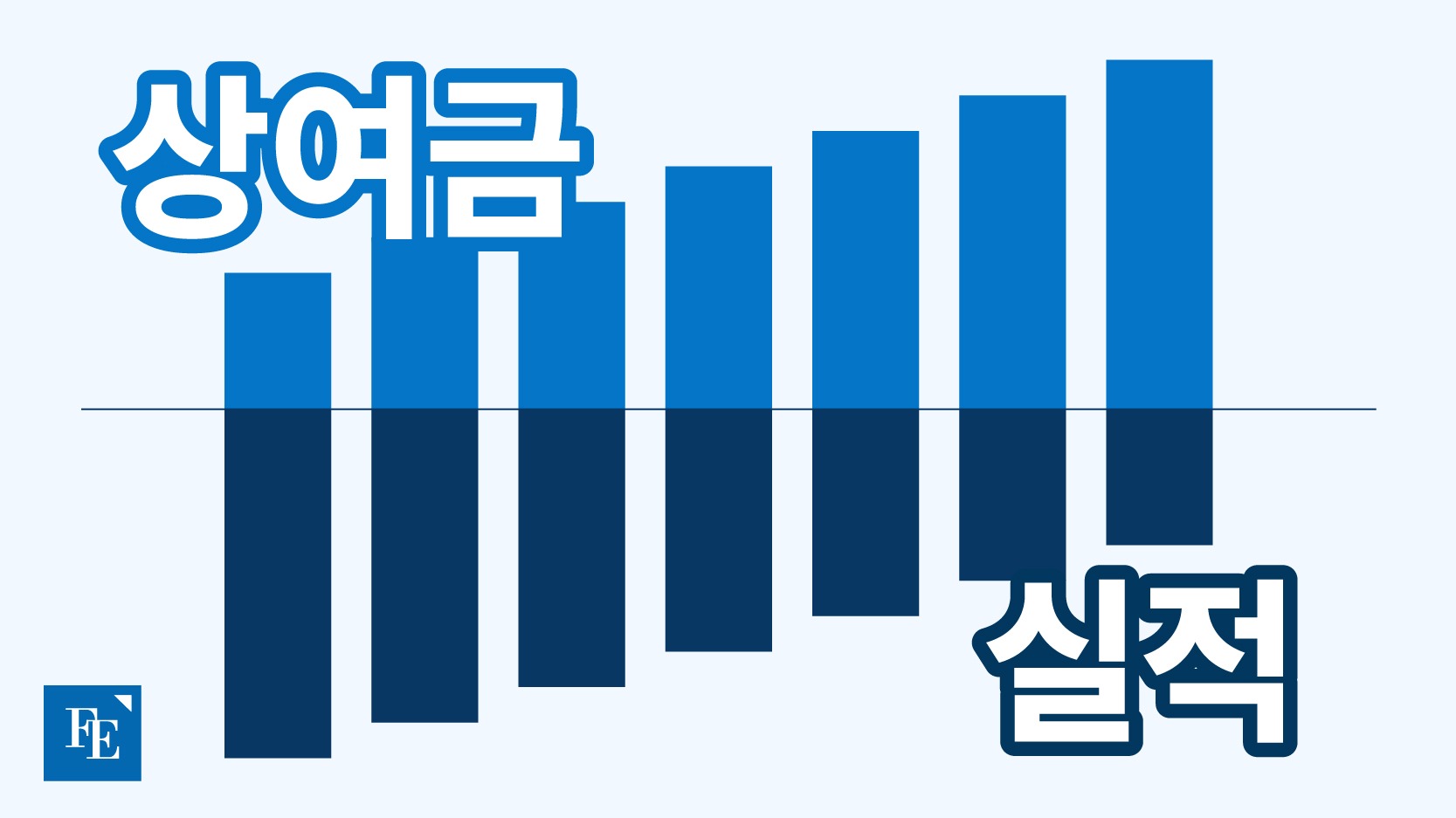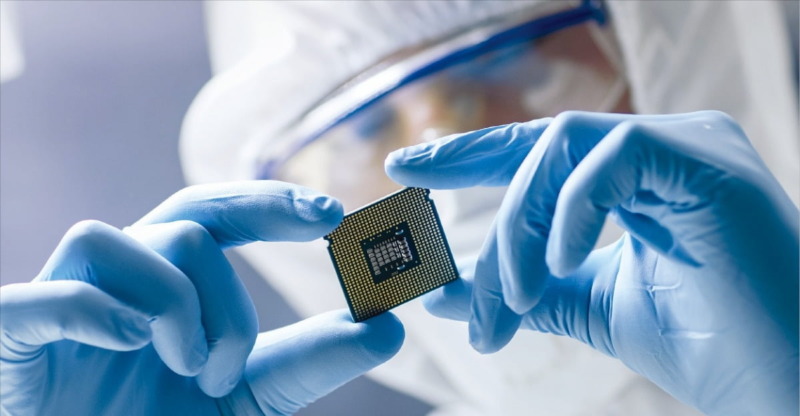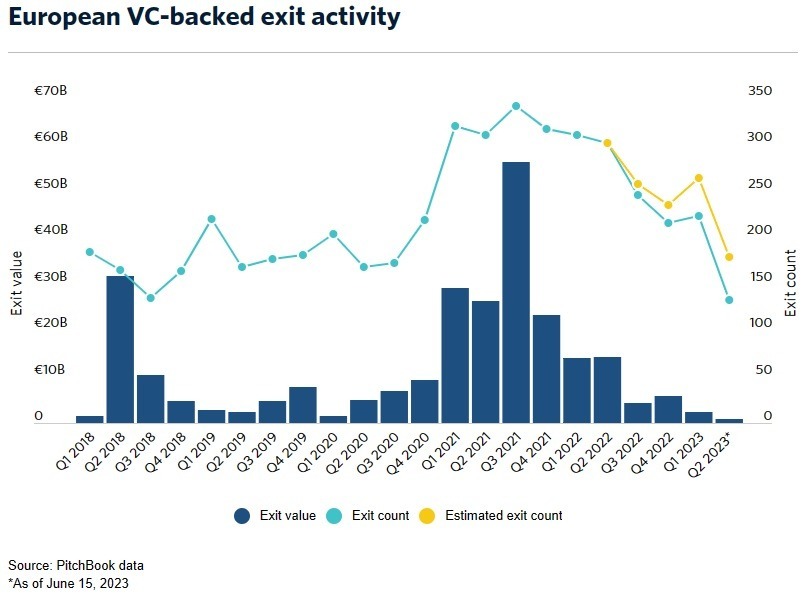초유의 예산 대란에 獨 ‘빨간불’, ‘국가부채 제동 장치’의 양면
'부채 제동 장치'에 비판 논조 확산, "사실상 독일판 브렉시트" 카스트로프 교수 "부채 제동 장치, 재정건전성 유지에 결정적 역할" 반대 의견도 '속속', "투자 지향성 지나치게 부족해"

독일에서 사상 초유의 예산 대란을 초래한 주범 중 하나인 ‘국가부채 제동 장치’의 효용성에 대한 논란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전문가들 사이에서조차 국가부채 제동 장치에 대한 의견이 양분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독일 정부의 고심은 더욱 깊어져만 간다.
논란의 중심에 선 獨 ‘부채 제동 장치’
파이낸셜타임스(FT)는 1일(현지 시각) 독일 학자 3명의 기고글을 인용해 “지난해 11월 독일 연방헌법재판소가 국가부채 제동 장치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독일 정부 예산안에 대해 무효 결정을 내린 이후 독일 내부에서 부채 제동 장치의 존폐 논란이 계속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기고글에서 학자들은 최근 독일에서 이어지고 있는 ‘국가부채 제동 장치(Debt brake)’ 논란에 대해 “이것은 ‘독일판 브렉시트(Brexit·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라며 “이웃 국가들에 막대한 피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내부적으로도 미래 투자를 교살하는 ‘국가적 자해 행위’나 다름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독일의 국가부채 제동 장치란 정부로 하여금 국내총생산(GDP)의 0.35%까지만 신규 부채를 조달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것으로, 정부의 과도한 재정 지출을 막기 위해 2009년 헌법에 규정됐다. 다만 자연재해 등 특별한 위기 상황에서는 연방의회에서 적용 제외를 결의할 수 있다. 올라프 숄츠 총리가 이끄는 연립정부가 집권한 2021년에는 코로나19 위기 여파를 감안해 국가부채 제동 장치 적용을 제외하는 결의가 있었다. 이후 솔츠 정부는 기후변화 신규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을 메우기 위해 코로나19 위기 대응에 쓰이지 않고 남은 600억 유로(약 86조원)를 기후변환기금(KTF)으로 전용하는 내용을 담아 올해와 내년 예산안을 편성했다. 하지만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해당 특별예산안을 국가부채 제동 장치를 우회한 편법 조치로 보고 무효화했다.
이것이 논란으로 이어진 건 연방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 여파로 예산 대란이 일어나면서 제동 장치의 효용성에 의구심이 커졌기 때문이다. FT는 “독일 좌파 정치인들은 각종 사회보장성 정책의 재원 확보를 위해 이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고 전했다. 녹색당 소속인 로베르트 하벡 경제부 장관은 지난 11월 녹색당 전당대회에서 “기후변화 대응에 관심이 없었고 중국이 세계의 값싼 공장이었던 과거 시절에 도입된 부채 제동 장치는 시대착오적인 조항”이라며 “현재 해당 장치로 인해 우리는 양손을 뒤로 묶은 채 링에 오른 권투 선수와 같다”고 비판했다. 독일 Ifo연구소의 공공 재정·정치 경제 센터장 니클라스 포트라프케도 “제동 장치의 존폐 이슈는 독일의 진영을 정확히 두 개로 나눈다”며 “어떤 이들은 이를 안정의 닻으로 보는 반면 다른 이들은 투자를 가로막는 요소로 간주한다”고 설명했다. 독일 여론조사기관 포어슝스그루페 바렌(Forschungsgruppe Wahlen)이 최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독일인의 61%는 부채 규정을 현행대로 유지하기를 원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제동 장치 완화를 주장한 독일 국민은 35%에 불과했다.

전문가들 사이서도 의견 ‘양분’
경제학자 등 전문가들 사이에서 이에 대한 의견이 더 양분화되고 있는 만큼 독일의 고심은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 최근 경제학자들을 대상으로 한 Ifo와 독일 일간지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이네 차이퉁(FAZ)의 공동 설문조사에서는 48%가 현행 유지를 원하고, 44%는 개선을 지지했다. 해당 제도가 완전히 폐지되기를 원한 응답률(약 6%)까지 고려하면 부채 제동 장치에 관한 전문가 여론은 48(찬성) 대 50(반대)으로 갈리고 있는 셈이다.
이는 독일이 국가부채 제동 장치의 실질적 효과를 본 바 있기 때문이다. 실제 독일은 한때 82.3%에 달했던 채무 비율을 60%까지 낮추며 선진국 중 거의 유일하게 부채 줄이기에 성공한 나라가 됐다. 반면 그리스·이탈리아·스페인·일본 등 국가들은 한때 재정 상태가 양호했지만 한번 늘기 시작한 국가 채무를 감당하지 못해 결국 빚더미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부채 제동 장치의 유무에 따라 발생한 명암의 편차가 매우 큰 상황인 셈이다. 이와 관련해 독일 재무부 관료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정책연구국장 등을 역임했던 크리스티안 카스트로프 자유베를린대 명예교수는 “2009년 독일 헌법에 도입된 국가부채 제동 장치는 지금까지 독일이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바이든 정부의 경제정책 ‘바이드노믹스’를 설계한 브라이언 디즈 전 대통령 수석 경제보좌관은 독일 디차이트 기고문에서 “국가부채 제동 장치는 독일의 손발을 묶는 구속복”이라며 독일의 제도를 강력히 비판했다. 그러면서 “독일의 문제는 국가 부채 제동장치 그 자체”라며 “임의로 정해진 연간 부채 상한은 기업이 생산성을 높이는 투자 결정을 하기 전 필요로 하는 장기적인 계획 안정성에 걸림돌이 된다”고 역설했다. 경기 상황에 따른다는 부채 제동 장치 관련 규정 때문에 독일은 위기 후 성장 잠재력을 완전히 발휘할 수 없고, 절약에 초점을 두기 때문에 공공투자를 제때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게 주된 주장이다.
정부 지출이 어디에 어떤 형태로 이뤄질지 고려하지 않은 채 상한선을 일률 적용했다는 점에 대해서도 비판이 일었다. 아힘 트루거 뒤스부르크대 경제학과 교수는 “국가부채 제동 장치의 설계 오류 중 하나는 투자 지향성이 부족하다는 것”이라며 “미래에 이득이 생기는 투자의 경우 빚을 내 차세대와 공동으로 감당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