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부진 ‘반도체 지원금’ 지급에 시동 건 바이든, 대선이 불러온 훈풍
1년 반 멈춰섰던 반도체 지원법 움직인다, 보조금 지급 소식 전해져 '대선 표심' 잡으려면 인텔·TSMC부터? 삼성전자 지급은 언제쯤 반도체지원법의 '족쇄' 감내한 삼성전자, 이득 취할 수 있을까

오는 11월 미국 대선 재선을 앞둔 조 바이든 행정부가 ‘반도체 보조금’ 보따리를 풀었다. 한동안 소식이 끊겼던 ‘반도체 지원 및 과학법(CHIPS Act, 이하 반도체지원법)’의 주요 지원 대상 발표 소식이 전해진 것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7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행정부가 그동안 미뤄온 반도체지원법 관련 보조금을 몇 주 내로 지급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미국 인텔과 대만 TSMC가 보조금 우선 지급 대상으로 지목된 가운데, 한국 시장은 미국에 설비 투자를 단행한 삼성전자의 지급 상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반도체지원법, 기나긴 정체 끝났나
미국의 반도체지원법은 2022년 8월부터 본격 시행됐다. 하지만 1년 6개월이 지난 현재, 미국의 반도체 보조금을 실제 지급받은 기업은 단 두 곳에 그친다. 보조금 지급이 차일피일 미뤄지는 가운데, 반도체 업계는 미국 내 투자의 불확실성을 감수하며 법안 이행을 기다려왔다. 대만 TSMC는 미국 반도체 보조금 일정이 불확실하다는 이유로 애리조나주 내 2개의 반도체 공장 개장을 줄줄이 연기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 WSJ 보도로 지지부진하던 법안 이행에 ‘청신호’가 켜졌다. 올해 11월 미국 대선을 의식한 바이든 대통령이 정책 성과를 위해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 반도체 지원금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바이든 대통령의 의회 국정 연설(3월 7일 예정) 이전에 공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보조금 최우선 지급 대상으로는 미국 인텔과 대만 TSMC가 지목된다. 삼성전자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텍사스 인스트루먼츠, 글로벌 파운드리 등도 유력한 지급 대상으로 거론된다.
단 보조금 지급 대상에 이름을 올린다고 해도 바로 현금을 지급받을 수는 없다. 이번 발표는 어디까지나 예비 성격이며, 이후 실사를 거쳐 최종 지급 계약이 체결될 예정이다. 보조금은 반도체 공장 프로젝트의 진행 단계에 따라 순차적으로 지급된다. 지원 규모는 반도체지원법에 따라 설비 투자액의 5~15%(최대 30억 달러)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인텔·TSMC 우선 지급, 삼성전자는 아직 ‘위태’
이번 보조금 지급은 ‘바이드노믹스(바이든 대통령의 경제 정책)’의 성과를 입증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오는 11월 재선에 도전하는 바이든 대통령이 반도체를 활용한 표심 모으기에 나섰다는 의미다. 보조금 우선 수혜 기업으로 인텔과 TSMC가 꼽힌 이유이기도 하다. 인텔과 TSMC가 반도체 공장을 짓는 애리조나, 오하이오 등은 미국의 전통적인 ‘스윙 스테이트(경합주)’로 꼽힌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보다 지지율이 낮은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는 최우선으로 공략해야 하는 지역인 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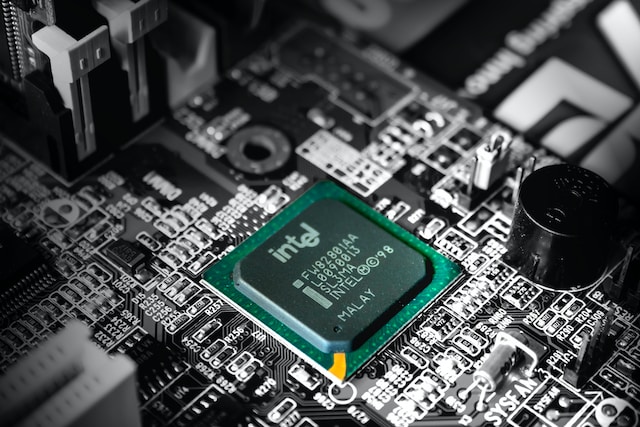
특히 인텔은 미국을 대표하는 반도체 기업으로, 미국 △애리조나주 △오하이오주 △뉴멕시코주 △오리건주 등에서 435억 달러(약 58조원) 이상을 투입해 반도체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업계에서는 사실상 인텔이 바이든 정부의 보조금 최우선 지급 대상이라는 평가가 흘러나온다. 또 다른 유력 수혜 대상인 대만 TSMC는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수탁생산) 업체로, 총 400억 달러를 투자해 애리조나주 피닉스시 인근에 반도체 공장 두 곳을 건설 중이다.
한편 우리나라의 반도체 대표 주자인 삼성전자는 텍사스주 테일러에 170억원을 투자해 파운드리 공장을 짓고 있다. 보조금 지급이 확정될 경우 최대 25억5,000만 달러(투자액의 15%, 약 3조원)까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단 인텔·TSMC의 영향력으로 인해 삼성전자의 보조금 지급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변수다. 실질적인 보조금 지급 이전에 바이든 대통령이 대선에서 패배할 경우, 삼성전자의 보조금 자체가 ‘증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미워도 미국에서” 삼성전자의 고육지책
삼성전자가 ‘후순위’로 밀려나면서까지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단행한 이유는 뭘까. 현시점 한국의 반도체 지원책은 세액공제, 인프라 지원 등에 국한돼 있다. 기업이 선호하는 반도체 설비 투자에 대한 현금 지원 제도가 사실상 전무하다는 의미다. 그나마의 지원책으로 꼽히는 임시투자세액공제도 올해 말이면 수명을 다한다. 반도체 기업 입장에서는 미국을 비롯한 각국의 설비 투자 혜택을 두고 굳이 국내 시장을 선택할 이유가 없는 셈이다. 삼성전자 역시 보조금 등 혜택을 고려해 미국 시장에 진입했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미국의 지원이 곧장 ‘탄탄대로’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현재 미국은 보조금 수혜 기업에 생산 설비 정보, 재무 정보 등 기밀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1억5,000만 달러(약 2,000억원) 이상의 반도체 지원금을 받는 기업은 초과 이익 환수 부담까지 짊어져야 한다. 예상을 초과하는 이익이 발생했을 경우 미국 정부에 보조금의 최대 75%에 달하는 이익금을 반납하는 식이다. 하지만 이 같은 수많은 제약에도 불구, 삼성전자는 미국 내 대규모 설비 투자를 단행했다.
업계에서는 국내 반도체 기업의 미국 투자는 ‘필수’라는 평이 나온다. 미국이 보유한 반도체 기술·장비, 미국의 시장 입지 등을 고려하면 사실상 선택지가 없다는 푸념이다. 높은 미국 시장 의존도와 보조금 인센티브가 삼성전자를 붙잡는 ‘족쇄’로 작용한 것이다. 미국 대선이 다가오며 반도체 시장의 긴장감이 가중되는 가운데, 기꺼이 제 살을 내어준 삼성전자는 미국 반도체 시장에서 ‘뼈’를 취할 수 있을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