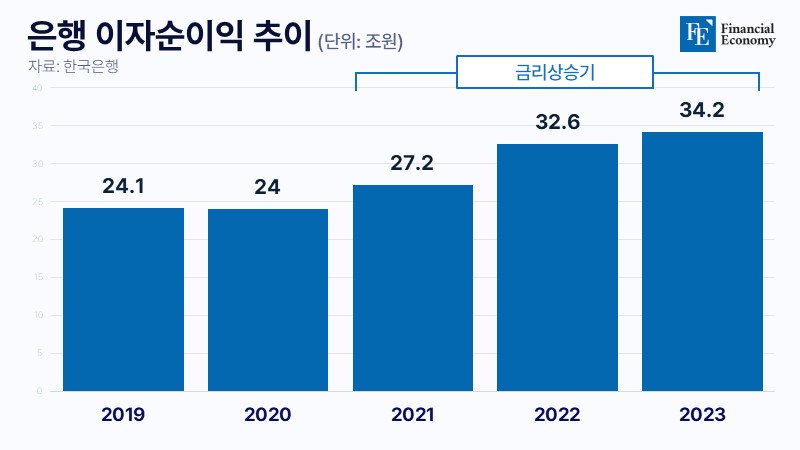동굴 속 ‘횃불’ 잃은 건설업계, PF 위기 속 지속 가능성마저 ‘안갯속’
원자재값 상승에 돈줄 마른 시행사, 무너지는 건설업계 "건물 지으면 오히려 손해, 건설사가 건설 않는 초유의 사태" 부동산PF 악재 '겹겹이', "내부서도 '양극화' 극심"

시행사와 건설사 간 공사비 분쟁이 부쩍 늘어난 가운데, 공사가 끝난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건설사가 과도한 추가 비용을 요구하는 사례까지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공사비를 더 주지 않는다면 신탁사가 가지고 있는 분양대금을 찾아가는 데 동의할 수 없다며 으름장을 놓는 식이다. 돈줄이 마르게 된 시행사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공사비를 더 집어줘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된 셈이다. 더군다나 시장 아래선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가 자본을 잠식하는 모양새를 보이면서 시장 전반의 분위기가 가라앉았다. 각종 위기가 도사리는 현실 속 ‘전화위복’을 꿈꾸는 일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게 업계의 주된 반응이다.
공사비 분쟁에 말라가는 건설업계
5일 법조계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소형 시행사 T사와 코스닥 상장사인 중견 건설사 L사는 2022년 입주를 완료한 서울 마포구의 오피스텔 분양대금 분배를 두고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 프로젝트가 시작된 2019년 T사는 L사에 110억원에 건설 공사를 맡겼다. 역세권에 있는 소형 평수 오피스텔에 대한 분양 수요가 몰리며 150여 세대가 즉시 완판됐다. 2021년 말 건물이 준공된 뒤 이듬해 입주도 별 탈 없이 끝났다. 그러나 L사는 입주가 완료된 후 갑작스레 자재비 인상 등의 이유를 들어 ‘공사비 80억원을 더 달라’고 요구했다. 많은 사업장에서 물가 상승 여파로 공사비 재협상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해당 사례가 시사하는 바는 건설업계의 ‘붕괴’다. 시행사 입장에서도 건설사 입장에서도 한 발조차 물러설 곳 없는 아찔한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단 것이다. 건설업계 사이에서 ‘고난의 행군’이 시작된 건 이미 오래전이다. 지난 2022년에도 부동산 시행업계는 시공사 선정에 난항을 겪으며 파편화되는 업계를 바라봐야만 했다. 근본적인 원인은 자금난이다. 물가 상승과 자잿값 상승에 따른 공사비 증가 등이 도미노처럼 이어지면서 건설업계의 불황이 커졌다.
시행업계에 따르면 2020년 평당 380만원(1군 시공 기준) 선이었던 공동주택 공사비는 2022년 평당 500만원까지 치솟았다. 건설자재인 레미콘 단가는 ㎥당 7만1,000원에서 8만3,000원으로 13.1% 인상했으며, 철근값은 t당 70만원에서 110만원대까지 올랐다. 이에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3.3㎡당 건축공사비가 전년 동기 대비 평균 10~15% 상승했다”며 “값이 오른 만큼 리스크도 올랐다. 일을 해도 손해고 안 해도 손해인 아이러니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PF 위기 아래 ‘도미노 붕괴’ 현실 되나
상황이 이렇다 보니 건설업계 내에선 양극화가 심화하기 시작했다. 소위 ‘돈이 되는’ 수도권 내 알짜 정비사업 시공권을 따내기 위한 수주 전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힘든 중소 업체들은 사실상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기 때문이다. 결국 최근엔 건설사들이 수익성이 예상되는 공사 수주에만 몰리고 수익성이 낮은 곳은 사업 포기도 불사하는 등 정비사업 내에서도 양극화가 심화하기 시작했다.
한편으로는 과거 건설사와 조합이 낮은 금액에 체결한 시공 계약에 대한 갈등이 격화되기도 했다. 실제 경기도 성남시 산성구역 주택재개발 조합은 시공사업단(대우건설·GS건설·SK에코플랜트)과 공사비 문제로 갈등을 빚다 시공사 교체를 추진한 바도 있다. 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예전 같으면 웬만한 갈등으로 시공권을 포기한다는 것은 상상도 못 할 일이었지만, 1~2년 새 공사비가 30%나 뛰니 적자를 보면서까지 공사를 지속하긴 어려운 상황이 됐다”며 “분양가와 공사비 인상이 힘든 지방 등에서 건설사들이 시공사에서 이탈하려는 조짐이 보인다”고 전했다. 자금 앞에 업계의 체계가 무너져 가는 모양새다.
시장 침식이 급속도로 일어난 원인 중 하나는 부동산 PF다. 국내 PF 시장의 자금경색, 글로벌 금리 인상, 원자잿값 급등 등 다양한 악재가 겹치면서 건설사들은 선별 수주, 더 나아가 수주 자체를 하지 않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지으면 지을수록 손해를 보는 구조가 되다 보니 매출에서 유동성 확보로 경영 방향성을 튼 것이다. 부동산 PF업계 관계자는 “과거 신용 위기를 경험한 이후 대다수 건설사들이 책임준공 방식으로 바뀌었는데, 공사비만 책임을 지면 되는 상황에서 철근값, 시멘트 값 등이 천정부지로 오르다 보니 공사비를 두고 조합과의 협상은 평행선을 달릴 수밖에 없게 됐다”며 “지금 PF 시장에선 시공사들이 갑(甲)의 위치가 됐고, 정작 상위 건설사들은 우크라이나 재건 같은 해외 수주에 더 공을 들이려는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한국 경제의 아킬레스건은 단순하면서도 복잡하게 얽혀 있다. 시장 불안감이 확산하는 가운데 정부조차 이렇다 할 출구전략을 짜내지 못하면서 사실상 시한부 단계에 접어든 것 아니냐는 극단적인 주장까지 나오는 추세다. 젖줄 잃은 업계의 발버둥이 유독 서글퍼 보이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