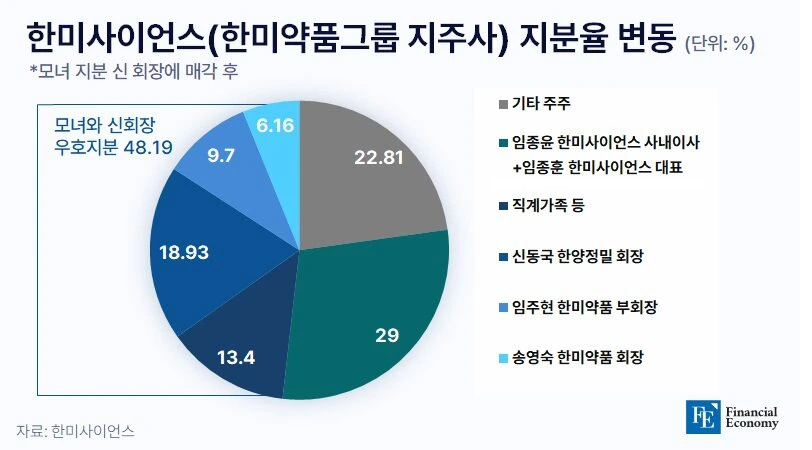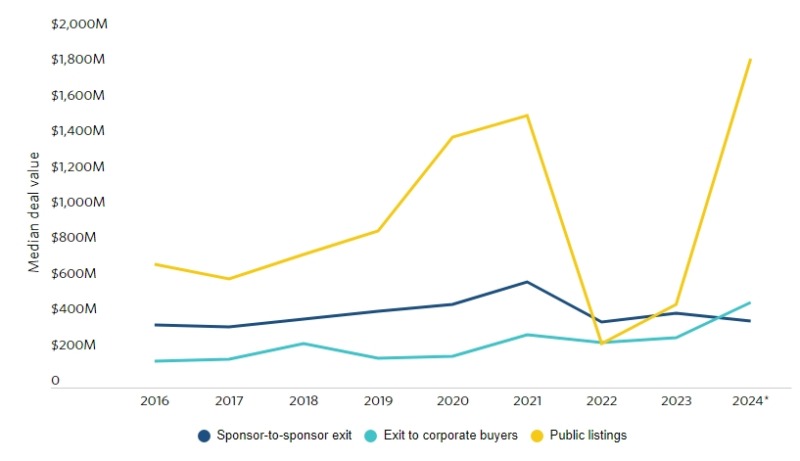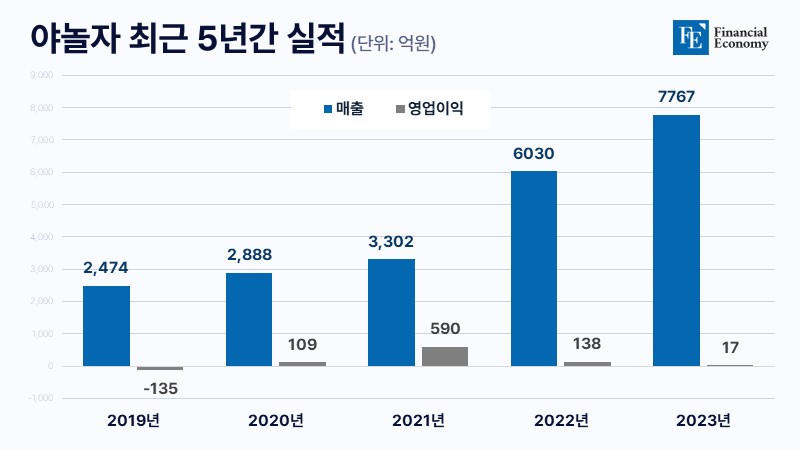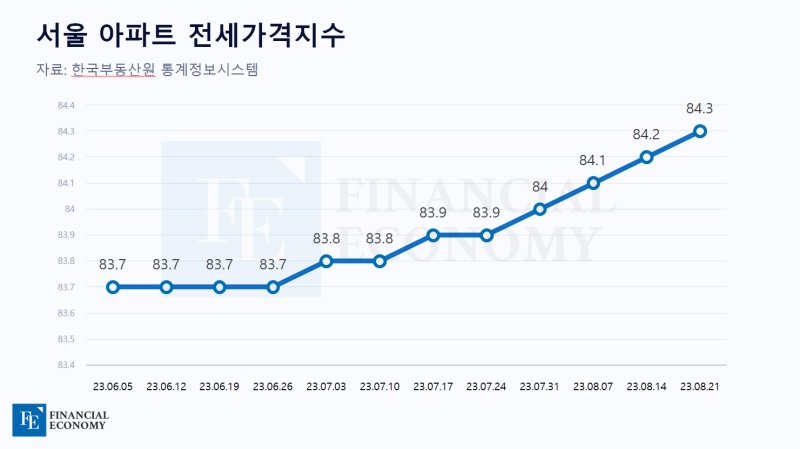‘뻥튀기 상장’ 후폭풍, 높아진 문턱에 IPO 예비심사 철회 러시
올해 1~7월 상장 심사 철회 건수 22건, 미승인도 6건
'파두 사태 논란' 이후 보수적으로 변한 심사 기준 영향
거래소, 신청 제한 기간 늘리고 자의적 판단 지양 방안 검토

증시 입성을 목표로 기업공개(IPO)에 나섰던 기업들의 심사 철회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뻥튀기 상장 논란 이후 한국거래소의 상장 심사가 대폭 강화되면서 문턱이 높아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이에 기업 자체적으로도 허들이 높아진 만큼 미승인까지 가기 전에 자진 심사 철회 방식으로 후일을 도모하는 모습이다. 이런 가운데 증권사들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금융당국이 주관사의 실사 업무 책임을 강화하면서 IPO 주관 업무 기준이 한층 더 까다로워졌기 때문이다.
상장 추진 기업 ‘심사 철회’ 증가세
6일 한국거래소 기업공시채널 카인드(KIND)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7개월간 기업 22곳이 한국거래소로 상장예비심사 청구 후 심사 진행 과정에서 철회를 택한 것으로 파악왰다. 지난해 같은 기간 13개 기업이 상장예비심사 중 철회를 택했던 것과 비교해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코스닥 시장 신규상장 추진 기업의 상장 심사 철회가 17건, 기업인수목적회사(SPAC·스팩) 합병 상장 기업의 심사 철회가 5건으로 집계됐다. 여기에 한국거래소의 심사 미승인 6곳까지 포함하면 총 28곳 기업이 IPO 첫 관문으로 꼽히는 상장예비심사 문턱을 넘지 못한 셈이다.
업계는 올해 심사 철회 기업 수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거래소가 지난 6월 27일 ‘상장 예비 심사 지연 해소를 위한 방안’을 내놨기 때문이다. 심사 적체를 해소하려는 방안이지만, 상장 적격성에 대한 판단을 더 빠르게 내릴 가능성이 커졌다는 것이 중론이다. 실제로 과거 거래소는 상장 심사 과정에서 적격성 문제가 발견되면 곧바로 미승인 결론을 내기보다는 해당 기업이 해소할 수 있도록 시간을 줬으나, 최근 이같은 기조가 반전됐다.
시장 관계자들에 따르면 IPO 추진 기업들의 상장예비심사 청구 후 자진 철회까지 걸리는 시간이 눈에 띄게 축소됐다. 특히 지난달 들어 심사 철회를 택한 3곳 기업 모두 상장예비심사 청구 이후 철회까지 4개월이 채 걸리지 않았다. 이차전지 소재 기업 이피캠텍의 경우 2개월 만에 철회를 택했다. 업계는 이런 추세라면 올해 심사 철회 기업 수가 작년 기록인 연간 28곳은 물론 2021년 36곳도 상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반년간 이어진 공모주 과열 양상도 상장 기업들의 주가 하락과 냉각되는 모양새가 됐기 때문이다. 여기에 수요예측 후 공모가 상단 초과 행진도 최근 멈춰 선 상태다.

‘파두 사태’ 이후 심사 기조 변화, 초유의 ‘상장 무효’도
기업들의 잇따른 상장 심사 철회 배경에는 지난해 ‘파두(FADU) 사태’ 이후 한국거래소의 심사 강화가 자리하고 있다. 지난해 8월 코스닥에 상장된 반도체 팹리스 업체 파두는 상장 전 증권신고서에서 연간 매출액 추정치를 1,202억원으로 발표했으나 정작 상장 직후 어닝쇼크를 내며 부실 상장 논란을 일으켰다. 금감원에 따르면 파두의 실제 매출액은 2분기 5,900만원, 3분기 3억2,000만원으로 크게 미달됐다. 특히 2분기 분기보고서에는 공시 의무가 없던 터라 이 사실은 상장 후 4개월이 지난 시점인 11월 분기보고서가 나온 뒤에야 알려졌다. 공시된 파두의 연간 매출액 역시 224억7,000만원으로 애초 내세웠던 잠정치보다 6분의 1 수준으로 크게 벗어났다.
사태는 파두가 이와 관련한 내용을 IR(기업설명) 자료를 통해서도, 공모주 투자자들에게도 제대로 안내하지 않으면서 더욱 악화했다. 결국 파두의 뻥튀기 상장은 고스란히 개인 투자자들의 피해로 이어졌다. 시장은 실망감을 넘어 ‘사기 상장’이라는 반응을 보였고 실적 쇼크에 주가도 곤두박질쳤다. 파두 주가는 실적 공시 이튿날인 지난해 11월 9일 곧장 하한가로 직행한 데 이어 10일에도 21.93% 하락했다. 공모가 3만1,500원에 상장 후 4만5,000원까지 치솟았던 주가가 1만원대로 고꾸라진 것이다. 이에 상장 당시 1조5,000억원에 달했던 시가총액도 1조원 가까이 붕괴되며 8,000억원 수준으로 쪼그라 들었다.
최근 클라우드 서비스 개발업체 이노그리드의 IPO가 무산된 것도 파두 사태와 같은 맥락이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회는 지난 6월 18일 밤 제10차 시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노그리드의 코스닥시장 상장예비심사 승인 결과 효력 불인정을 결정했다. 취소 사유는 ‘심사신청서의 거짓 기재 또는 중요사항 누락’이다. 이노그리드가 최대주주의 법적 분쟁 가능성을 인지하고도 신청서에 기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앞서 이노그리드는 올해 3월 상장할 예정이었으나 단순 오타, 주요 재무제표, 법적 분쟁 발생 가능성 등 크고 작은 이유로 증권신고서를 무려 7차례나 정정했다. 문제가 된 최대주주 법적 분쟁 부분은 6차 정정 신고서에 기재됐다. 하지만 과거 최대 주주였던 법인과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간 이노그리드 주식 양수도 및 금융회사의 압류 결정 관련 분쟁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이 발목을 잡았다. 사측은 해당 분쟁이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해 기재하지 않았다는 입장이지만 거래소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결정에 따라 이노그리드는 향후 1년 이내 상장예비심사를 신청할 수 없다.

거래소·금감원, 재발 방지 마련 속도
거래소가 이미 예비심사를 통과한 기업에 심사효력을 불인정한 건 1996년 코스닥 시장이 문을 연 이래 처음 있는 일이다. 통상 상장을 추진하는 기업들은 당국과 물밑 조율을 거쳐 상장 취소 처분을 받기 전에 상장을 자진 철회하고, 문제되는 부분을 해소한 뒤 재도전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파두 사태를 계기로 기조가 강화된 것이다.
최근 상장한 발행사 측 관계자에 따르면 거래소는 영업이익은 물론 매출을 뒷받침할 계약 증빙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하는가 하면, 거래소 내부적으로도 발행사에서 제시하는 ‘추정 실적’을 신뢰하지 않는 분위기가 짙어지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상장 작업에 착수한 발행사로 하여금 특정 주주에게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는 계약 내용의 시정을 요구했다는 전언도 나온다. 기존 주주 입장에선 엑시트(투자금 회수)를 위해선 수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란 지적이다.
지난 5월 금융감독원 IPO 주관업무 제도개선 간담회를 열고 부실상장 방지 대책을 마련한 것도 파두 사태의 후속 조치 일환이다. 아울러 부실 검증 논란으로 도마에 올랐던 한국거래소도 재발 방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상장예비심사 신청제한 기간을 1년에서 3~5년으로 늘리고, 신청서 서식을 개정해 필수기재 사항에 대한 자의적 판단을 지양하는 내용 등이 골자다.
상장심사 통과가 어려워지자 주관을 맡고 있는 증권사들도 IPO 일정 연기 여부에 촉각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이는 주관 경쟁을 해야 하는 증권사들 입장에선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IPO 건별 완주 성과가 증권사들의 주식자본시장(ECM) 주관 순위를 가르기 때문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1분기 기준 ECM 전체 주관 1위와 2위는 NH투자증권과 KB증권으로 1,000억원가량 격차가 벌어진 상태다. 발행 규모 측면에서 이미 3,000억원을 넘긴 3~5위 증권사(한국투자증권·미래에셋증권·대신증권)들을 제외한 6위~10위 증권사(하나증권·신한투자증권·삼성증권·SK증권·DB금융투자)들은 발행 규모 격차가 그리 크지 않다.
특히 발행 규모가 조 단위인 유상증자가 또다시 진행되지 않는 한, IPO 부문에서 호실적을 거둘 경우 ECM 전체 순위에 무리 없이 안착할 수 있다. IPO 주관도 5건의 IPO를 완료한 NH투자증권을 제외하면 모든 증권사들이 1~2건의 IPO 딜만을 완주한 상태다. 딜 한 건을 더 완주하는 것이 중요한 상황인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