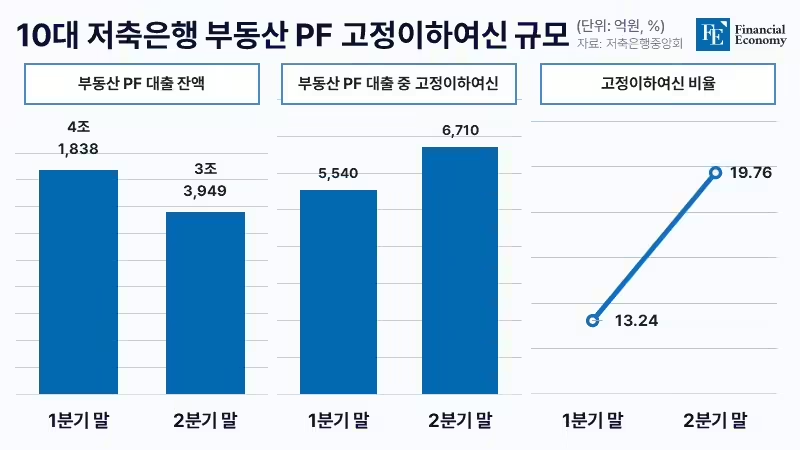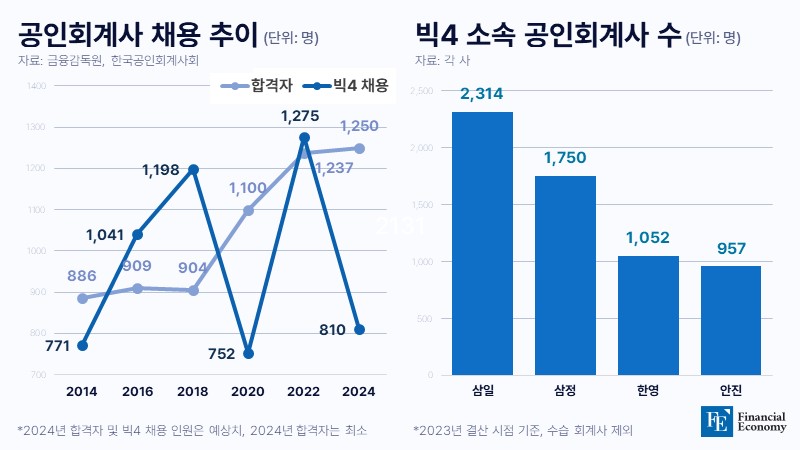[미·중갈등] 유럽 축구 시장마저 지배하고 있는 미국 자본, 문제는 ‘미국만’ 유동성이 넘쳐나고 있다는 것
넘쳐나는 유동성 뒤에 업은 美 사모펀드들, 이제는 유럽 축구 시장까지 넘봐 美 매파적 금리 인상 기조, 글로벌 유동성 메마르게 만들어 일각에선 미국 자본이 글로벌 산업 전반 잠식할 것이란 우려도
최근 미국 자본이 유럽 축구 시장에 대거 침투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 미국 PE 업계는 이전부터 스포츠 분야에 대한 투자의 관심을 보여왔다. 이에 일각에선 미국이 유럽 스포츠 시장을 잠식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자국 중심’ 경제 정책들로 인해 글로벌 유동성이 미국으로 극단적으로 쏠리는 데다, 그 외 국가들의 유동성은 메말라 가고 있는 만큼, 스포츠를 비롯한 미국 자본의 유럽 시장 잠식 현상은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번 제롬 파월 미 연준(Fed) 의장의 양적 긴축 기조는 기존 통화 정책과는 달리 다른 국가들의 사정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게 위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대목이다. 예컨대 2015년 당시 미 연준 의장이었던 재닛 옐런은 경기 침체에 격동했던 중국을 위해 당시 양적 긴축 기조를 한 템포 쉬어갔던 바 있으나, 이번 제롬 파월의 양적 기조는 현재 심히 우려되고 있는 중국의 경기 침체 가능성을 사실상 배제하고 단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발 대규모 ‘뭉칫돈’이 투입된 유럽 축구 시장
3일 시장조사업체 피치북(PitchBook)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소위 유럽 ‘빅 파이브(영국, 스페인,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 리그’의 총 98개 축구팀 중 34개가 미국발(發) 민간 자본 투자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중에서도 미국 사모펀드가 21개의 축구팀에 투자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글로벌 금융 업계의 눈길을 끌었다.
대표적으로 지난해 5월 미국 PEF(사모펀드) 컨소시엄이 LBO(Leverage Buy-Out, 차입매수)를 통해 영국 EPL 소속 첼시를 32억 달러(약 4조2,000억원) 규모로 인수한 사건을 들 수 있다. LBO란 인수기업이 피인수기업의 자산을 담보로 인수 자금을 차입해 조달하는 기업 인수 방식을 의미한다.
니콜라스 모우라 피치북 애널리스트는 “최근 들어 스포츠 산업에 매력을 느낀 미국 사모 펀드들이 유럽 축구 시장에 대거 진입하고 추세”라며 “이탈리아 세리에 A리그의 제노아를 인수한 777 파트너스가 대표적인 예”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미국 이외 국가까지 포함하면 전체 빅 파이프 클럽 중 35.7%가 일정 수준 이상의 민간 자본 투자를 받고 있다”고 분석했다.
업계에선 투자 자금을 빠르고 안정적으로 회수하길 추구하는 사모펀드가 이처럼 스포츠 산업에 큰 관심을 보이는 것은 이례적이란 평이다. 일반적으로 축구 구단의 수익은 방송 중계권에 크게 의존하는데, 성적에 따라 시청률이 급증·급감하는 등 수익 변동성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이전부터 스포츠 관심 보였던 미국 PE 업계
그런데 미국 사모펀드들의 이같은 행보는 사실 이미 몇 년 전부터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 잡았던 것으로 분석된다. 실례로 미국 글로벌 사모펀드 실버 레이크(Silver Lake)는 지난 2019년 11월 영국 축구팀 맨체스터 시티(맨시티)를 소유한 지주회사인 시티 풋볼 그룹(CFG)의 지분 10%를 매수한 바 있다. 당시 매각 대금은 5억 달러(약 6,520억원)로, 해당 거래를 통해 당시 맨시티는 ‘세계에서 가장 비싼 축구 클럽’이라는 별명을 얻게 됐다.
또한 지난 2020년 10월엔 미국 기업인수목적회사(SPAC)인 레드볼이 미국 펜웨이스포츠그룹을 인수한 사례도 있다. 펜웨이스포츠그룹은 영국 축구팀 리버풀과 미국 야구팀 보스턴 레드삭스를 운영하는 지주회사로, 거래 당시 80억 달러의 기업가치평가를 받고 레드불에게 25% 지분을 매각했다. 아울러 124년 전통의 이탈리아 축구팀 AC밀란은 지난해 9월 미국 사모펀드인 레드버드 캐피털 파트너스에 당시 12억 유로(약 1조7,195억원)에 인수된 바 있다.
유럽 축구를 집어삼키겠다는 야욕이 투영된 ‘유러피언 슈퍼리그’
한때 미국 자본 투입으로 유럽 축구 전반을 아예 ‘집어삼키려’는 시도로는 2021년 4월 유럽 12개 ‘빅클럽’이 출범을 공식 발표한 유러피언 슈퍼리그(ESL)를 들 수 있다. 당시 이탈리아의 세리에A에서 유벤투스, 인터밀란, AC밀란 등 3팀, 스페인의 프리메라리가에서 FC바르셀로나, 레알마드리드, AT마드리드 등 3팀, 영국 프리미어리그에서 맨체스터유나이티드, 맨체스터시티, 리버풀, 첼시, 토트넘, 아스날 등 6개 팀이 ELS에 참여 의사를 밝혔다. ELS 주최 측은 슈퍼리그 우승팀 상금으로는 기존 챔피언스리그 대비 10배가 넘는 약 2,540억원을 수여하는 한편, 리그에 초기 참여하는 축구 팀들에겐 각 4,000억원의 참여비를 일괄 지급하는 등 천문학적인 자금을 쏟아부으면서 젊은 층 사이에서 식어가는 축구 열기를 되살리고자 했다.
이때 JP모건이 슈퍼리그 창설을 위해 무려 46억 파운드(약 7조6,000억원)를 투자키로 결정하면서 금융업계의 큰 화제가 된 바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JP모건이 방송 중계권 독점을 통해 꾸준한 현금흐름을 가져오는 것은 물론, OTT 중계를 통해 그간 상대적으로 유럽 중심이었던 축구를 글로벌 시장으로 끌고 옴으로써 막대한 ‘금광’을 확보하겠단 계산이 깔린 것으로 분석했다.
그러나 ESL은 각 구단의 팬은 물론 선수, 정치권 등 유럽 전체가 들고 일어나 반대를 외치면서 결국 출범 2일 만에 해체 수순을 밟았다. 당시 한창 외부 자본들이 유럽 축구의 정체성을 교란하고 있던 가운데, JP모건을 필두로 한 미국 자본 중심의 슈퍼리그 창설이 유럽 축구를 본질적으로 와해시킬 수 있단 이유에서였다.

미국의 넘쳐나는 유동성에 힘입어 여기저기 손 뻗치는 미국 PE들
이처럼 미국 사모펀드들이 IT, 금융, 에너지와 같은 기존 투자 섹터를 넘어 새로운 분야에 투자 기회를 엿보고 있는 것은, 최근 미국이 파격적인 ‘자국 중심’ 경제 정책들을 기반으로 전 세계 달러 유동성을 거둬들이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즉 미국은 초당적 인프라법(BIL) 및 반도체 과학법(CHIPS and Science ACT) 추진 등의 치밀한 물 밑 작업을 통해, 매파적인 금리 인상 기조를 이어가면서도 자국 내 유동성은 충분히 확보하는 한편, 글로벌 유동성은 메말라 붙게 함으로써 전 세계가 미국 자본에 의존하게 만들었다는 분석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2020년 3월 23일을 기점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실물 경제 위축을 우려해 약 2년간 광범위한 양적완화 정책을 시행했고, 이는 ‘기축 통화’인 달러의 특성상 자국 경제 활성화뿐만 아니라 낙수효과를 통해 글로벌 경제 타격 최소화에 상당한 도움을 줬다. 즉 미 연준이 국채를 매입하면, 금융 시스템이 자국 경제 전반에 유동성을 뿌리게 되고, 이는 회사채, 주식 시장 등 다양한 증권 시장의 풍부한 유동성으로 이어져 결과적으로는 글로벌 시장까지 그 유동성이 닿게 된다.
그러나 지난해 3월 들어 양적 완화가 끝나고 현재까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매파적인 금리 인상 기조를 이어 나가고 있고, 심지어 지난 7월 FOMC에선 파월 의장이 “최소한 근원 인플레이션이 2025년까지는 2% 안팎으로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즉 금리 인상을 통해 물가상승세를 완전히 잡았다고 보긴 어렵다는 매파적인 입장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이같은 금리 인상 기조는 이전 양적 완화 기조와는 달리, 오직 미국만 경제 연착륙의 이점을 취할 뿐 나머지 세계 국가들의 경우에는 달러 유동성을 거둬들여 디플레이션 압박을 가중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현재 미국의 경우 가계의 모기지 부담률은 고금리 기조에도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또한 초당적 인프라법 및 반도체 과학법 추진을 통해 내수 펀더멘탈을 다지고 있는 한편, 이에 탄력을 받아 노동 시장은 견고한 모습을 보여준다. 또한 미국 기업들은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엄청난 규모의 채권 발행을 통해 유동성을 대거 확보해 둔 상태다.
나아가 미 연준이 지난 6월 20일 발표한 ‘2023 Federal Reserve Stress Test Results’에 따르면 대형 금융 기관의 경우 미래 발생가능한 경제 침체 시나리오에 대해 약 5,400억 달러(약 704조1,600억원) 이상의 손실을 감당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뿐만 아니라 미 연준은 이전 SVB 사태를 반면교사로 삼아 BTFP 제도 도입을 통해 중소형 금융 기관에 대한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이를 종합해 보면, 매파적인 금리 인상 기조가 이어져도 미국의 금융 시스템은 충분히 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단 얘기다.
그러나 미국이 달러를 자국으로 빨아들이게 되면서, 미국처럼 이렇다 할 안전장치가 없는 유럽의 경우 기존 경기 침체 국면과 맞물려 유동성은 메말라 가면서 외국 자본에 취약해져 있는 형국이다. 실제 지난달 10일(현지 시간) BNP파리바는 “최근 몇 주간 유럽 중앙은행(ECB)의 유동성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이같은 미국의 ‘이기적인’ 양적 긴축 기조를 미・중 갈등의 문맥 속에서 파악해야 한다고 본다. 글로벌 패권을 거머쥘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던 중국을 사전에 제압하기 위해 미국이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단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2015년 재닛 옐런이 지휘했던 미 연준은 당시 금리를 인상해 유동성을 흡수하던 과정에서, 이로 인해 증시 폭락을 경험해야 했던 중국을 위해 한동안 금리를 동결했던 바 있다. 반면 현재 중국은 부동산 기업인 완다그룹의 디폴트 위기로 경기 침체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금리 인상 기조를 강하게 이어가고 있는 데다 심지어 이번 7월 FOMC에선 제롬 파월 의장이 인플레이션이 안잡혔다는 구실로 매파적인 발언들을 쏟아내고 있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