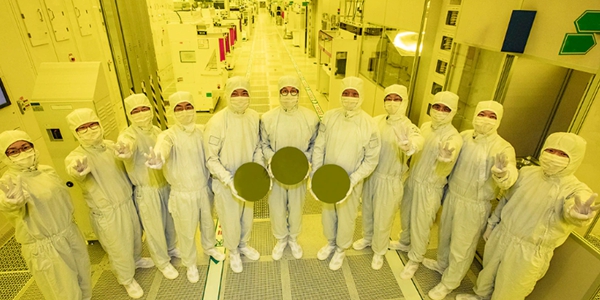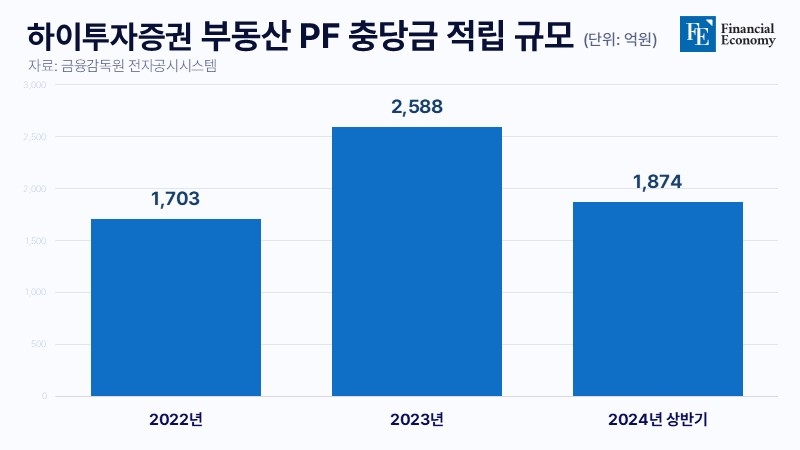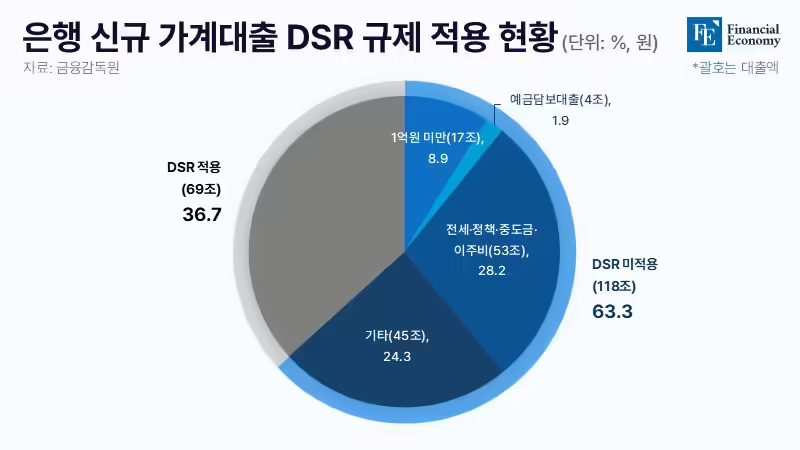개미들의 ‘국장 엑소더스’, 밸류업 프로그램 가동에도 “어차피 1회성 선거용 아니냐”
밸류업 프로그램 기대에 코스피 반등, 하지만 부정 여론 '급증', "밸류업? 어차피 총선 후 흐지부지될 것" 핵심은 기업 지배구조 개선, PBR에만 집중해선 안 돼

정부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기대에 코스피가 반등하고 있지만 정작 개인투자자들은 한국 증시를 빠르게 이탈하는 모양새다. 국내 증시의 저평가 탈출을 기다리기보단 밸류업을 차익 실현의 기회로 삼고 떠나는 것이다. 국장 자체에 대한 기대감 저하와 밸류업 프로그램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 등이 결합된 탓으로 풀이된다.
미장으로 떠나는 투자자들, “빨리 팔고 떠나야”
2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달 들어 개인은 유가증권시장에서 총 7조7,950억원어치를 순매도했다. 지난 2일엔 2조4,896억원어치를 순매도하며 개인투자자 하루 역대 최대 순매도 기록을 갈아치우기도 했다. 반면 동기간 외국인은 6조7,946억원, 기관은 1조1,293억원어치를 순매수하며 지수 상승을 이끌었다. 정부가 상장사 저평가 해소 대책인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세부 내용을 오는 26일 발표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개인과 외국인·기관이 정반대의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는 정책 실효성 및 지속성에 대한 의구심이 표출된 결과인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온라인 주식 커뮤니티 등지에선 윤석열 정부의 정책에 불신하는 글들이 지속적으로 게재되고 있다. 한 투자자는 “4월 총선 이후 어차피 흐지부지될 것”이라며 “26일이 되기 전에 빨리 팔고 떠나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개미들은 ‘저 PBR(주가순자산비율)’ 열풍을 타고 주가가 크게 오른 종목들을 집중매도했다. 현대차를 1조9,254억원어치 순매도했고, 삼성물산(-4,934억원), SK하이닉스(-3,961억원), 삼성전자우(-3,815억원), 기아(-3,481억원)도 많이 팔았다. 코스피지수 하락률의 2배에 베팅하는 ‘KODEX 200선물인버스2’를 2,048억원어치 순매수하는 청개구리 투자에 나서기도 했다.
국내 주식을 팔아치운 개미들은 미국과 일본 증시로 거처를 옮기는 양상이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국내 투자자들은 이달 들어 지난 17일까지 엔비디아 테슬라 등 미국 주식을 10억102억 달러(약 1조3,300억원)어치 사들였다. 같은 기간 일본 주식도 2,717만 달러(약 363억원)어치 샀다. 상당 금액이 국내 증시에서 흘러나온 자금으로 추정된다. 이에 전문가들은 오는 26일 발표될 프로그램 세부 내용이 시장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경우 시장에 역풍을 불러올 수 있다고 우려한다. 한 헤지펀드 운용사 대표는 “발표 당일 투자자들의 해석이 엇갈리는 등 혼란스러운 장이 예상된다”며 “최근 주가가 많이 올랐던 저PBR 종목을 중심으로 급락세가 나타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취지는 ‘저평가 해소’, 정작 ‘실효성’은?
밸류업 프로그램의 주요 목표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타파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란 선진국, 나아가 이머징 증시에 비해 우리 증시가 PBR, 주가이익비율(PER) 등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쉽게 말해 같은 규모의 이익을 내거나 같은 수준의 순자산을 가지고 있어도 우리나라 기업이라는 이유만으로 외국 시장에서보다 더 낮은 가격을 부여받고 있단 의미다. 정부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핵심 요인이 국내 기업의 낮은 주주환원율에 있다고 봤다. 주주환원율이 높아지면 발생한 배당이나 기업가치 상승분이 더 합리적으로 시장에 배분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해당 기업뿐 아니라 시장 전체의 저평가 현상이 해소될 가능성 역시 더 높아질 것이란 게 밸류업 프로그램의 주요 취지다.
다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밸류업 프로그램의 실효성에 의문을 품는 이가 적지 않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기업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따르지 않아도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의 기본 입장은 기업이 ‘자율적으로’ 주주환원을 강화하도록 유도하겠단 것이지만, 금융당국이 상장사 PBR을 끌어올리기 위해 힘을 쓴다 한들 상장사가 이에 응하지 않으면 정책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다.
이렇다 보니 시장 참여자들 사이에서는 정부가 밸류업 프로그램을 내놓을 때 기업에 강제성을 부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주주를 무시하는 회사가 너무 많다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건설 거푸집 제조사인 삼목에스폼은 당기순이익이 2015년 332억원에서 지난해 527억원까지 늘었으나, 정작 배당금은 8년 동안 100원으로 고정했다. 이익이 늘어도 과실을 주주와 나누지 않으니 삼목에스폼의 PBR은 0.48배에 불과하다.

정부 ‘밸류업’에 전문가들도 ‘우려’, “핵심 잘 가려야”
PBR 극복이 현실화하기 위해선 기업 거버넌스(지배구조) 개편이 필수적이라는 의견도 쏟아진다. 전문가들은 특히 지배구조가 대주주에게만 맞춰져 있는 기업은 밸류업 프로그램에 호응할 가능성이 지극히 적다고 지적한다. 실제 통상 국내 대주주들은 자녀에 기업을 승계할 때 낮은 주가를 선호하는 편이다. 주가가 너무 오르면 그러잖아도 최대 60%까지 치솟는 상속세가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투자할 때 PBR뿐 아니라 기업 경영진을 봐야 한다는 조언이 나오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이남우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은 “주가 할인을 고착화한 상장사 스스로 반성하고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주체는 경영진이 아니라 이사진이 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내 대형 자산운용사의 한 고위 관계자도 “밸류업 프로그램에 페널티가 없다면 상장사로선 기업지배구조보고서에 주가가 저평가받는 이유를 분석하는 등 품이 많이 드는 일을 굳이 할 요인이 없다”며 “페널티가 있더라도 강하지 않으면 기업을 움직이게 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정부가 벤치마크로 삼고 있는 일본 밸류업 프로그램 또한 핵심은 지배구조 개선에 있다. 신한투자증권에 따르면 일본 밸류업 프로그램 도입(지난해 3월) 이후 프라임 지수 내 저PBR 종목들은 약 6개월 후 고점을 형성한 뒤 주가가 꺾였다. 한 단계 체급이 낮은 종목들로 구성된 스탠다드 지수 내 저PBR주들 역시 밸류업 도입 초기 상승하다가 6개월을 정점으로 내리막길을 걸었다.
앞서 언급했듯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자동차·은행 등 저PBR 기업이 대거 몰려 있는 코스피를 중심으로 투자금이 집중되는 양상이 나타난 바 있다. 지배구조 개선 없이 밸류업만 강조하는 건 실질적인 의미가 거의 없는 단기 인센티브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쏟아진다. 이 회장도 “밸류업 프로그램의 원산인 일본이 성공적인 개혁을 이룰 수 있었던 주요 원동력은 결국 지배구조 개선”이라며 “실질적인 지배구조 개선을 이뤄내지 못한다면 코리아 디스카운트 타파는 요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