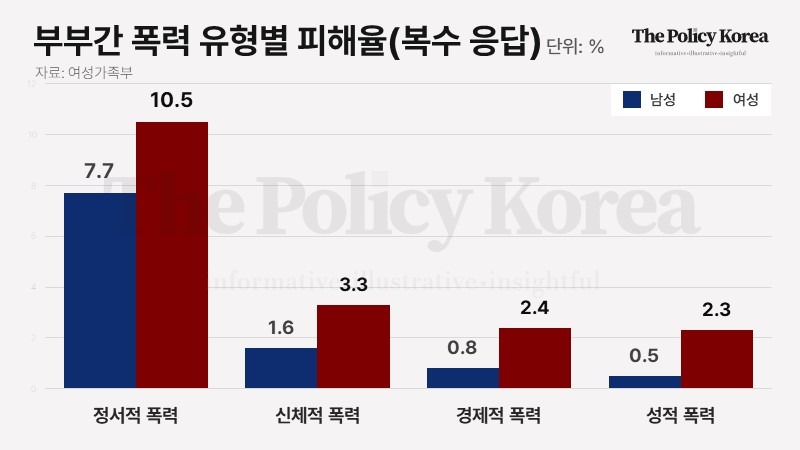20년간 주인 못 찾은 ‘상암DMC 랜드마크’, 주거용도 비율 늘린다고 팔릴까
'유찰 또 유찰' 외면받는 상암DMC 랜드마크 용지, 재매각 나선다 공급 조건 개선 나선 서울시, 분양 사업성 제고에 초점 맞춰 "아직 매력 부족하다" 차가운 업계 시선, 수익 장담 어려워

서울시가 상암 디지털미디어시티(DMC) 랜드마크 용지 재매각에 나선다. 서울시는 오는 28일 상암DMC 랜드마크 용지 공급에 대한 공고를 낸다고 밝혔다. 내년 1월 3일에는 서울 마포구 상암동 DMC 첨단산업센터에서 사업자 대상 용지공급 설명회도 진행한다. 서울시가 주거용도 비율 확대 등 매각 성사를 위한 ‘미끼’를 던진 가운데, 과연 상암DMC는 20년간 이어진 ‘유찰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반복되는 유찰, 이번엔 새 주인 찾을까
‘DMC 랜드마크 빌딩’은 서울시가 마포구 상암동 DMC 인근 3만7,262㎡(약 1만1,000평)부지에 100층 이상의 초고층 빌딩을 건립하는 사업이다. 2000년대 초 서북부권의 랜드마크 조성을 목표로 첫발을 뗐으나, 2008년 사업자 선정 이후 경영 여건 변화 등의 영향으로 한 차례 무산된 바 있다. 이후 2012년에는 거래에 나선 서울라이트타워가 토지 대금을 연체하며 계약이 해지됐고, 2016년 재매각 역시 무산됐다.
시는 올 초 재차 부지 매각 공고를 내면서 사업 재추진을 알렸으나, 지난 6월까지 이렇다 할 진전은 없었다. 이번 DMC 랜드마크 용지공급은 수차례에 걸친 유찰 이후 부동산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공급 조건을 완화해 추진하는 것이다. 서울시는 상암동 1645필지(F1)와 1646필지(F2)를 일괄 매각할 예정이며, 1필지만 신청하는 건 불가능하다. 용지공급 가격은 8,365억원으로 지난 3월 공고(8,254억원) 대비 111억원 올랐다.
랜드마크 용지는 중심상업지역으로 1,000%의 용적률을 적용받는다. 사실상 최고 656m(약 133층 규모) 높이의 초고층 건물을 올릴 수 있는 셈이다. 다만 서울시는 “서울의 대표 랜드마크 건립을 위해 도시계획이 수립돼 있다”며 “건축법상 초고층 건물(50층 이상) 또는 기능적, 예술적으로 뛰어난 랜드마크 역할을 할 수 있는 건축물로 계획해야 한다”는 조건을 걸었다.
수익 조건 완화됐지만 전망은 ‘안갯속’
이번 재매각에서 눈여겨볼 만한 점은 ‘수익성 개선’에 있다. 서울시는 해당 용지의 주거용도 비율을 기존 20% 이하에서 30% 이하로 확대했다. 분양 사업성을 높여 공급 조건을 개선한 것이다. 숙박시설(기존 20% 이상→12% 이상)과 문화·집회시설(5% 이상→3% 이상)은 축소하는 방향으로 변경했다. 그 대신 공공성 확보를 위해 업무시설과 방송통신시설, 연구소 등 기타 지정용도 비중을 기존 20%에서 30%로 늘렸다. 특히 업무시설의 경우 연면적의 10% 수준을 오피스텔로 충당할 수 있다.
매각이 원활히 성사될 수 있도록 참여 조건도 완화했다. 우선 사업 준비 기간을 충분히 제공하기 위해 공고 기간을 3개월에서 5개월로 늘렸다. 사업자의 초기 부담 경감을 위해 특수목적법인(SPC) 설립자본금은 대폭 축소했다. 기존에는 총사업비의 10% 이상인 약 3,000억원을 납부해야 했지만, 이번 공고에선 기준이 200억원 이상까지 낮아졌다. 연이은 ‘유찰의 굴레’를 끊어내기 위해 지자체 차원에서 눈높이를 낮춘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여전히 높은 용지 가격, 사업성 부족 등을 문제로 지목하고 있다. 서울에 얼마 남지 않은 대규모 개발 가능 용지라는 이점에도 불구, 초고층 건물 설립 부담 및 업종 제한으로 인해 수익을 장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해당 사업이 실제 사업자에게 매력적인 ‘상품’이 되기 위해서는 단순 주거 비중 확대를 넘어 근본적인 수익성 개선 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