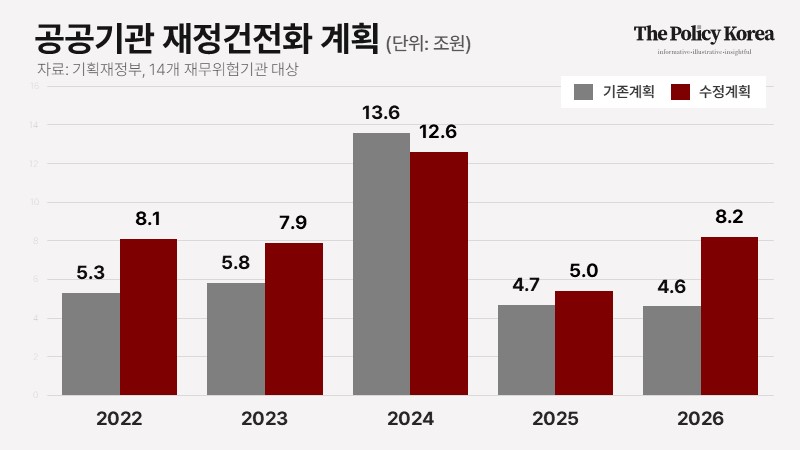[기자수첩] 중앙은행의 금리 변화가 낳는 잠재성장률 영향, 사회·문화적 효과를 고려해야하는 시대
중앙은행의 금리 정책이 단순히 금윤시장에만 영향 준다는 사고 방식 벗어나야
이미 각 국 중앙은행은 잠재성장률, 사회·문화적 영향까지 고려하는 상황
한국은행도 금리 정책에서 물가, 환율 밖의 국가 미래까지 고민하며 결정해야
서영경 전 금융통화위원이 지난 4월 퇴임에 앞서 한국은행의 금리 결정이 예전처럼 금융시장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인구구조, 사회·문화적 영향, 기술 변화 등에 복합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다고 밝힌 적이 있다. 실제로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 소속 행원들도 금통위원들의 정보 요구 내용이 지난 10년 사이에 크게 바뀌었다는 점을 언급한다. 매월 둘째주 목요일 금통위 회의 전에 제출하는 보고서도 달라졌다는 것이다.
지난 2008년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시행했던 ‘제로 하한(Zero Lower Bound, ZLB) 정책’들이 금융시장에서 유동성 함정만 일으키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팽배했던 지난 2010년대 초반부터 적극적으로 연구됐던 정책들이 10년 터울로 한국에서도 시행되고 있다는 뜻이다. 금통위원들 대다수를 미국 명문대 박사과정을 거친 인재들로 구성하고, 이창용 총재처럼 글로벌 주요 금융 정책 조직들을 거친 인재들이 한국의 금융 정책을 이끌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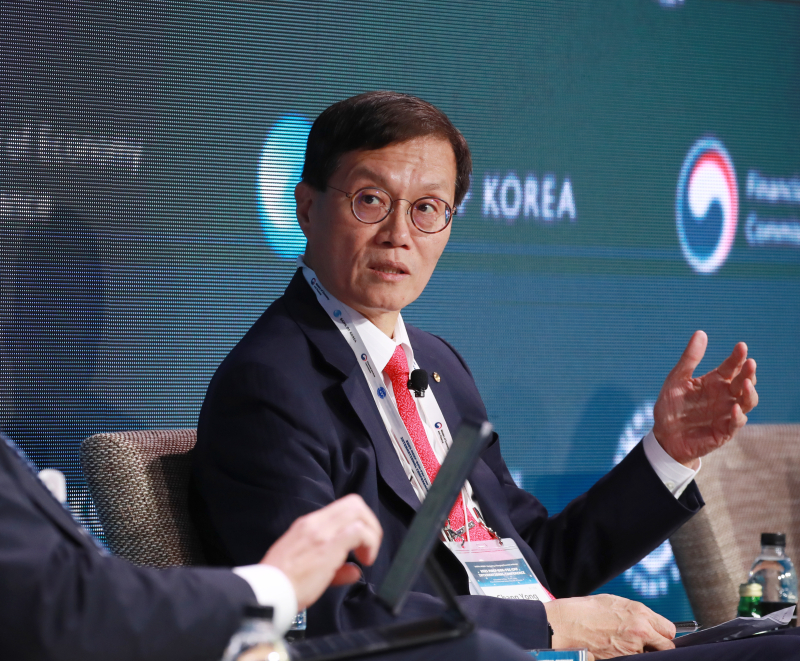
제로 하한 정책이 낳은 금융 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
서영경 전 금통위원은 퇴임 회고록에서 전통적으로 신흥시장국에서는 선진국과 달리 기준금리가 제로하한(ZLB)에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차대조표(B/S) 정책’의 활용도가 크지 않았지만 이번 위기과정에서는 한은은 대차대조표의 자산과 부채 구성을 변화시킴으로써 시장조성자, 최종대부자, 선별적 신용지원 등과 같은 다양한 역할을 수행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전통적으로 중앙은행은 성장과 물가 등 거시경제변수를 중시해 왔으나 이제는 산업과 고용 등 미시적 상황에 대한 이해를 넓힐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산업과 노동시장의 구조변화는 단기시계에서의 통화정책 대응을 넘어서 중립금리 변화 등에 영향을 받는 것을 확인한만큼, 중앙은행의 금리 결정이 물가, 금융권의 수익성 변화 등을 넘어 사회 구조적인 변화를 감안해야 한다는 것을 서 위원이 인지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중앙은행의 기본 정책은 통화 공급량을 움직여서 기준 금리를 조절하는 것이다. 베이비 스텝, 자이언트 스텝 같은 표현들이 우리 눈에 보이는 정책 결정이다. 그러나, 뒤에서는 단순히 종이로 찍어낸 화폐 공급량 뿐만 아니라, 은행간 거래를 제한하고, (통화안정)채권을 시장에서 매각/매수하는 공개시장 조작 정책을 써서 금융권이 갖고 있는 유동성(M3)의 총량을 조절하는게 대표적으로 알려진 정책 수단이다. 은행이나 보험/자산운용 같은 곳들이 예금이나 적금/투자금을 굴려서 돈을 벌 때, 1개 투자처에 모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골고루 나눠서 분배하는데, 그 중에 가장 안전자산이라고 생각하는게 정부나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채권이라서 투자 안 하고 남은 돈이 있으면 현금을 갖고 있기보다 국채를 사 놓는다.
이런 교과서적인 통화정책 및 파급효과가 1980년대 초반 그린스펀 미 연준 의장 때부터 정착된 거시경제의 통화정책 수단들이다. 그러나 2008년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금융권에 확산된 ‘거래 상대방 위험(Counterparty Risk)’로 인해 금융기관 간의 거래 자체가 사라지면서 위의 채널이 사실상 붕괴됐다. 다급한 마음에 각국 중앙은행들은 이자율을 거의 0%까지 내리는 도박을 감행하면서까지 시장에 대량의 유동성을 공급해줬다. ‘제로 하한 금리’ 정책의 시작이다.
한계에 부딪힌 통화정책, 재정정책의 역습이 또 다른 위협
이자율 0% 정책으로 다급한 위기는 넘겼지만, ‘돈의 가격’이 0으로 수렴하면서 대출이 폭증하기 시작했다. 기존에 작동하던 통화정책의 효과가 축소됐지만 금융권이 살아나기만을 기다렸으나, 10년 만에 코로나-19 팬데믹이 터지면서 정부가 재정정책을 통해 코로나 지원금을 지급하기 시작했다. 거시경제학에서 배우는 통화 팽창, 재정 팽창이 동시에 일어난 것이다. 때문에 ‘돈의 가격’이 0으로 수렴한 상태에서 이제 돈을 지급까지 해주니 ‘공짜보다 더 공짜’가 된 것이다.
각 국 중앙은행은 금리를 0%로 내리면서 제로 하한 정책들을 실험하고 B/S 정책들을 통해서 시장 유동성(M3) 규모를 조절하는 타협점을 찾던 중이었다. 한 때 1990년대 일본 모델을 참조하다가 미국과 유럽에서 경제학자들이 자국 경제 시스템에 적합한 방식의 B/S 정책을 찾기 시작했고, 한국도 그런 정책 실험들의 결과를 반영하는 국가 중 하나였다. 그런데 재정 팽창이라는 제 3의 변수가 개입되면서 지난 40년 간 선진경제에서 볼 수 없었던 수준의 인플레이션이 발생한 탓에 각종 B/S 정책들의 효과가 크게 상쇄되어 버렸다.
서 위원의 임기 초반에는 ZLB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수적인 정책 위주로 금융 정책이 결정됐다면, 후반부에는 인플레이션 대응이 우선 과제로 바뀐다. 그러나 고(高) 인플레이션에 대응하면서 이미 한계 상황에 이른 가계와 한계 기업들의 취업 포기, 고용 포기, 기술 개발 포기 등의 사회·문화적인 영향을 폭 넓게 고려해야하는 시대가 됐다는 인식이 자리잡힌 것으로 보인다.
중앙은행의 이자율 정책이 국가 잠재력도 뒤흔드는 시대가 왔다
예전에는 나라 경제의 잠재력이 고정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인구구조 변화, 기술 변화, 산업 구조 변화 같은 요소들을 고려하면서 잠재력을 변동 지수로 봐야한다는 것이다. 위의 정책 변화들이 잠재력을 갉아먹게 되는 것까지 고려해야 된다는 뜻이다. 말을 바꾸면, 단기적으로 이자율이 주가를 올리고 집 값을 올리는 걸 넘어서, 장기적으로 애들이 더 결혼 안 하게 만들고, 더 출산율이 떨어지고, 더 근로 의욕이 떨어지고, 기술적 도전을 안 하게 되는 구조까지 고려해야 된다는 것을 서 위원 뿐만 아니라 한국은행 전체가 인식하게 됐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국제 경제 전문가들은 비단 한국 뿐만 아니라 전세계 주요 선진 경제가 ZLB 정책, 인플레이션 대응 정책들을 거치며 유사한 인식에 도달했다고 지적한다. 글로벌 은행 규제 기관인 국제결제은행(BIS)에서 매주 발간하는 주요 중앙은행 관계자들의 발언에는 통화 정책이 금융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것만 지적했던 과거와 달리 국가 전체의 잠재성장률, 나아가서는 주변 국가의 잠재성장률에 미치는 영향까지 고려한 언급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지난 8일 KDI가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제시하는 자리에서 이례적으로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가 늦었을지도 모른다는 언급까지 한 것도, 더 이상 통화정책이 한국은행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사실을 금융권 주요 관계자들이 인지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