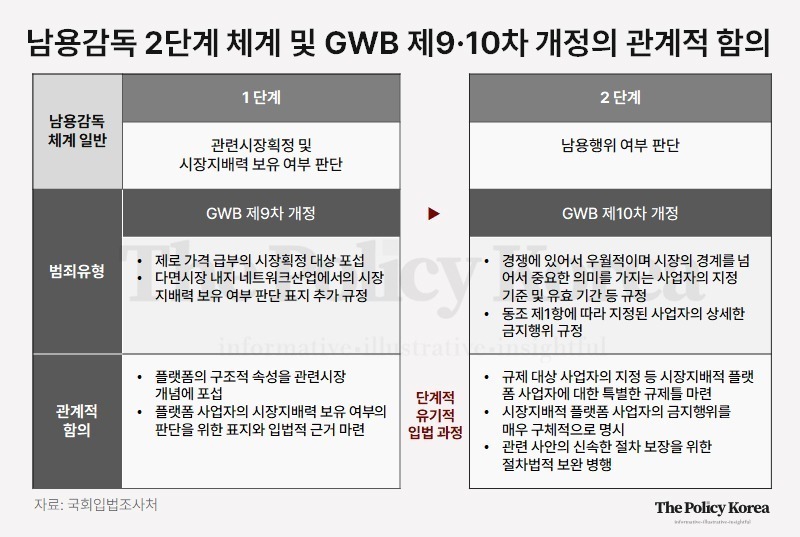[신성장4.0] “대한민국 우주 경제 시대 열겠다” 독자적 우주 탐사의 현실성 검토 ①
정부, “2045년 글로벌 우주 강국으로 도약하겠다” ‘우주항공청 개청·누리호 3차 발사’ 등 대형 프로젝트 및 민간 우주산업 육성 추진 한편, 미국 등 우주 산업 선진국도 실패 사례 많아, 확고한 의지 필요하단 지적도
 정부가 미래형 모빌리티·스마트 물류·우주 탐사 등 초일류국가 도약을 위한 신성장 4.0 전략의 세부 계획을 내놨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신성장 4.0 전략 2023년 추진계획 및 연도별 로드맵’을 발표했다.
정부가 미래형 모빌리티·스마트 물류·우주 탐사 등 초일류국가 도약을 위한 신성장 4.0 전략의 세부 계획을 내놨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신성장 4.0 전략 2023년 추진계획 및 연도별 로드맵’을 발표했다.
로드맵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30여 개의 세부 대책을 추진하고 그 과정에서 민간기업 등의 역량과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올해 안으로 이번 15대 프로젝트별 주요 추진사항과 관련한 30+α개 주요 대책이 발표되고 세부 과제별 별도의 추진 계획에 대해서도 지속해 보완 및 구체화에 나설 예정이다.
특히 우주 탐사 분야 프로젝트에 관해선 우주항공청 개청과 누리호 3차 발사 등 굵직한 프로젝트와 함께 민간 우주 산업 육성 등의 전반적인 우주 개발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우주 개척에 나서는 이유는?
이번 신성장 전략 15대 프로젝트 가운데서도 우주 탐사 분야가 눈에 띈다. 자율주행, 미래형 모빌리티, 디지털 치료기기 등 그 필요성을 설명하지 않아도 정부가 마땅히 추진해야 하는 분야로 인식되는 여타 프로젝트들과는 다르기 때문이다. 왜 갑자기 우주 개척에 나서겠다는 걸까?
신라시대에 지어진 천문관측기구 ‘첨성대’부터 조선시대 최고 과학자 장영실이 발명한 천문시계 ‘혼천의’와 천문학자 류방택이 제작한 천문도인 ‘천상열차분야지도’까지, 사실 우리 민족은 오래전부터 우주(하늘)에 관심이 많았다. 현대에 들어선 2009년 준공된 나로우주센터를 통해 우주 탐구에 대한 남다른 열정을 보여왔다.
미국을 비롯한 세계가 우주 개발에 경쟁적으로 뛰어드는 시대의 흐름도 중요하다. 1950년대 후반 미국과 구소련 간의 냉전이 치열했던 과거에는 우주 개척, 특히 달은 강대국의 국력 과시를 위한 경연장이었지만, 최근에는 이러한 시류에서 벗어나 ‘달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 달과 미래에 관한 인류의 고민이 우주 개척을 시도하는 궁극적인 목적으로 자리 잡았다.
주변을 살펴보면 미국은 아폴로 11호 이후 반세기 만에 사람을 달에 착륙시키기 위한 ‘아르테미스-1’ 프로젝트를 시작했고, 중국도 독자 기술을 통한 우주 개발에 속도를 내며 달을 인류가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의 하나로서 인식하는 등 우주 탐사에 대한 궁극적 목적에 변화가 일고 있다. 나사에 따르면 현재 로켓과 위성 수요가 급증하면서 세계 우주 산업은 2040년대 들어 연간 3,000조원까지 커질 블루오션으로 주목받는 상황이다.

쉽지만은 않은 우주 개척 “미국도 버벅거리는데”
하지만 현재 우주 산업 관련 최고 선진국들의 사정을 살펴보면 우주 개척과 달 탐사가 말처럼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1969년 7월21일(세계표준시 기준) 미국 아폴로 11호가 달에 착륙했다. 인류 최초로 수많은 신화와 상상의 무대에 인류 최초로 올라섰다는 영광도 잠시, 미국은 반세기가 넘는 시간 동안 쉽사리 달에 다시 갈 생각을 못했다. 당시 미국이 달 착륙 프로그램 아폴로에 쓴 예산만 모두 250억 달러로, 지금 가치로 환산하면 약 1,500억 달러(약 180조원)에 이르는 막대한 재정을 썼기 때문이다.
미국뿐 아니라 다른 나라의 상황도 마찬가지다. 아니, 오히려 막대한 투자금을 쏟아부었지만, 달 착륙은커녕 달 표면 근처에도 가지 못한 경우도 허다하다. 달 탐사에 관한 최근 사례로 지난 2019년 이스라엘의 비영리 민간 우주 개발 기업인 ‘스페이스IL’의 달 탐사 프로젝트를 꼽을 수 있다.
당시 스페이스IL이 개발한 착륙선 ‘베레시트’는 이스라엘의 많은 연구기관과 대학의 도움을 받아 사실상 한 나라의 우주 산업계 전체를 총괄하는 프로젝트의 결과물이었다. 자체 개발한 기술 등으로 약 1,100억원의 개발 자금이 투입된 베레시트는 21세기 다른 착륙선보다 나름 저렴한 예산을 들여 제작됐고 2019년 4월 두 달 이상의 비행 끝에 달 궤도에 도달하는 데 성공했다. 하지만 막판 달 착륙을 시도하던 중 기체 내부의 사소한 센서 오작동으로 달 표면과 빠른 속도로 충돌 후 그대로 곤두박질치고 말았다.
이렇듯 기본적으로 달 탐사를 진행하는 데만 무수한 재정이 소요되며 성공 가능성 또한 희박하다. 스페이스IL 공동창업자 요나단 와인트라우브는 실패한 달 탐사 프로젝트에 대해 “탐사선을 만드는 과정에서 인류의 무한한 도전 정신을 일깨우고 우주 기술의 발전 가능성을 확인하는 등 많이 배웠다”고 평했지만, 이와 같은 기술적 도전이 한국 사회 전반 기술개발에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정부가 꿈꾸는 우주 개척
한국은 아직 갈 길이 멀다. 최근 누리호의 1단 액체 엔진을 비롯한 모든 부품을 순수 국내기술로 개발하는 등 약진을 이뤘지만, 아직 한국형 발사체조차 완성하지 못했다. 그나마 최근 정부 들어 큰 폭의 예산을 들이며 “우주 경제 시대를 열겠다는” 슬로건과 함께 우주 개발 계획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모습이다.
먼저 정부는 올해 6월 누리호 3차 발사를 진행하고 연말까지 특별법 제정을 통해 우주항공청을 개청 등 대형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했다. 장기적으로는 2032년까지 국내 순수기술을 통한 차세대 발사체 개발을 이뤄내고 다음 해인 2033년까지 달 착륙선을 개발할 계획이다. 나아가 광복 100주년을 맞는 2045년에는 그간 축적해온 고유한 우주 기술과 역량을 바탕으로 글로벌 우주 강국으로 도약하며 ▲우주 탐사 영역 확장 ▲우주 개발 투자 확대 ▲민간 우주 산업 창출 등의 성과를 달성하겠다는 구체적인 목표를 갖고 있다.
누리호의 발사 성공과 다누리 발사의 사례로 볼 때 글로벌 우주 경제 강국으로 발돋움하겠다는 정부의 꿈은 허무맹랑하지만은 않다. 다만 관련 업계의 회의적인 시선도 적지 않다. 한 국내 우주 항공 산업 관계자는 “과거 2010년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을 비롯한 우주 산업 관련 연구기관들의 인터뷰를 살펴보면 2020년까지 순수 국내 기술로 만든 달 착륙선을 완성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내비쳤지만, 실제 기술 발전은 매우 더디게 진행됐다”며 “이러한 전례로 볼 때 정부의 확고한 의지가 없으면 이번에도 유명무실한 프로젝트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하며 이번 로드맵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