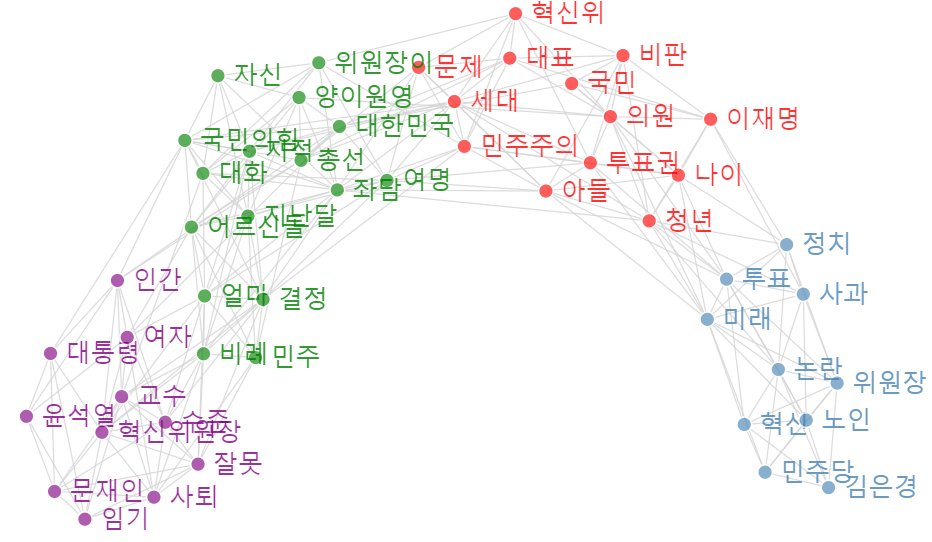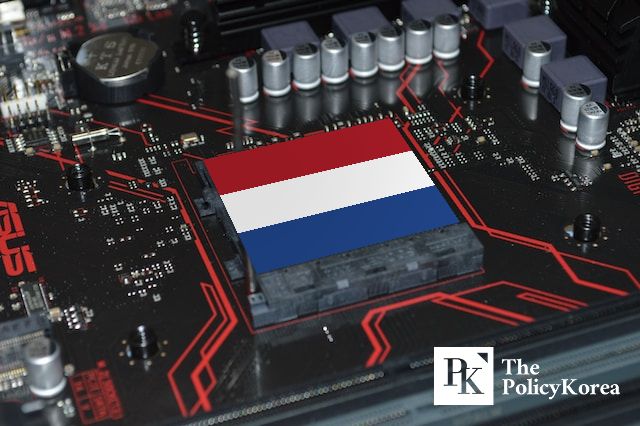“굳이 한국에?” 국내 시장 떠나는 조선족들, 현장 ‘빈자리’ 누가 채웠나
국내 체류 한국계 중국동포 수 급감, 청년층 유입 적어지며 국내 인력 고령화 가속 중국 내 조선족 사회 뒤흔들던 '코리안 드림'은 옛말, 젊은이들 中 대도시로 간다 중국동포 빈자리 채운 동남아·중앙아시아 인력들, 인력난 시달리던 고용시장 "환영"

국내 체류 외국인 수가 251만 명을 돌파한 가운데, 1993년 산업연수생 제도 도입 이후 30년간 국내 인력 시장을 지탱하던 한국계 중국동포(조선족)들이 속속 한국을 떠나고 있다. 코로나19 발생 이전 30만 명에 육박했던 중국동포 취업자 수는 불과 몇 년 새 절반 수준까지 급감했다.
우리나라 산업계는 생산가능인구(15세~64세) 감소, 국내 인력의 대기업·사무직 선호 현상 등으로 인해 고질적인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다. 이렇다 보니 일선에서 궂은일을 도맡아 하던 중국동포의 대규모 이탈은 뼈아픈 타격이 될 수밖에 없다. 혼란에 빠진 우리나라 사업장의 빈 일자리를 채우고 있는 이들은 국내 인력이 아닌 동남아·중앙아시아 출신 근로자들이다.
빠르게 줄어드는 국내 중국동포
25일 법무부에 따르면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수는 지난달 말 251만4,000명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2021년 말(195만7,000명)과 비교하면 55만7,000명(28.4%) 증가한 수준이다. 반면 국내 체류 중국동포는 23만9,700명으로 4년 새 29.2% 급감했다. 2019년 말 22만6,322명에 달했던 국내 한국계 중국인(H-2) 취업자는 올해 7월 기준 10만5,671명까지 줄었다.
한국에 머무는 중국동포 대부분은 1990~2000년대에 정착한 사람들이다. 하지만 현재 20~30대인 젊은 중국동포들은 더 이상 이들처럼 ‘코리안 드림’에 부풀어 한국행을 택하지 않는다. 물가가 높고 근로 처우가 좋지 않은 한국에 머무는 대신 중국 대도시행을 선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 땅에 남아있는 중국동포의 평균 나이대는 자연히 상승하기 시작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내에 머물고 있는 50세 이상 중국동포의 비중은 전체 중 51.8%에 달했다. 작년 말 기준 50대 이상 비중이 11.2%에 불과한 베트남인(등록 외국인 기준)과 비교하면 자그마치 40.6%p 높다. 60세 이상 중국동포 비율도 2012년 6.0%에서 14.6%로 두 배 넘게 상승했다. 이전처럼 중국동포에게 고된 업무를 맡기기도 녹록지 않다는 의미다.
사회 전반에서 궂은일을 도맡던 중국동포들이 힘을 잃고 모습을 감추자, 중국동포가 주축을 이루던 산업 전반의 인력난이 가중되는 추세다. 간병인과 가사도우미 인력이 눈에 띄게 부족해지는가 하면, 차이나타운에서조차 중국동포 종업원 고용에 난항을 겪기 시작했다. 최저임금보다 훨씬 높은 임금을 내걸어도 일할 사람을 찾기는 사실상 어렵다는 전언이다.
조선족 ‘코리안 드림’은 끝났다
과거 중국동포의 코리안 드림은 중국 내 조선족 사회를 뒤흔들며 엄청난 파장을 부른 바 있다. 한·중 수교 이전 조선족의 97%가 거주하던 동북 3성에서는 수십 년 사이 전체 인구의 4분의 3이 빠져나갔다. 한국에서 돌아오는 사람에 비해 한국으로 떠나는 사람이 압도적으로 많았기 때문이다. 인력이 빠르게 이탈하며 농업 중심의 조선족 공동체 기반은 점차 무너지기 시작했다.

1995년 491개에 달했던 헤이룽장성의 조선족 마을도 2007년에 233개로 감소했으며, 30개였던 조선족 향(鄕)은 19개(2011년)까지 줄었다. 비슷한 시기 랴오닝성에서는 13개의 조선족 향·진(鎭) 중 4개가 자취를 감췄다. 대표적인 ‘조선족 거주지’인 중국 지린성 주도 옌지 옌볜조선족자치주의 경우 전체 인구 중 조선족 비율이 1952년 70.5%에서 2020년 30.8%까지 줄어들었다. 현재 옌볜조선족자치주의 조선족 수는 약 60만 명 수준으로, 한국에서 체류하고 있는 조선족 수(70만8,000명)보다 적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중국의 근로 환경이 개선되면서 중국동포의 코리안 드림은 점차 옅어지기 시작했다. 더 이상 중국동포 청년들은 돈을 벌기 위해 한국으로 오지 않는다. 조선족의 농업 공동체에도, 한국의 궂은 일자리에도 만족하지 못한 이들은 중국의 대도시로 향하기 시작했다. 이제 한국 고용시장에 남은 중국동포는 한때 코리안 드림에 부풀었던 중·노년뿐이다.
중소기업계의 ‘주춧돌’ 된 외국 인력
중국동포의 이탈은 인력난에 시달리는 국내 중소기업에 큰 타격을 입혔다. 국내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2021년 말 3,703만 명에서 올해 말 3,637만2,000명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면 현장직, 중소기업 등을 중심으로 인력난이 발생하게 되고, 산업계 전반이 흔들릴 위험이 있다. 이 ‘빈틈’을 메꾸는 주춧돌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외국인 근로자다. 대한민국에 머물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는 공식 통계로만 84만 명 이상이며, 불법체류 외국인까지 합하면 12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실제 고질적인 인력난을 호소하는 중소기업계는 외국인 근로자 채용 확대에 긍정적인 뜻을 비추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최근 건설·제조·서비스업종의 300인 미만 기업 615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외국인 근로자 활용현황 및 정책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내년 외국인 근로자 도입 규모에 대해 ‘올해보다 확대해야 한다’는 응답한 기업은 36.9% 수준이었다. 반면 외국 인력을 올해보다 축소하겠다는 응답은 4.4%에 그쳤다.
일각에서는 소위 ‘외국인 노동자가 내국인 일자리를 빼앗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한다. 하지만 이들은 평소 내국인이 눈여겨보지 않았던 일자리, 즉 국내 인력으로는 메꾸기 힘든 일자리에 뛰어들어 우리나라 시장의 한 축을 지탱해 준다. 누군가의 자리를 빼앗는다기보다, 아무도 찾지 않는 빈자리를 채우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수요와 공급’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시장원리는 국적을 초월한다. 우리나라는 인력이 필요하고, 외국인 근로자는 일자리가 필요하다. 중국동포가 떠난 빈자리는 어느덧 동남아·중앙아시아 출신 근로자의 ‘수요’로 채워지는 추세다. 이처럼 조선족을 비롯한 수많은 해외 인력은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닌 우리 고용 시장의 엄연한 한 축으로 작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