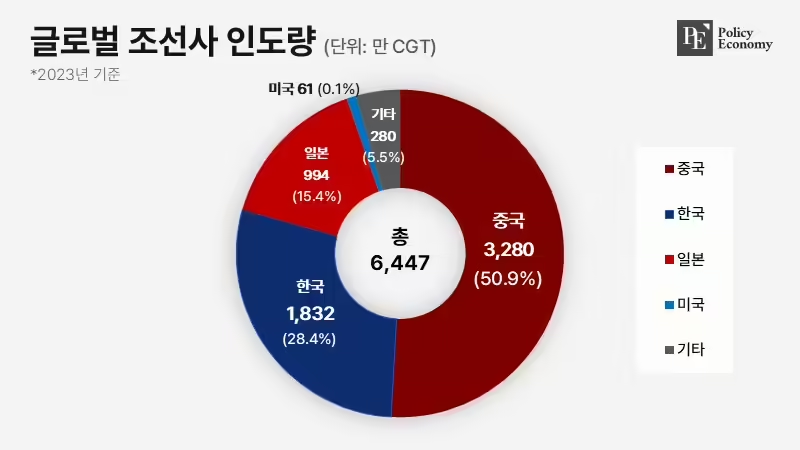바이든 정부 ‘LNG 수출 확대’ 프로젝트 중지, 표심 잡기인가 중국 잡기인가
11월 대선 앞둔 바이든 정부, 신규 LNG 수출 프로젝트에 '급제동' 성명 통해 '기후 위기 대응' 수차례 강조, 핵심 지지층 반발 의식했나 세계 LNG 공급 대거 흡수하는 중국, 수출 확대하면 중국만 이득?

미국 정부가 신규 액화천연가스(LNG) 수출 시설에 대한 승인을 전면 보류하고 나섰다. 백악관은 지난 26일(현지시간) 홈페이지에 공개한 성명에서 “정부는 계류 중인 LNG 수출 관련 프로젝트들의 승인을 일시 중지한다”고 밝혔다. 11월 대선을 앞둔 바이든 행정부가 ‘친환경 정책’에 본격적으로 힘을 싣기 시작한 것이다. 최대 가스 수출국인 미국이 화석연료 추가 생산에 제동을 건 가운데, 일각에서는 이번 프로젝트 중단이 단순 ‘지지층 굳히기’용 정책이 아닌 미·중 갈등의 연장선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바이든의 대선용 ‘녹색 행보’
업계에 따르면, 이번 성명 발표 이후 미국은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로의 LNG 수출 프로젝트를 대거 보류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미국 에너지부의 승인을 기다리던 최소 17개의 LNG 수출 프로젝트에 대한 심사 절차가 중단된다. 바이든 정부가 이 같은 ‘친환경 행보’를 강조하고 나선 것은 핵심 지지층의 화석 연료 개발에 대한 불만을 잠재우고, 유권자들의 표심을 결집하기 위해서다.
현시점 미국은 세계 최고의 가스 생산국이자 수출국으로 꼽힌다. 하지만 미국이 생산·수출하는 LNG는 이산화탄소보다 한층 강력한 온실가스로, 차후 기후 위기를 한층 심화시킬 위험이 있다. 올해 대선을 앞두고 바이든 대통령의 주요 지지층인 환경 단체가 화석연료 생산 증대에 대한 비판을 쏟아낸 이유다. 이에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기후 위기는 우리 시대의 실존적 위기”라고 강조, 프로젝트 중단이 환경 보호를 위한 조치임을 확실히 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LNG 프로젝트 중단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견제하기 위한 정치적 전략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바이든 대통령의 “공화당원들은 고의적으로 (기후 위기를) 부인하고 미국 국민을 위험한 미래로 내몰지만, 나의 행정부는 청정에너지 관련 일자리를 창출하고 어린이들을 위해 더 희망찬 미래를 건설할 것”이라는 발언이 일종의 승부수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실제 화석연료 산업에 대한 규제 철폐를 주장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주말 유세 과정에서 “나는 집권 첫날 (바이든 대통령이 중지한) 새로운 프로젝트를 승인할 것”이라고 발언, 바이든 대통령의 도발에 맞불을 놓기도 했다.
‘LNG 싹쓸이’ 중국 수요 의식했나
한편 이번 LNG 수출 중단이 미·중 갈등의 일부라는 시각도 존재한다. 수년 전부터 중국이 ‘에너지 안보’를 확보하기 위해 LNG 수입에 공을 들이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중국의 LNG 수입 규모는 2015년 1,790만 톤에서 2021년 7,840만 톤까지 폭발적으로 증가한 바 있다. 지난해 상반기에는 세계 전체 LNG 장기 도입 물량의 33%를 ‘싹쓸이’하기도 했다(블룸버그 추정치 기준).
문제는 앞서 언급했듯 미국이 세계 최대의 가스 수출국이라는 점이다. 천적 관계인 중국과 미국이 LNG 시장에서만큼은 ‘최대 수입국’과 ‘최대 수출국’으로 얼굴을 맞대야 하는 셈이다. S&P 글로벌 커머디티 인사이트 자료에 따르면 2021~2022년 미국산 LNG 공급 계약 중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자그마치 24.4%에 육박한다. 같은 기간 미국 LNG 업체들과 중국은 연간 약 1,900만 톤에 달하는 공급 계약을 발표한 바 있다.
바이든 정부가 제동을 건 LNG 신규 시설 투자는 차후 수출 용량 확대를 위한 프로젝트다. 프로젝트가 정상적으로 진행돼 미국의 LNG 수출이 증가할 경우, 세계 LNG 물량을 쓸어 담고 있는 중국 역시 혜택을 볼 가능성이 크다. 미국이 중국의 에너지 안보 확보, 초과 물량 재수출을 통한 수익 창출 등을 지원하는 탐탁잖은 그림이 연출되는 셈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11월 대선을 앞둔 바이든 대통령이 미·중 갈등 상황을 고려, 자원 추가 수출을 차단하며 ‘표심 이탈’ 리스크를 막았다는 분석이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