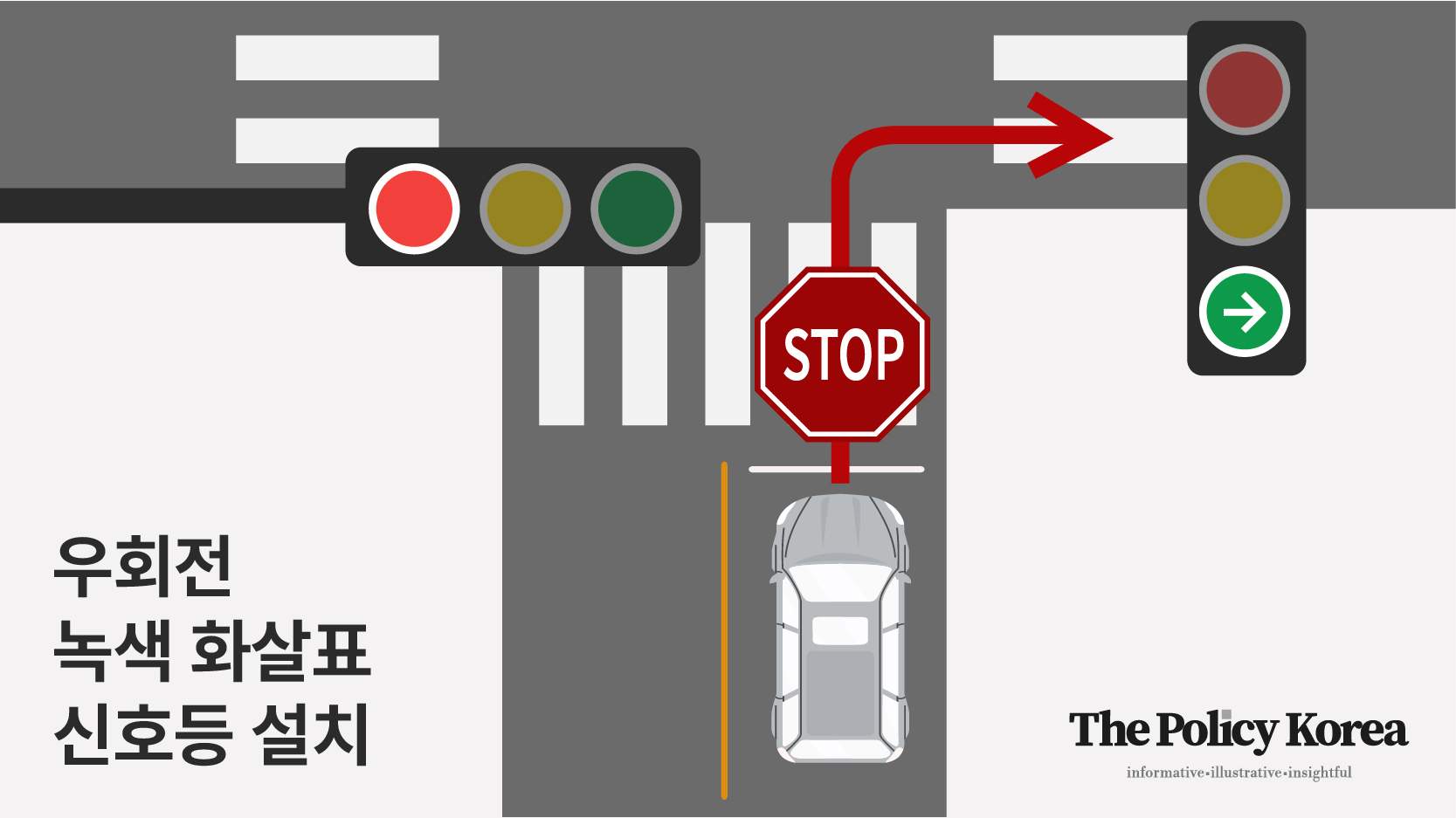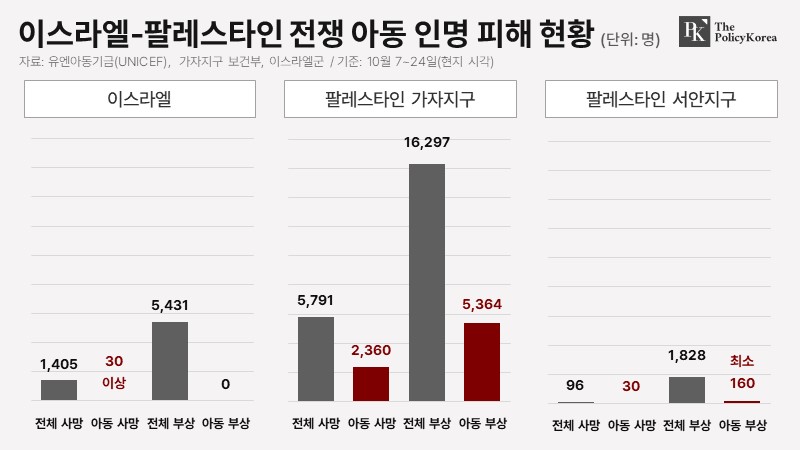중국·인도에 비자 쿼터 뺏긴다? STEM 전공자 1/4 수준 한국, 미국 내 경쟁력 저하는 ‘필연’
IRA에 미국 몰리는 기업들, 정작 인력난에 '골머리' H-1B 비자 발급률 낮은 한국, "역량 부족 등이 근본 원인" 중소기업계 우는소리에도 "현실 직시해야, 교육체계 개편이 우선"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른 보조금 혜택 등을 받기 위해 미국에 제조시설을 짓기로 한 한국 기업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다름 아닌 공장 관리 인력을 구하지 못해서다. 국내 기업이 관리 역량이 있는 한국 인력을 직접 파견하려 해도 미국 정부가 관련 비자 쿼터를 늘려주지 않아 빈번히 불발됐다. 이에 업계에선 “사람을 못 구해서 공장 가동이 멈출 판”이라며 H-1B 비자 발급 쿼터를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일각에선 “한국인 인력이 미국에서 어필될 만한 능력을 지녔는지부터 판가름해 봐야 하는 것 아니냐”는 회의적 시각도 나온다. 우는소리만 할 게 아니라 실질적인 원인을 분석하고 이를 타파할 만한 체계 개편을 우선 이뤄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 비자발 인력난 장기화, “수급 길 꽉 막혔다”
3일 산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에서 엔지니어나 관리직으로 일할 수 있는 전문직 취업(H-1B) 비자 신청자는 75만8,994명으로 1년 전(47만4,421명) 대비 59.9% 늘었다. 2021년 30만1,447명과 비교하면 2년 새 2.5배로 확대된 셈이다. 그러나 정작 미국이 내주는 H-1B 비자 쿼터는 수년째 연 8만5,000개로 동결된 상태다. 즉 신청자 중 비자를 받을 수 있는 인원은 9명 중 1명꼴 정도밖에 되지 않는단 의미다. 그나마도 구글, 아마존 등 미국 내 빅테크 기업이 채용하려는 중국, 인도의 IT 인력 위주로 선정되고 있다.
특히 불만이 높은 건 중소기업계다. 투자 규모가 큰 대기업의 경우 ‘주재원 비자'(L1 또는 E2)를 통해 필수 인력을 채우면 그만이지만, 중견·중소기업의 경우 특성상 H-1B 인력이 필수불가결하다. 애초 투자 규모가 크지 않은 기업엔 미국이 L1·E2 비자를 잘 발급해 주지 않는 탓이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현재 H-1B 발급자 중 한국인의 비율은 2% 내외 선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중소기업계는 “그나마 뚫려 있는 길마저 중국, 인도의 IT 인력 위주로 선정되는 양상”이라며 “사실상 인력 수급이 꽉 막히면서 제대로 된 사업을 진행할 수 없게 됐다”고 토로한다.
‘미국 비자발 인력난’이 장기화하면서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졌다. 업계에서 내놓은 해법은 ‘전용 취업비자 쿼터’다. 미국은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호주에서 1만500명을, 싱가포르에서 5,400명을 전용 취업비자 쿼터를 적용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도 전용 취업비자 쿼터가 적용된다면 인력 수급 길도 원활해질 것이란 게 이들의 주장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취업비자 쿼터의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입을 모은다. 미국 국회가 관련 결정을 유보하고 있어서다. 앞서 트럼프 정부 당시 미국이 H-1B 발급 요건을 대폭 강화하고 나선 점도 불안 요인이다. 비자 발급 비중을 오히려 줄이려는 미국 입장에서 한국인 쿼터만 늘리겠다 나설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비자 발급 밀려나는 한국인들, 왜?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각에선 비자 발급에서 한국인이 상대적으로 밀려난 본질적인 원인부터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주로 지적되는 부분은 한국 유학생의 ‘전공 과목’이다. 최근 미국이 영입하려는 인재 풀은 ‘STEM(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Math)’ 분야지만, 한국 유학생 가운데 STEM을 본격적으로 전공하는 이들은 전체 유학생의 21% 정도 비율밖에 안 된다.
반면에 인도는 유학생의 83%가량이 STEM을 전공하고 있고, 중국은 41%가 STEM을 전공하고 있다. 비자 발급 쿼터 중 상당수를 중국인과 인도인이 가져가고 있는 것도 결국 필연적인 일인 셈이다. 미국 빅테크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 대부분이 중국과 인도에 포진해 있으니 한국인 인력은 구태여 찾아 들여올 일이 많지 않은 것이다.
미국 유학 중 취업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는단 점도 원인 중 하나로 꼽혔다. 실제 한국 유학생은 대체로 한국 학생들끼리 어울리려는 경향을 보인다. 대학 수업을 영어로 하되 방학 때가 되면 한국으로 돌아와 고향의 정기를 느끼다 돌아가는 경우도 많다. 반면 인도, 중국 등 유학생들은 기를 쓰며 인맥 쌓기에 집중하고 방학 때에도 전 세계로 흩어져 전공 관련 분야 인턴생활을 하면서 실력을 쌓으려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소 비전이 떨어지는 자국 내 기업보다 최저 연봉을 받더라도 어떻게든 미국 내 기업에 취업하는 게 낫다는 인식이 강하게 박힌 영향이다.

커뮤니티 칼리지도 외면, ‘돈 안 되는’ 전공 몰리는 한국
인도, 중국 인력의 미국 진출 의지는 지난 2011년부터 지표로 가시화된 바 있다. 당시 미국 내 고학력자 비율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감소세에 접어들었으나, 오히려 외국인 유학생 비율은 늘었다. 당시 미국 대학에 재학 중이던 해외 유학생은 69만여 명으로 10년 전 대비 26% 증가했는데, 이 중 중국 유학생이 전체 유학생의 18%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압도적인 비율을 보였다. 2위는 15%를 차지한 인도였다.
미국 대학원협의회(CGS)에 따르면 그해 가을 학기 미국 대학원을 지원한 중국 유학생들 또한 전년 대비 21%나 늘었고, 입학 허가서를 받은 이들도 23% 증가했다. 반면 당시 미국 내 한국인 유학생 비중은 10% 남짓에 불과했던 데다, 그마저도 STEM 전공자 수는 타국 유학생 대비 1/4 수준을 겨우 넘어섰다. 소위 ‘돈 안 되는’ 전공에만 몰리자 사실상 학위 장사만 강화됐단 우스갯소리까지 나왔다. 2015년에는 유학생 중 중국인이 31.5%, 인도인이 15.9%, 한국인이 5.8%로 비중 차이가 더욱 극심해졌다. 비자 발급 쿼터 중 한국인의 비율이 낮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셈이다.
미비한 취업 의지도 현재진행형이다. 대학 졸업의 중요도가 낮아지며 취업이 상대적으로 쉬워졌음에도 취업에 큰 뜻을 두지 않고 있는 것이다. 실제 최근 미국 기업들은 대학 졸업장을 중시하지 않는 추세다. 구인·구직 플랫폼 링크드인에 따르면 미국 기업 가운데 학위 취득 조건을 내걸지 않았던 기업은 2021년엔 전체의 15%에 불과했지만 지난해엔 19%까지 늘었다. 또 설문조사 결과 기업 인사 담당자의 75%가 “향후 18개월 안에 직원을 뽑을 경우 학벌보다 실력을 중요한 기준으로 삼을 것”이라고 응답하기도 했다. 대표적인 빅테크 기업인 구글 또한 4년제 출신을 고집하지 않고 인재를 등용하고 있고, 최근엔 세계 최대 IT 컨설팅기업인 엑센추어도 2년제 출신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이 때문에 미국에선 우리나라의 전문대와 비슷한 입지에 있는 2년제 대학 ‘커뮤니티 칼리지’의 인기도 높아지는 추세다. 빠르게 취업 길에 들겠단 이들이 늘어난 셈이다. 하지만 한국 유학생의 시선은 여전히 4년제 대학에 머무르는 모양새다. 한국 유학생의 미국 유학 목적이 취업보단 학문 수양에 좀 더 치우쳐 있는 탓이다. 한국 유학생들의 STEM 전공 비율이 아시아 평균치보다 미달하는 이유도 이와 직결돼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결국 이미 한국인 인력 풀과 인도, 중국인 인력 풀 사이 격차는 이미 벌어져 있는 상태다. 한국 인력이 미국에 ‘어필’할 강점이 부족하단 의미다. 국내 중소기업계가 덮어놓고 주장하는 비자 쿼터 확대가 공허하게만 들리는 이유다. 미국에 비자 발급 비중을 늘려달라 요구만 할 게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교육체계 개편 등 본질적인 문제 해결을 도모해야 한단 목소리가 높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