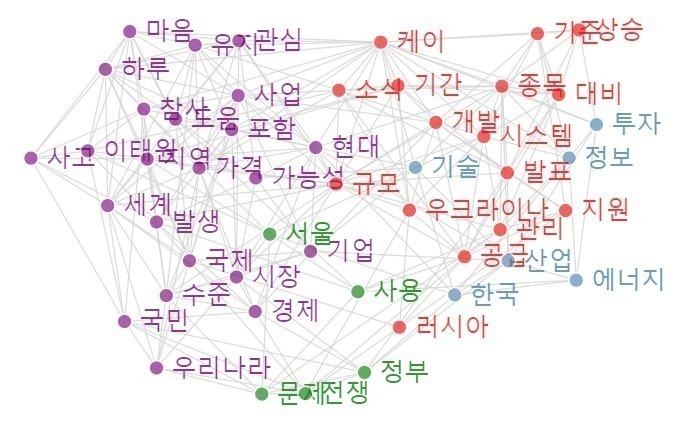韓·日·臺 동아시아 인력 전쟁 속 ‘외국인 유치 정책’의 해법은?
日, 현대판 노예제로 불리던 기능실습제 폐지
韓, 저숙련 외국인 대상 비자 '유치 상한' 높여
체류 기간 상한 폐지한 대만도 유치 경쟁 가세

인구 감소에 직면한 동아시아 국가들이 외국인 근로자를 유치하기 위한 경쟁을 본격화하고 있다. 일본은 현대판 노예제도로 불려 온 ‘기능실습제’를 폐지해 외국인 근로자 처우 개선에 나섰고, 대만도 최장 체류 기간 한도를 사실상 폐지했다. 한국의 경우 최저임금이 높아 동아시아 인력 전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했다는 평가를 받지만, 생산성이 낮은 저숙련 외국인 근로자에게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日, 외국인 인력 확보 위해 특정기능제·육성취업제 도입
25일 노동계에 따르면 일본 국회는 지난 14일 본회의를 열어 외국인 기능실습제를 폐지하고 육성취업제를 골자로 하는 ‘출입국관리·난민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1993년 도입된 기능실습제는 당초 외국인 근로자에게 일본 현지의 선진 기술을 전수한다는 명목이었지만 만성적인 인력난에 시달리는 중소 제조업체와 서비스업에 외국인 비숙련 근로자를 싼값에 공급하는 수단으로 변질됐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기능실습제를 대체하는 육성취업제의 목적이 ‘인력 확보’에 있다고 명시했다. 이와 함께 그동안 국제사회의 비판을 받아 온 외국인 근로자의 열악한 노동 환경, 장시간 노동, 낮은 급여 등 처우를 개선해 인권 침해 논란을 해소하는 데 초점을 뒀다. 허울뿐인 ‘국제 공헌’ 등의 명분을 붙이기보다는 적극적으로 외국인 인력 쟁탈전에 뛰어들겠다는 목표를 분명히 한 것이다.
최근에는 2019년 도입한 ‘특정기능제도’의 대상 업종을 확대했다. 특정기능제는 기능실습생보다 숙련도가 있고 일본어 소통이 가능한 외국인 근로자에게 5년간 부여하는 노동 비자로 당초 돌봄 일손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뒀지만, 재계의 요청을 수용해 제조업, 외식업, 항공업, 숙박업 등으로 범위를 확대했다. 아울러 내국인과 같은 임금과 노동 시간, 자유로운 이직, 가족 동반 입국을 보장하는 등 사실상 이민을 허용하기로 했다.
대만도 지난해 6월 ‘2030년 저숙련 외국인 8만 명 유치’를 목표로 저숙련 외국인 근로자 관련 제도를 개편했다. 지난 2022년에는 외국인 최장 체류 기간 한도를 사실상 폐지했다. 대만은 일본과 달리 처음부터 근로자로 외국인을 받아들여 민간에서 외국인 취업 알선과 체류 지원을 주도하고 있다. 그동안 인력난과는 거리가 멀었던 중국도 최근 합계 출산율이 1.09명까지 하락하면서 조만간 외국인 근로자 유치전에 가세할 것으로 예상된다.
韓 급여 높아 외국인들 선호, 기업에는 부담으로 작용해
인구 감소에 직면한 동아시아 국가 중에는 한국이 외국인 근로자 시장을 빠르게 선점하고 있다. 한국은 2020년 5만6,000명이었던 저숙련 외국인 근로자(E-9 비자) 유치 상한을 올해 16만5,000명으로 3배 이상 늘렸다. 체류 기간에 제한이 없고 가족을 동반할 수 있는 숙련 외국인 근로자(E-7-4 비자) 상한도 2018년 600명에서 올해 3만5,000명으로 5년 새 60배 가까이 늘렸다.
한국이 외국인 근로자들을 대거 끌어들일 수 있었던 가장 큰 유인책은 일본, 대만에 비해 높은 급여 수준이다. 올해 한국의 최저임금은 시간당 9,680원으로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1만1,932원으로 추산된다. 이는 업종별로 차등화한 일본의 평균 최저 임금 1,004엔(약 8,775원)보다 2,000원 이상 높다. 특히 일본의 저숙련 외국인 근로자는 숙련도에 따라 임금을 차등 지급하는 기능실습제를 적용받는데 이 경우, 한국의 최저임금보다 월평균 50만원 적은 급여를 받게 된다.
외국인 근로자 유치라는 측면만 두고 보면 한국의 제도가 모범 사례로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외국인 근로자의 수요처인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현실과 정책 간의 괴리가 크다는 입장이다. 지난 13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주관한 토론회에 참석한 중소기업 대표들은 외국인 근로자의 업무 숙련도가 낮다는 점을 한계로 지목했다. 생산성에 차이가 분명한 외국인 근로자에 내국인 수준의 최저임금을 주려다 보니 회사 경영에 부담이 된다는 지적이다.
농촌의 상황은 더 심각하다. 심각한 일손 부족에 ‘인력 쟁탈전’이 벌어지면서 외국인 근로자의 몸값이 뛰고 있다. 이런 상황이 발생한 배경에는 코로나19 사태가 있다. 팬데믹 장기화로 근로 비자가 만료된 외국인 노동자들이 본국으로 돌아간 데 반해 신규 입국은 제한됐기 때문이다. 실제 법무부에 따르면 비숙련 외국인 근로자가 주로 받는 E-9 비자를 소지한 국내 체류 인원은 2019년 27만6,553명에서 지난해 21만9,570명으로 20% 넘게 감소했다.

지난해부터 최저임금 차등 적용 두고 사회적 논의 이어져
전문가들은 한국이 외국인 유치전에서 우위를 점하면서도 국내 산업과 노동시장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주 정책뿐 아니라 노동정책의 변화도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이에 지난해부터 외국인 근로자의 최저임금 차등 적용이 화두로 급부상했다. 논란은 외국인 가사관리사에 대해 한시적으로 최저임금을 배제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되면서 시작됐다.
결국 해당 법안은 노동계의 비판에 직면하면서 발의된 지 하루 만에 철회됐지만 이후 정부가 필리핀 가사관리사 도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또다시 논란이 불거졌다. 당시 고용노동부는 국내법을 비롯해 국적에 따른 임금 차별을 금지하는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을 언급하며 외국인 가사관리사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은 당연하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의 입장과 달리 한국은행은 지난 3월 ‘돌봄 서비스 인력난 및 비용 부담 완화’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제언했다. 보고서는 홍콩, 싱가포르, 오스트리아의 사례를 들어 “외국인 가사관리사와 간병인의 임금이 낮아지면서 해당 분야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증가했다”며 “이는 돌봄의 의무로부터 해방된 내국인 여성이나 간병 자녀의 노동시장 참여가 크게 개선되는 효과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한은의 이런 제안에 이주단체와 노동계는 강하게 비판했다. 착취를 정당화하는 차별적이며 반인권적인 발상이라는 지적이다. 이렇다 보니 정부 안팎에선 최저임금 차등 적용까지 험로가 예상될 것이라 입을 모은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적에 따라 최저임금을 달리 적용하는 것은 ILO 협약 위반 사항인 데다, OECD 등 해외 주요국의 사례를 살펴봐도 외국인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 적용 규정을 도입한 나라는 한 곳도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