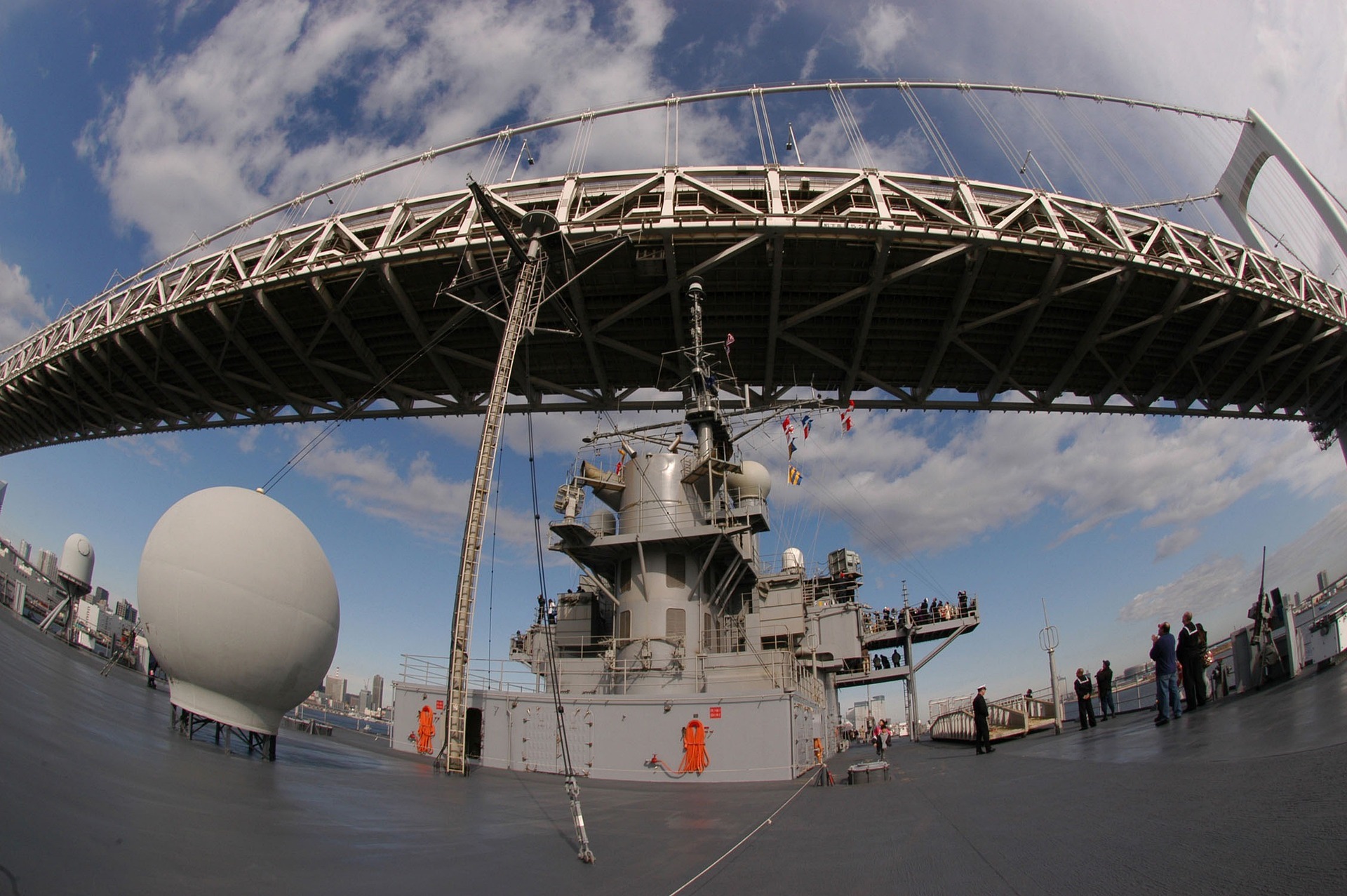가사노동자, 이제는 ‘가사관리사’? 명칭 변경에 매몰된 정부 이대로 괜찮나
가사노동자 명칭 바꾼다는데, “‘영양교사’ 꼴 나는 것 아니냐” “‘전문성’ 개선되면 명칭도 자연스레 바뀔 것” 가사근로자법 국회 통과했지만, 여전한 ‘노동인권 사각지대’

고용노동부가 가사노동자 새로운 명칭으로 ‘가사관리사(관리사님)’를 사용해 줄 것을 독려하고 나섰다. 가사노동자에 대한 직업 인식을 제고하겠단 취지인데, 막상 대중들 사이에선 회의적인 반응이 나온다. 명칭만 변경한다 해서 직업 인식이 바뀔 것 같진 않다는 것이다. 일각에선 현장 고충에 대한 실질적 대책 없이 명칭만 변경하려 든다는 비판적 의견도 나온다.
고용부 “가사노동자 명칭 변경할 것”
고용부는 2일 가사노동자 명칭 변경 사실을 알리며 새로운 명칭이 일상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가사노동자에 대한 인식 전환의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가사노동자는 성별·연령·국적 등과는 무관하게 가정 내에서 이뤄지는 청소·세탁·주방일과 가구 구성원 보호·양육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를 뜻하는데, 그동안 현장에선 가사노동자를 ‘아줌마’, ‘이모님’, ‘가사도우미’ 등으로 불려왔다.
이에 가사노동자가 직업적으로 충분히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는 인식이 이어져왔고, 업계를 중심으로는 전문성과 자존감이 반영된 새로운 명칭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 같은 배경에서 업계는 가사서비스종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현장 의견청취와 가사노동자 인터뷰 및 대국민 선호도 조사 등을 진행했으며, 그 결과 참여자 1만623명 중 42.5%가 선택한 가사관리사(관리사님)를 새로운 명칭으로 선정했다.

명칭 변경으로 직업 인식 제고? 대중들은 “글쎄”
다만 대중들 사이에선 ‘단순 명칭 바꾸기’가 직업 인식 변화에 큰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다는 반응이 나온다. 일례로 과거 ‘영양사’라는 직업 명칭을 ‘영양사선생님'(영양교사)으로 바꾸자는 시도가 있었으나 실질적으로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지난 2006년 정부는 영양교사 양성을 통해 기존 식품위생직 공무원을 영양교사로 전환하고 학교별 영양교육 수업을 실시함으로써 영양교사의 ‘교사’로서의 위상을 높이려 노력했다. 그러나 교직원 사이에서의 인식은 차치하더라도 학생들 사이에서의 영양교사에 대한 인식은 바닥을 치고 있다. 사실상 ‘영양교사’를 ‘교사’로 인식하는 경우가 오히려 희귀한 케이스가 된 형편이다.
영양교사의 경우 명칭 자체의 논란도 있었다. 교직원 중 학생을 직접적으로 교육하는 이들을 ‘교원’이라고 부르는데, 영양교사는 실질적으로 수업을 연간 20시간도 하지 않는다. 심지어는 영양교사제를 도입한 이래 단 한 시간도 수업에 들어가지 않은 영양교사도 40%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배경을 바탕으로 교원들 사이에선 “수업시수가 압도적으로 적은 영양교사를 ‘교사’라는 명칭으로 불러야 할 이유가 있나”라는 비판론이 수없이 제기됐다. 결국 직업 인식 제고를 명칭 변경으로 단순화한 것이 주요 실패 원인이 된 셈이다.
이번 가사노동자 명칭 변경도 크게 다르지 않다. 영양교사 사례에서 볼 수 있듯 단순 명칭 변경은 직업 인식 제고를 위한 수단이 될 수 없다. 비슷한 사례로 ‘프레시 매니저’도 있다. 일명 ‘야쿠르트 아줌마’로 불리던 직업 명칭을 ‘프레시 매니저’로 변경한 건데, 실상 현실에서 ‘프레시 매니저님’이라고 부르는 이들은 거의 없다. 언론 등지에서나 간간이 쓰이는 수준이다.

명칭 바뀌어도, 현장 고충은 ‘여전’
명칭을 바꾸고 정부 캠페인만 벌여서 될 문제가 아니다. 인식 개선을 위한 보다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인식 개선을 위해선, 우선 직업 명칭에 알맞은 전문성 및 역량을 개인이 갖출 수 있도록 교육과정 및 현장 개선을 이뤄낼 필요가 있다. 예컨대 영양교사의 경우 실제 교원과 완전히 같지는 않더라도 적당한 수준의 교육시수를 유지했더라면 자연스레 ‘교사’로서의 이미지가 잡혔을 것이다.
가사관리사도 마찬가지다. 가사관리사에 대한 엄격한 자격증 시험이 이뤄짐으로써 전문성이 갖춰진다면 대중들 사이의 인식을 자연스럽게 변화시킬 수 있다. 유튜브에 흔히 나오는 정리정돈 전문가를 본 누리꾼들은 정리정돈하는 이들을 ‘아줌마’, ‘아저씨’라고 부르기 보단 ‘전문가’로서 대우한다. 전문가의 ‘솜씨’를 직접 목도했기 때문이다.
인식 변화 외 제도 변화도 병행돼야 한다. 가사노동자의 명칭은 달라졌어도 이들의 노동인권은 여전히 바닥인 상황이다. 세간에 노동인권 사각지대의 대표적 사례가 가사관리사라는 말이 있을 정도다. 지난 2021년 5월 가사근로자법 국회 통과 이후 사각지대의 일환이 사라지나 싶었으나 결국 한계를 벗어나지는 못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그도 그럴 것이 인증받은 업체 소속이 아니면 가사관리사라 해도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가사관리사는 현행 근로기준법 보호에서도 완전히 벗어나 있다.
이런 가운데 올 하반기엔 외국인 가사관리사가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고용부가 필리핀 등에서 오는 100여 명의 가사관리사에 내국인과 같은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제도 시범계획안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기 때문이다. 외국인 가사관리사가 늘어날수록 국내 가사관리사들의 노동 현실은 더욱 각박해질 수밖에 없다. 실제 현장에서의 고충은 고려하지 않은 채 직업 명칭 변경에만 매몰된 현 정부의 행태를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