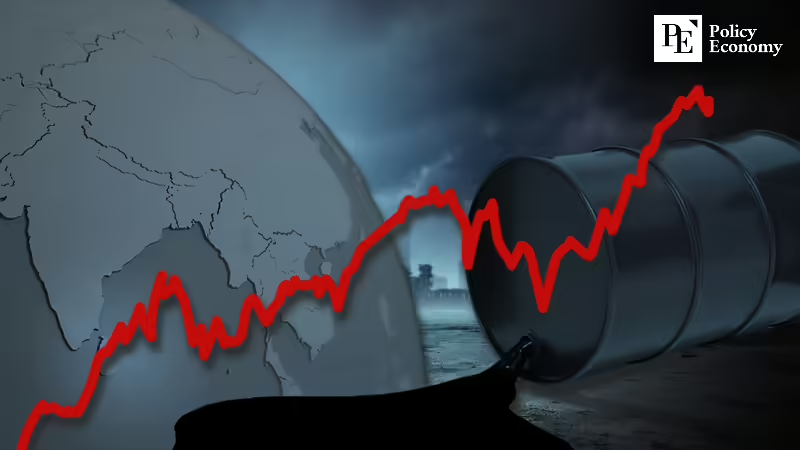‘유럽의 보루’에서 다시 ‘유럽의 병자’된 독일
IMF “올해 독일 성장률 -0.3%” 에너지, 제조업 위기에 G7 중 경제성적표 꼴찌 ‘독3사’는 옛말, 중국차 저가공세에 밀려나는 독일차
세계 주요국이 코로나19 팬데믹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충격을 딛고 일어나는 와중에 독일이 ‘나 홀로’ 침체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다. 한때 유럽 최대의 경제 대국이었던 독일은 이제 공공연한 ‘유럽의 병자’로 취급을 받으며 유럽의 걱정거리가 됐다.
지난 3월 25일 발표된 국제통화기금(IMF)의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독일의 경제성장률은 -0.3%를 기록할 전망이다. 주요 7개국(G7) 중 유일한 역성장이다. 전문가들은 급격한 에너지 가격 상승을 주범으로 꼽는다. △제조업 충격 △고용 악화 △소비자 물가 상승의 원인이지만 특별한 대책도 없다는 우려다.
위기에 빠진 제조업
과거 독일 경제는 세계적으로 우수한 기업들을 바탕으로 한 높은 수출 체력으로 외부적 충격에도 높은 회복탄력성을 보였다. 중국 경제가 고속 성장하던 2000년대엔 특히 눈부셨다. 독일 경제의 젖줄이던 중국과의 무역 규모는 갈수록 커졌고, 최근 7년간 중국은 독일의 최대 무역국으로 부상했다. 독일의 대(對)중국 교역 규모는 2021년 2,450억 달러(약 318조3,285억원)에서 2022년 3,178억 달러(약 412조9,175억원)로 30% 늘어나면서 의존도는 더욱 높아져 갔다.
그러나 중국을 주요 파트너로 뒀던 과거가 독일의 업보로 돌아왔다. 중국이 올해 초 코로나 완전 봉쇄를 풀고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에 나설 당시 최대 수혜는 독일이 받을 것이란 전망이 있었으나 그저 전망으로 그쳤다. 전문가들은 중국의 회복세가 시원치 않자, 의존도가 높은 독일 경제가 직격탄을 맞았다는 평을 내놓는다. IMF가 주요국 중 유일하게 독일에만 마이너스 성장 전망을 내린 이유다.
게다가 독일 경제의 중추인 제조업 부문마저 중국에 밀리고 있어 경제 회복이 더욱 지연되는 상황이다. 독일은 한국(27.5%)과 마찬가지로 제조업 비율이 높은 데다, 최대 수요처인 대(對)중국 의존도가 높다. 중국 세관인 해관총서에 따르면 올해 1~6월 독일의 대중국 교역액은 1,058억9,560만 달러(약 136조3,000억원)로, 유럽연합(EU) 전체 교역액(3,991억7,200만 달러)의 26.5%에 달한다.
1분기 판매량 중국차 107만 대, 독일은 84만 대 ‘역전’
더욱 놀라운 사실은 △메르세데스-벤츠 △BMW △아우디와 같은 독일의 대표 자랑거리인 자동차 제조 시장까지도 중국에 밀리고 있다는 점이다. 영국 자동차 전문 유튜브 카와우에 따르면 중국 전기 자동차는 향상된 품질과 합리적인 가격으로 기존 독일 자동차의 강력한 경쟁자로 빠르게 변모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작년 10월 독일에서 데뷔한 중국 전기 자동차 제조업체 BYD가 있다. 지난 1월 포드의 독일 생산공장인 ‘자를루이(Saarlouis)’ 조립 공장 인수에 나설 정도로 상황이 좋다. 경영 컨설팅 업체 알릭스 파트너스는 중국이 1분기 자동차 판매량에서 107만 대를 기록하며 독일의 84만 대를 제치고 선두를 차지했다고 밝히면서 올해 중국이 자동차 산업에서 글로벌 1위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자동차 업계만의 문제는 아니다. 뮌헨 IFO 경제연구소에 따르면 지난 7월 독일의 고용지수는 2021년 2월 코로나19 시기 이후 최저치인 97.1점을 기록했다. 특히 화학, 금속 관련 제조업 부문에서 정리해고를 고려하는 기업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으로 세계 최대 화학 기업인 독일 BASF의 사례를 들 수 있다. 지난 2월 BASF는 가스 가격 급등으로 인해 생산 수익성 하락으로 독일 본사에서 암모니아 생산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생산 중단과 함께 직원 2,600명도 해고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2019년 기준 독일 국내총생산(GDP)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9.1%다. 이를 감안하면 제조업이 부진한 현 상황은 독일 경제에 치명적이다.
마틴 브루더뮬러 BASF SE 최고 경영자는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모든 것이 괜찮아 보여서 사회적으로 순진했다”며 “독일에는 여러 문제가 계속 쌓여가고 있다. 우리는 변화의 시기를 맞이했지만 이것을 모두가 깨달았는지는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치솟는 인플레이션, 쪼그라드는 내수 경제
특히 지난해 발발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독일 경제가 가진 구조적 문제를 여실히 드러낸 계기로 꼽힌다. 전쟁 발발 직전 독일은 △천연가스의 55.2% △석탄의 56.6% △석유의 33.2%를 러시아에서 수입했다. 하지만 전쟁으로 서구가 러시아 제재에 나서면서 독일은 러시아산 에너지 이용을 갑자기 중단해야 했다. 자연히 에너지 가격도 크게 상승했다. 독일 연방 통계청은 독일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5월 6.1%에서 6월 6.3%로 전년 동기 대비 상승했다고 발표했다. 에너지 위기로 인한 대중교통 물가 상승률은 무려 112.8%에 달한다.
또한 독일은 지난 10여 년간 탈원전을 추진했는데, 갑작스러운 러시아산 에너지 공급 중단이 맞물리면서 지난해 전기요금이 10배 폭등했다. 이 때문에 독일은 최근 마지막 남은 원전마저 가동을 중단해야 했고, 현재 발전 원가가 비싼 에너지원으로 전력을 생산하고 있다. 그야말로 에너지 위기다. 이렇다 보니 독일의 산업용 전기요금은 나머지 G7 회원국 대비 2.7배 높다. 비싼 전기료는 제조 원가에도 반영되는 만큼 물가가 상승하게 되고, 결국 수출 경쟁력을 끌어내릴 수밖에 없다.
급격한 물가 상승으로 소비자들의 지갑도 열릴 줄을 모른다. EU의 통계 기관 유로스타트(Eurostat)가 지난 3월 31일에 발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독일인의 11.4% 이상이 격일로 육류나 생선을 사 먹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년의 10.5%에서 1%p나 증가한 것으로, 악화하는 독일의 내수 경제를 단적으로 보여 주는 대목이다. 게다가 독일 일간지 슈피겔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독일인의 25%가 여름휴가를 떠날 형편이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반기에도 계속될 독일의 경기 침체
유럽에서 가장 거대한 규모를 자랑했던 독일 경제는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경험하면서 공식적으로 리세션(불황)에 빠졌다. 독일 연방 통계청은 1분기 GDP 성장률이 전분기 대비 -0.3%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전년도 4분기의 -0.5% 감소에 이은 것이다. 이에 경제학자들은 한목소리로 독일의 위기를 경고하고 나섰다.
코메르츠방크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울리히 크래머는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이네 차이퉁(FAZ)에 기고한 성명에서 “기술적으로는 경기 침체의 요건이 충족됐다”면서 그 원인으로 겨울철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꼽았다.
VP은행의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토마스 기첼도 1분기 독일 경제의 주요 민간 소비가 1.2% 감소한 것을 두고 물가 급등으로 인한 구매력 감소를 주원인으로 지목했다. 이어 “독일 경제의 역성장 추세가 하반기에도 계속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요르크 크레이머 코메르츠방크 수석이코노미스트 역시 하반기에는 새로운 경기 침체가 닥칠 것으로 내다봤고, 카르스텐 브제스키 ING 글로벌매크로책임자도 “독일 경제는 스태그네이션(장기 경기 침체)과 리세션 사이의 중간 지대에 갇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